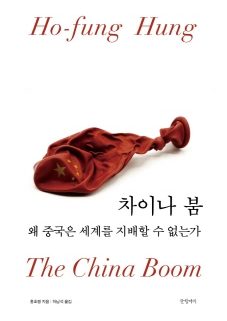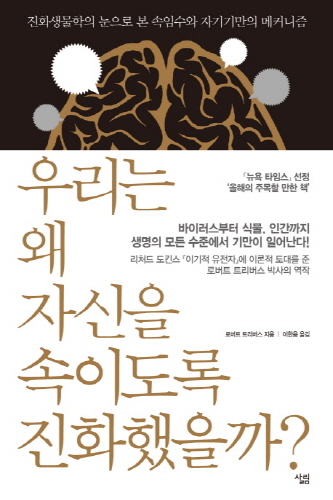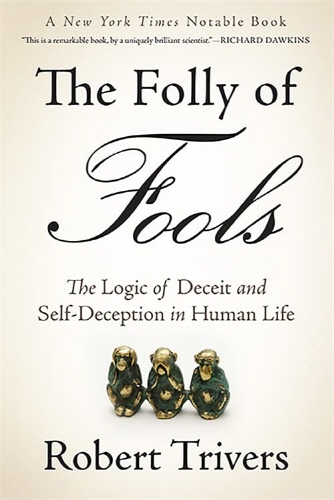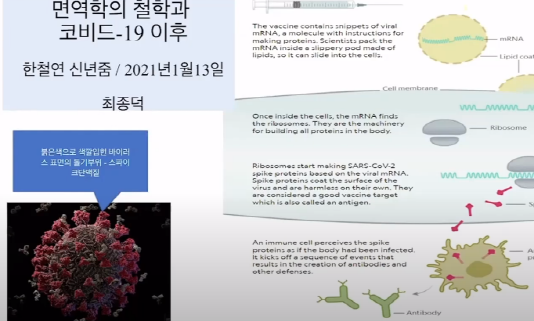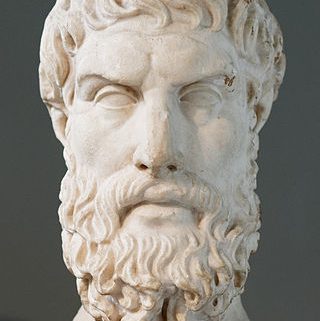중국을 보는 하나의 창 – 『차이나 붐』 서평 (2) [흐린 창가에서-이병창의 문화 비평]
중국을 보는 하나의 창 – 『차이나 붐』 서평 (2)
이병창(한철연 회원)
1)
앞의 글에서 ‘차이나 붐’ 1부를 소개했다. 1부의 내용은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이다. 두 가지가 핵심인데, 하나는 사회주의 시대 축적된 자본과 노동력이 있어서 개혁 개방 이후 남미 식의 파국에 처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혁 개방은 두 단계로 나뉘는데, 89년 천안문 사건 이후 2단계 개혁 개방 정책이 펼쳐졌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한마디로 박정희식 수출 정책이 중국에 이식되었다고 한다. 저임금, 저가 농산물, 저금리 정책 대출, 고환율 정책 등이 그 핵심이다.
저자 흥호펑은 이 책의 2부에서는 중국 자본주의와 미국(여기에 유럽도 포함된다) 자본주의 사이의 연관 즉 세계 체제의 문제에 집중한다. 월러스타인은 70년대 서구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국가 사이에 공존 관계를 세계 체제로 설명한 적이 있는데, 저자는 중국과 미국의 관계도 그와 같은 세계 체제라는 개념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저자는 중국과 미국의 세계 체제에 신자유주의 체제라는 이름을 부여한다.
신자유주의 세계 체제는 구체적으로는 중국의 수출 기업과 미의 금융 자본이 결합한 체제이다. 중국은 미국에 못지않게 서구나 한국 일본 등과 같은 아시아 국가 그리고 남미, 중동과도 관계 한다. 저자는 중,미 관계를 핵심에 놓고 나머지 세계는 이 관계를 둘러싸고 있다고 본다. 서구(독일 등)와 아시아 국가는 중국과 경쟁하거나 중국에 부품을 제공하는 제조업 국가이며 남미의 경우 주로 원료를 공급 기지가 된다.
2)
저자는 5장에서 1980년대 이후 미국은 제조업 국가에서 금융 자본주의 국가로 발전했다고 설명한다. 이런 전환의 한쪽 축은 중국의 저가 수출이다. 중국의 저가 수출로 미국 제조업이 붕괴했다. 다른 쪽 축은 달러 기축 통화 체제이다. 미국은 그 덕분으로 금융 자본주의 국가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70년대 말 달러를 저 평가하여 제조업을 보호하려 했으나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주저앉았다. 이 때문에 중국의 저가 수출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미국은 쌍둥이 적자 즉 막대한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에 빠지게 되었다. 이 재정 적자는 제조업 붕괴하면서 세수가 부족하게 되고, 거꾸로 실업자가 증대하면서 사회 보장 비용이 증가한 데 원인이 있다.
쌍둥이 적자에 시달리는 미국이 어떻게 파국에 처하지 않게 되었을까? 그 미스테리는 중국의 미국 국채 투자에 있다고 한다. 중국은 고 환율 정책으로 저 평가된 상품을 미국에 수출하면서 막대한 수출 이윤을 얻었는데 중국은 미국 국채에 투자하면서 획득한 달러를 미국으로 돌려주었다.
중국의 수출 이윤의 미 국채 투자는 여러 가지 효과를 낳았다. 우선 미국은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에도 불구하고 국채를 통해 ➀ 정부 지출을 유지했다. 또한, 국채 금리를 낮게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은행은 저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은행은 ➁ 국민에게 신용 대출을 강화하면서 미국은 부채에 기반을 둔 과잉 소비 체제를 이루게 된다.
국채 투자로 달러가 환수 되면서 미국은 달러가 고 평가되면서 불가피하게 일어날 인플레이션은 ➂ 싼값으로 수입되는 소비 상품으로 막을 수 있었다.
저자의 이런 설명은 저자 자신의 견해라기보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경제학에서 일반화된 주장으로 보인다. 이런 일반화된 주장은 80년대 이후 미국의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도한 은행 대출은 80년대 이후 미국에서 금융 자본과 미국 고급 기술 노동자 사이의 유착 관계의 원인이 된다. 미 국민 특히 고급 기술 노동자는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은행 대출을 통해 부채 파티를 즐겼으니 그 결과가 곧 2000년대 초반 전개된 부동산 투기였다. 이런 틀로부터 신자유주의 시대를 주도한 민주당 클린턴 체제가 충분히 설명된다.
3)
경제학에서 일반화된 주장은 주로 신자유주의 체제 가운데 미국 측에 대한 분석에 한정되었다면 저자 흥호펑의 설명은 이 체제의 상대편인 중국 측에 집중된다. 중국 측에 대한 설명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으니 저자의 설명은 이런 관점에서 굉장한 도움이 된다.
이제 중국 측으로 가 보자. 저자의 물음은 여기에 있다. 즉 중국은 미 국채 투자를 왜 지속하는가? 국채 투자는 결과적으로는 일종의 조공에 불과한데도 중국이 이를 지속하는가에 대해 저자는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그 하나는 수출로 벌어 들인 달러를 미 국채에 투자함으로써 ➀ 위안화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위안화 상승은 저가 수출 전략을 파탄시키는 것이다. 인위적인 위안화 저 평가 방식(페그제)은 미국의 압력으로 유지할 수 없었다. 중국은 달러를 미국으로 되돌려주는 미 국채 투자 정책을 수용했다.
다른 하나는 중국의 국채 투자로 미국은 재정 적자에도 불구하고 재정 지출과 신용 대출을 지속하면서 ➁ 중국의 수출품에 대한 수요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자는 이런 중국의 미 국채 투자를 통해 중국의 수출 기업과 미국의 금융 자본은 공생할 수 있었고 이런 공생 관계가 신자유주의적 세계 체제를 지탱하는 핵심축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런 신자유주의적 세계 체제가 지속할 수 있는 것인가? 저자는 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저자는 이런 저가 수출 체제가 중국 내부에서 어떤 문제점을 불러 일으키는가를 설명한다. 이런 문제점은 2부 4장과 6장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다. 저자는 그 문제점을 여러 통계 자료를 통해 논증하려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논증을 빼고 간단하게 그 결과만 들어보기로 하자. 박정희 식 수출 체제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쉽게 이해되는 대목이다. 저자에 의하면 저가 수출을 통한 경제 성장은 두 가지 한계에 부딪힌다.
첫째는 저 임금, 저 농산물 가격, 고 환율 등으로 국내 소비 감소로 내부 성장이 한계에 부딪힌다. 한편으로 기업의 채산성 악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출로 재정이 고갈된다. 다른 한편으로 노동자의 상황은 악화하는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주의적 보장 정책이 대폭 후퇴한다. 그 결과 200년대 초반 중국에서는 대규모 노동자 저항이 일어났다.
둘째는 중국 경제를 견인하는 수출은 구미의 점차 수요 부족(예를 들어 2008년, 2013년 미국과 유럽 경제 위기에서처럼)과 신흥 개발 국가 사이의 경쟁으로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위기 시마다 중국은 막대한 재정 투자로 위기에 처한 부실 기업을 지원했으나 덕분에 기업은 저가 수출로 이윤을 낳지 못하니 막대한 부채를 짊어지고 있다.
이런 사정은 80년대 노동자의 저항과 90년대 IMF위기에 처한 우리로서 충분히 짐작 가는 일이다. 악화된 노동자 상황, 부실한 기업이라는 이중 위기가 낳는 증상이 부동산 투자이다.
저평가된 위안화로 중국은 높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니 이 때문에 부동산 투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다. 은행은 부실에 시달리는 기업보다 부동산에 투자된다. 은행은 대출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지만, 점차 악화하는 노동자 상황은 대출을 갚을 수 없으니 부동산 투기는 언젠가는 끝날 수밖에 없었다.
저자는 초 현실적으로 사치스러운 지방 정부 건물, 중복되는 지하철 노선, 불필요한 공항, 수요가 없는 고급 아파트, 쓸모없는 건축물이나 시설 등, 유령 도시나 유령 쇼핑몰 등을 들고 있는데, 저자는 이 현상 자체가 중국 경제 성장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본다.
그런 점에서 서문에서 잠시 언급했던 헝다 사태는 단순한 부실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저가 수출에 한계에 부딪히면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결과이다.
4)
중국은 저가 수출 정책을 언제까지 지속할 수는 없었다. 우선 1990년대 후반부터 노동자가 저항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중국에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다. 그게 바로 2003년 후진타오 정부이다.
후진타오는 내륙 개발과 농산물 수매가 인상, 새로운 노동 계약법을 실시하여 국내 불평등을 축소하고 국내 수요를 증가시켜 내부 성장을 확산시키려 했다. 그러나 후진타오의 이런 정책은 2008년 미국의 경제 위기로 중국의 수출이 축소되자, 황급히 중단되고 말았다.
2012년 새로 등장한 시진평 정부는 후진타오의 정책을 계승하고 있지만, 저자는 이런 개혁 정책의 효과에 대해 회의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저자의 결론을 무조건 수용하기는 어렵다. 저자의 이런 회의적인 관점은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닐까? 저자는 중국의 공산당 내부의 민주주의 과정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닐까?
서방 언론에 의하면 지금 중국에서는 시진평의 독재 체제가 강화된다고 하지만 실제 이것은 중국의 개혁 개방의 결과인 노동자 상황 악화와 부실 기업을 해소하려는 정치적 노력의 결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