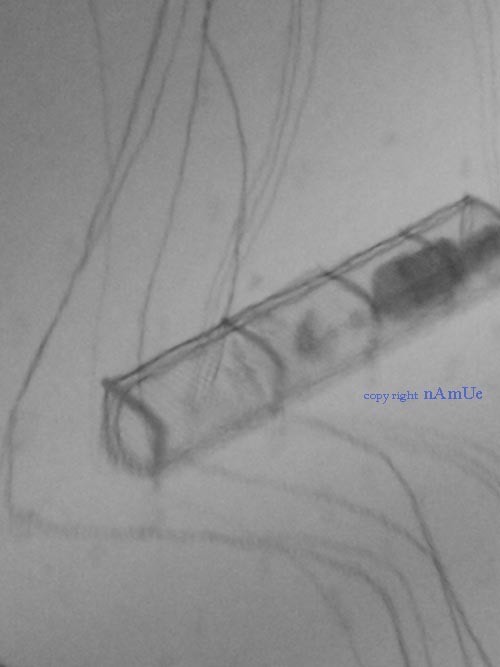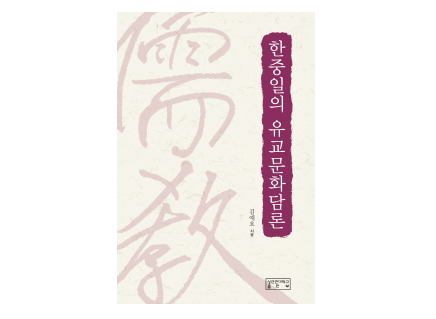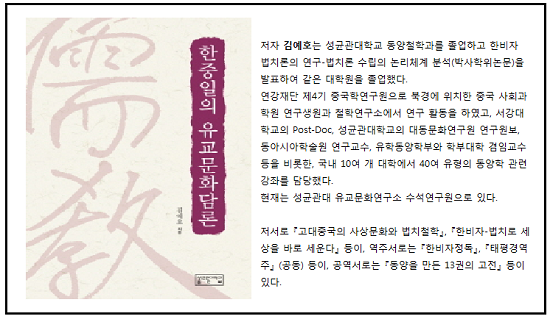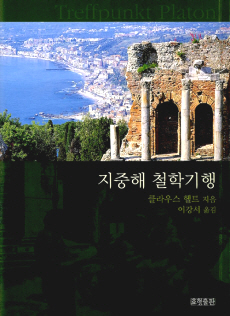나는 사해(四海)에 솥단지 하나 걸어 놓고 살아도 된다 ?[김성리의 성심원 이야기]-5
김성리(인제대 인문의학연구소 연구교수)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괜찮았다.?처음에는 몸이 아프니 마음이 아프더라.?그래서 날마다 울었다.?이 병이 왔을 때에는 뭐가 뭔지 몰라서 안 울었고,?소록도에 갈 때도 언니가 있으께,?내가 있어야 불쌍한 우리 언니 돌보아 줄 수 있으께 안 울었다.?온 몸이 아프고 죽을 것처럼 열이 나고 덜덜 떨리니까 겁이 나고 그렇더라.?남들은 다리 없이 어찌 살거냐고 하고,?우리 아버지는 내 꼬라지 보고 그 길로 화병을 얻어서 돌아가실 때도 한을 품고 가셨다.
나는 그냥 어리벙벙했다.?얼굴도 수건으로 안 덮어주고 수술하는 걸 보다가 졸도했는데,?깨어나서 보니 시원하더라.?얼매나 몸이 아프고 힘들었는지 슬프고 울고 그런 거 없었다.?너무 아픈 데가 없어지께 후련하고 가뿐하고 그랬지,?뭐.?그런데 살다보니 눈물이 날 때가 더러 있더라.?지금도 몸이 아프모 눈물이 안 나는데,?마음이 아프모 눈물이 난다.?왜 그럴꼬??소록도 생각해도 눈물이 나.?그때 생각하모 마음이 아파.?자꾸 아파.
소록도에 있을 때에는 여름이고 겨울이고 옷은 광목이었다.?틀린 거는 겨울이 되모 검은 물들인 옷을 입은 기다.?참 추웠다.?배도 고팠어.?배급을 주는데 맨날천날 모자라.?나는 어리다고 밥도 마이 안 줬어.?그래서 칡을 마이 묵었다.?칡이 억시기 많아서 물칡은 안 묵고 끊어 버리고 했다.?거기서 죽는 거는 사는 것보다 쉬워.?죽으모 제대로 장례도 안 지내주고 함부로 한께 사람 뼈가 예사로 있어.?왜 저 앞에 텔레비전에도 나오는 것 같던데,?그거 사실이다.?그때도 쇠꼬챙이로 아무 데나 땅을 부시모 뼈가 나오제.
밤에 바다를 보모 퍼런 빛이 번득여.?사람 뼈에서 나오는 인이 그리 보이는 기라.?아이가,?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화장을 하는데,?제대로 안 돼서 그래.큰 도람통 같은 기 있는데,?죽으모 거기다가 넣고 화장하는데,?요새같이 그리 안 되지.?납골당이 있기는 있었어.?큰 뼈는 납골당에 넣고 납골당이 차모 지하실에 따로 보관했다.?그라고 자잘하게 나오는 거는 바닷가에 버리기도 했거든.?어떤 날은 뼈에 파래가 끼인 채로 해변가에 뒹굴어 다닜다.

바닷가에 자주 나갔지.?먹을 기 있다 아이가.?나는 소록도에 가서 반지락을 처음 보고 알았다.?우리집이 있던 거제도는 물살이 세서 반지락이 없어서 몰랐다.?파도에 껍데기만 밀리오고 했거든.?소록도에는 많았다.?그거 주워서 삶아 묵고는 했다.?그라고 파래가 많았거든.?파래를 뜯어서 그 우에다가 강냉이 가리를 솔솔 뿌리 갖고 쪄묵었다.?허허,?맛은 무신 맛.?파래강냉이 떡이지.?파래만 찌모 안되니까 쌀가리 대신 강냉이 가리를 쪼끔 뿌리서 묵는 긴데,?그기라도 실컷 묵었으모 했다.
그거를 묵고 나모 침이 질질 흘러.?몰라,?이상하대.?파래만 묵으모 속이 데리고 침이 질질 나와.?속이 마이 데린다.?처음에는 괜찮은데 자꾸 먹다 보모 데리다 못해 침이 질질 흘러내리.?산나물도 마이 뜯어서 그리해서 묵는데,산나물은 속이 고달퍼.?산에서 나는 거는 마이 묵고 자꾸 묵으모 속이 고달프고,?바다에서 나는 거는 속이 데린다.?그 이유는 몰라.?한 방에?10명씩 살았는데,?나만 그런 게 아이고 거의 다 그랬어.?그래도 묵을 기 워낙 없으니 바닷가에 가모 널린 기 파래고 옥수수 가리는 배급이 나온께 그거라도 해 묵고 허기를 달랬어.?묵고 나서 침이 흐르고 속이 데리도 그기라도 많이 묵고 싶었어.
곡식이 귀해서 그랬지 묵을 거는 그거 말고도 제법 있었제.?산에 소나무 안 있나.?소나무도 묵었다.?허허 아이다.?무신 아무 소나무를 꺾어 묵노.?니도 참 말이 안 된다.?소나무 솔잎에 새순이 안 드나.?그 새순이 올라오는 거(가지)?밑에 있는 가지를 꺾어서 껍데기를 벗기모 안에 또 껍데기가 나와.?그 껍데기를 이로 긁어서 묵으모 맛이 괜찮아.?작년에 올라온 새순 위(가지)에 또 새순이 올라 오모 올해 거는 놔두고 작년 걸 꺾어 묵었다.
소나무는 꽃도 묵고 이파리도 묵는다.?참 고마운 나무제.?송진도 묵는데 그거는 흐르고 난 뒤 사나흘 지나모 꼬들꼬들해지거든.?꼬들꼬들해진 걸 뜯어 묵는데,?꼭꼭 씹으모 껌처럼 된다.?배가 고플 때 그기라도 꼭꼭 씹고 있으모 좀 낫다.?씹으모 껌같이 되는 기 피비(삘기)다.?니도 피비는 묵어 봤고나.맞다.?거제도에 참 피비가 많다.?소나무는 묵으모 배가 부르고 그거는 묵으모 더 허기가 나.?풀도 나무도 생긴 대로 다 다른 기라.?굶어 죽으란 법은 없어서 천지에 묵을 거를 흩어 놓고 안 있나.?그기 자연이다.
16살에 다리 끊고 나무다리로 그리 그리 살았는데, 19살에 중매로 결혼했다.?옆에서 중매해줬는데, 29살 묵은 노총각이었다.?암만 노총각이라해도 내를 봐라.?좋은 마음으로 내 도와준다고 장가들었다. “어임주”?우리 영감 이름이다.?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산청이 고향이다.?산청초등학교 다닜다카더라.?소록도에서 나와 갖고 함안 정착지에서 살다가 여게(성심원)로 온 것도 다 그런 인연이제.?부부로 사십칠팔 년을 살아도 싸움 한 번 안했다.법도 없이 살 사람이다.
2007년?10월에 갔다.?내가 폴도 마이 아프고 다리도 좀 그렇고 해서 그런지 나를 마이 위해 줬다. 2007년 들어 좀 샐샐했제.?기운도 빠지고 해도 그래도 나는 그리 갈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그날 저녁에 밥을 참 맛있게 묵더라.그러고는 생전 안 하던 짓을 하는 기라.?밥을 한 그릇 더 주라는 기라.?내가 무신 밥을 또 묵을라카노 하면서도 한 그릇 더 퍼주니까 암 말도 안하고 그 밥도 깨끗이 비우더니,?고마 자다가 안 가나.?응,?자다가 그리 갔다.?평생 그리 고생하고 배도 마이 곯았는데,?그래도 가는 길은 편하게 가서……얼매나 배 곯고 살았으모 가는 길에는 배 안 고플라고 두 그릇 든든하게 묵고 갔을꼬.?가는 동안은 배 안 고팠을 기다.
19살에 결혼은 했는데, 26살에 살림 났다.?결혼은 해도 낮에만 같이 있고 어두워지모 합숙하는 방에서 잤제.?방이 없었어.?어짜다가 누가 죽어서 혼자 되는 집이 있으모 그때는 혼자 된 사람은 합숙하고 그리 빈방에 살림을 내줬거든.?결혼했다고 딴 방을 줄 형편이 안됐어.?그래서?26살까지는 낮에만 부부지.?그래도 부부가 되니까 낮에 와서 힘든 일도 도와주고 좋대.?좋더라.하하하.
그래서 아이가 안 생긴 거 아이다.?그놈들이 단종수술을 해서 아를 못 낳았다.?소록도에서는 젊은 남자가 들어오거나 어리서 와도 사내 구실할 나이가 되모 모조리 단종수술을 했거든.?강제로 했다.?단종대가 따로 있었다.?붙들어 가서는 뭐 제대로 마취도 없이 묶어 놓고 했지.?그래서 원통하고 분하다.자식도 없으니 천지간에 나 뿐이라.?명절이 제일 서럽다.?평소에는 모리고 살지.?명절이라고 주변에 그래도 자식이 찾아오고 자랑하는 거 보모 서럽고 인자 그만 살고 싶다.
임신한 여자가 들어오모 강제로 낙태시켰다. 10개월이 되어도 아를 낳게 하는 기 아이라 낙태시켰다.?병원 지하에 강제 낙태시킨 태아들을 보관하는 데가 있었다.?나는 봤다.?병에 보관되어 있는데,?머리카락이 새카만 태아도 들어 있었다.?우찌우찌해서 아를 낳아도 바로 보육시설로 보내진다.?엄마가 울고불고 해도 소용없다.?놀래기는 와 그리 놀래노??거는 그런 거 예사다.?지금이야 뭐 천국이다 어쩌다 하지만,?우리 살던 옛날 소록도는 사람 사는 데가 아이다.
언젠가 남편이 그러더라. “우리 이 몸으로 돈 많이 벌었다.?참 일 많이 했다.”?그러대.?참 열심히 살았다.?죽어라고 일만 했다.?시동생이 아를 다섯 명이나 두고 먼저 갔다.?동서는 가출했버맀고 하니까 시어머니가?‘조카도 자식이다’?하대.?그 아이들을 시어머니가 키우는데 양육비를 보탰다.?말하자모 그 아이들 다섯 다 거두고 시어머니 생활비를 대줬다.?조카가 자라서 취직했을 때는 작은 차도 한 대 뽑아줬다.?둘째 질부는 가까이서 복지사로 일한다.?조카들이 가까이 있어도 안 온다.?그 시어머니도?2008년도에?98세로 돌아가셨다.
소록도에서 나와서 함안 농장으로 왔거든.?와서 보이까 우리 시어머니가 아들도 없이 손자 다섯을 데리고 살고 있는데,?나라로부터 아무 도움도 못 받고 살고 있는 기라.?하기사 누가 나서서 아들 하나는 죽고 하나는 몹쓸 병 걸리 있고,?며느리는 집나가고 없는 촌 할멈한테 관심을 두겄노.?우리 영감이 면사무소에 참 뻔질나게 다니고 항의도 하고 애원도 하고 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됐다.?우리가 보태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그래도 그 돈이라도 나라에서 나오니까 밥은 안 굶고 손자들 공부는 시킸다.
60년 도에 소록도에서 통마늘 농사 지어서 서울에다 팔았는데,?얼추?1년에 한 천만 원씩은 되는 것 같더라.?그때는 보상 없었다.?무임금 노동이라고 들어 봤제??그런 기다.?돈 달라고 말도 못한다.?참 일 마이 했다.?불쌍한 우리 언니가?85년도에 죽었다.?그리 가엾고 또 가엾게 살다가,?나 생매장 안 시킬라고 내 배위에 엎어져서 그리 울던 큰 언니가 결국은 갔다.?언니가 죽자 우리도 소록도에서 나왔다.?그때는 우리가 나가고 싶다 하모 내보내주고 했다.?가운데 언니는 외동딸 하나 낳고 부산에서 살고 있다.?건강할 때는?1년에 한 두 번 씩 왔다 갔는데,?인자 늙고 몸이 안 좋은께 오도 못한다.
사회에 나와서 정착촌으로 갔는데 거가 함안 농장이다.?처음에는 짐승을 키웠는데,?품삯으로?50만원을 받았다.?기분 좋지.?일하고 돈을 받으니 아침부터 밤까지 참말로 열심히 했다.?죽기 살기로 일해서 우리 명의로 된 짐승도 사고 그리 했지.?니 보다시피 내 폴이 이렇다 보니 크게 힘쓰는 일은 영감이 했다.?나도 하는 데까지 힘을 보태도 다리도 나무 다리고 폴도 이리 해 갖고 뭐 그리 큰일을 했겄나.?밥하고 집안 일 하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렵더라.
학교??응,?다닜다.?소록도에서 학교를 다닜다.?집에서는 국민학교?4학년까지 댕깄는데,?소록도에 중학교가 생기서 들어가서 배웠다.?영감 만나 결혼하고 나서 학교 갔지.?재밌더라.?영감도 다니지 말라는 말은 안 해.?소록도 교회 안에?1960년도에 야간 성경 고등학교가 생깄다.?그게도 댕기고 있었는데,?고마?63년도부터 학생들 보고 오마도 공사에 가라카대.?오마도 공사에 학교 학생들을 죄다 데리고 가서 일 시킨다고 학교를 보내주나,?못 가게 하는 기라.?해뜨모 학교가 아이라 오마도로 갔다.?그래서 고등학교는 저절로 없어졌지.?그 길로 공부는 끝났다.?오마도 이야기는 안 하고 싶다.?참 마이도 죽고,?흔적도 없이 갔다.?일하다가 바다에 빠져 죽고 파도에 휩쓸리 갖고 죽고 일하다가 죽고……
97년도에 여게 성심원으로 왔다.?더 이상 일도 힘들고 조카들도 얼추 크고 하니까 영감이 이리 오자고 하더라.?그래서 시어머니하고 조카들 단도리 좀 해 주고 돈?○○○원 들고 여게 와서?201동에 살림을 풀었다.?그때는 성심원이 지금하고 좀 달랐다.?응,?그렇지.?지금이 더 좋아졌지.?영감이 죽고 나서도 한참 동안 밥해묵고 있었다.?근데 폴이 이리 덜렁거리고 힘이 없은께 밥 한 끼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고달파.?관절 때문에 팔에 기브스도 했는데,?밥을 제대로 해 묵을 수가 있어야지.?밥 한 끼 묵는 기 어찌나 고되던지 말도 못한다.
여게 요양사에 방이 없어서 못 들어오고 있다가 작년(2013년) 10월에 들어 왔다.?아이고,?암만 낫지.?밥 주제,?청소해 주제,?목욕 시켜 주제,?이런 데는 없다.?내가 시를 하나 썼는데 한번 봐라.?직원한테 불러주고 직원이 이리 종이에 옮겨서 갖다 놨다.?여게다가 내가 곡을 붙이서 노래 해 보꾸마.
성심원 구름이 두둥실
멀리 멀리 퍼지네.
너는 아느냐
성심원을……
나그네 천국이라는 걸
(중략)
성심원 바람이 두리둥실
온 세계에 퍼지니
너는 아느냐……
성심원이 장애인 동산이라는 걸
-2014년?4월?4일 구술-
이거는?4분의?4박자로 불러야 된다.?샤프(샵, #)를 넣어서 센트(크레센도)로 불러야 한다.?알지.?샤프와 센트는 높고 강하게,?프렛은 낮게 불러야지.내가 이래봬도 성가대 경력?30년이다.?소록도에서 교회 다닐 때도 노래 부르고,?천주교 다니고 나서도 노래 불렀다 아이가.?이거는 얼마 전에 소록도 갔다 와서 지어 봤다.?혼자 지어 갖꼬 혼자 노래 부르고 그랬다.

성심원은 우리 같은 나그네의 천국이다.?성심원이 좋다.?그런데 소록도에 가니까 예날 생각이 나고 눈물이 나대. (성심원)요양사에서 옆방 사람하고 맘이 안 맞아 속이 상해?‘나갈까’?하는 생각이 든다 한께 전에 같이 소록도에 있던 사람들이 오라고 하더라.?잘 지내던 사람들이 좀 남아 있더라.?다 안 죽고 살아 있더라.?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다 못 만나고 왔다.?그게는 방도 항상 준비돼 있다 카더라.?벽지도 새 거고 방마다 에어컨도 있고……그게서 살다가 성심원으로 가고 싶으모 가도 된다고 그라더라.
소록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병원이다.?그게는 워낙 이름이 알려져 있으니까 봉사자들이 많아서 아픈 사람들은 방마다 밥도 갖다 주고 하더라.?여게는 직원들이 밤낮으로 안 뛰어 다니나.?참 고맙고……?말로는 고마운 맘을 다 표시 못하제.?나한테는 우리 성심원 직원이 가족이다.?나는 사해에 솥단지 하나 걸어 놓고 살아도 된다.?돈 필요 없다.?나는 생활보호대상자라서 아파도 병원에서 돈 안 받는다.?이 나이 되고 보이 자식 하나 못 남긴 것,?그것만 억울하다.?나 죽고 나모 우리 영감이나 나나 누가 기억하겄노.
옛날에 우리 아부지가 그러는데,?내 사주가 남자 같았으모 사모관대를 쓸 사주인데,?여자로 태어나서 국록을 먹는다고 했단다.?큰 기와집 밑에서 전깃불 아래에서 산다고 했다는데 딱 맞다.?그 말을 모리겄나??내가 지금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묵고 사니 국록을 받아 묵는 기고,?소록도에 가니까 전깃불이 있더라.?그라고 지금 성심원,?이 큰 집이 내 집 아이가.?기와집이라는 거는 진짜 기와집이 아이고 큰 집이라는 뜻이라.?니도 참,?그리 못 알아 듣나?
울 아부지 함자는?‘양재만’,?울 엄마는?‘김순이’,?나 때문에 화병 걸린 우리 아부지는 일흔일곱에 돌아가시고 울 엄마는 이부지 뒤에 가셨다.?나는 원래1941년?3월?27일(음력)에 태어났는데,?호적에는?12월?10일로 되어 있다.?이유를 모리지,?왜 틀리게 되어 있는지.?내 밑으로 남동생이 다섯 명 있었다. 5남?4녀이다.?내 밑으로 아들이 줄줄이 나왔제.?내 이름 덕 좀 본 기라.?이런 이야기도 인자 다 부질없다.?세상이 허무하다.
요 앞에 날이 따시모 경호강에 가서 앉아 있으모 낚시하는 사람들을 제법 만난다.?고기 잡는 모습을 보모 참 사는 모양이 다 다르다.?어떤 사람은 내가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본 척도 안하고,?어떤 사람은 대답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먼저 말을 걸기도 한다.?어떤 사람은 잡은 고기 다 가져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잡은 고기를 놓아주고 빈 바구니 들고 간다.?잡았던 고기를 놓아 주모 고기가 물에 들어가자마자 파드득 놀래서 꼬랑댕이를 흔들며 가는 기 귀엽다.?그런 사람은 고기를 낚는 게 아이고 강가에 서서 세월을 낚는 기라.
그나저나 인자 나 시모임에 안 갈란다.?왜는,?그냥 안 갈란다.?처음에는 시를 모린다 하고 안 쓰던 사람들도 인자는 다 시를 써 와서 읽고 하는데,?나는 니 보다시피 연필을 쥘 수가 있나,?글을 쓸 수 가 있나.?머리속에 기억해놔도 그마 자고 나모 다 잊어버린다.?직원들도 바쁜데 내가 생각날 때마다 어찌 자꾸 써주라고 하노.?그리하모 안 된다.?사람이 미안한 거를 알아야지.내 생각만 하고 그라모 안 된다.
니가 서운하다고??그래도 안 갈란다.?뭐 내가 안 간다고 서운하노.?다른 사람들도 안 있나.?마이 서운하다고??섭섭하다고??맘이 안 좋다고??알겄다.생각해 보꾸마.?그래도 자꾸 신경이 쓰이고 그렇다.?나만 가만 있는 것 같고……?내 다시 생각해 볼게.?니가 그리 서운다 하모 그것도 내가 잘못하는 기제.?응,?응,?알겄다.?알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