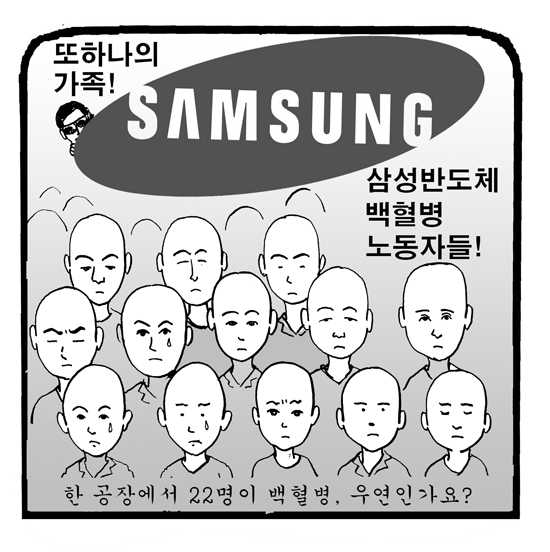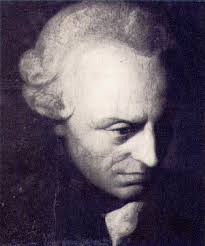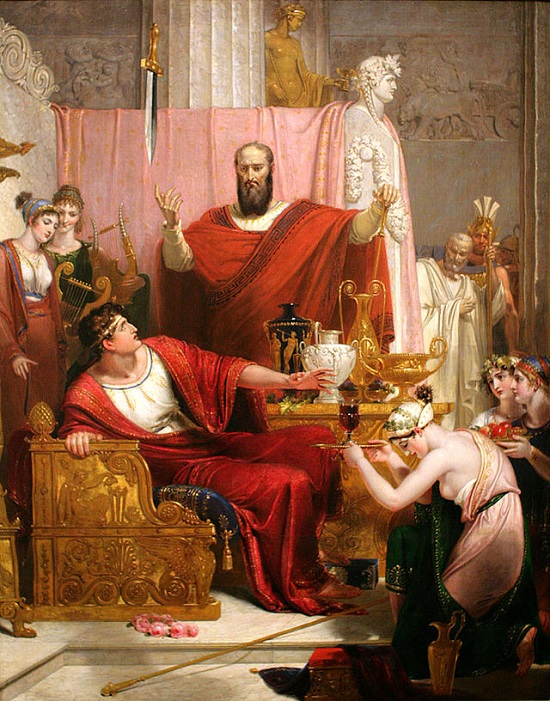“너도 늙으면 할미꽃 된다.”[김성리의 성심원 이야기]-6
“너도 늙으면 할미꽃 된다.”
?김성리(인제대 인문의학연구소 연구교수)
15살에 어머니 손잡고 애락원 가던 날
외동딸 나를 “가스나”라고 부르던
어머니
가면서 돌아보고 또 돌아보던
내 어머니
할미꽃 꽃대 꺾어 머리에 꽂으면
“너도 늙으면 할미꽃 된다”
세상 보려고 나온 생명인데
그렇게 꺾어 되느냐 가르치시던
여자도 배워야 한다고
힘들게 가르친 딸 대신하여
졸업장 받아들고
소리 없이 우셨을
어머니
내 어머니
– 이○○, 2014년 2월 19일 구술 내용에서 발췌-
애락원에 갈 때 내 나이는 열다섯 살이었다. 외동딸이라고 나를 귀하게 여겼던 어머니는 부를 때 이름 대신 꼭 “가스나야”하고 부르더라. 여자도 배워야 한다고 어머니가 우겨서 좀 늦게라도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다. 어머니는 밥장사를 했는데, 글자를 몰랐다. 그라께 여자도 배워야 한다고 그리 안 우겼겠나. 내가 열서넛 살 되었을 끼다. 그때부터 안 좋았다. 손가락이 자꾸 뻣뻣해지는 기라. 주물러도 그 때뿐이고 좀 지나면 다시 뻣뻣해졌지.
학교에서 무용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 손가락을 펼치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구부리기도 했다. 왜 그리 손을 많이 쓰는지 무용 선생님이 원망스럽더라. 아이들은 무용시간이 좋아서 들떠 있는데 나는 그럴 수가 없더라. 다른 데는 크게 표도 안 나고 그때는 발도 괜찮았는데, 뭔 조화인지 손가락부터 안 좋아지더구먼. 손가락이 뻣뻣하니까 손 모양을 따라 할 수가 없잖아. 혹시 내 손가락을 보고 친구나 선생님이 병 걸린 걸 알까봐 조마조마했다.
무용 수업이 있는 날은 아침부터 손을 궁둥이 밑에 넣어 깔고 앉아 있었다. 그러면 따뜻한 온기와 몸무게가 있어서 안으로 꼬부라져 오는 손가락이 잠시 펴진다 아이가. 겨우겨우 무용 시간이 끝나면 왜 그리 어린 마음에도 맘 한 구석이 허해지던지… 그리 애를 써도 손가락은 자꾸 굳어오고 안으로 오그라들더구나. 밥장사하던 우리 어머니는 아무리 바빠도 조그만 틈만 나면 내 손을 주물러 줬다.
친구들이 처음에는 아무 것도 모르고 내 손을 흉내 내고 놀렸지만 나하고 잘 놀았는데 언젠가부터 드문드문해지더라. 나는 얼굴도 작고 피부도 하얗고 고와서 오물짜 같다고 했다. 그리 하모 뭐 하노. 나중에는 찾아오는 친구도 없고 놀 친구도 없는데. 놀 사람이 없고 동네 사람들 눈치가 보이니까 자꾸 산에 갔다. 산에는 나보고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도 안 들리제. 그래서 산에 갔다.
우리 동네 뒷산에는 할미꽃이 참 많았다. 지천에 널린 게 할미꽃이었다. 초봄부터 여름이 다 갈 때까지 지천으로 피어 있었다. 할미꽃 뿌리는 기침에 참 좋은 약이 된다. 모양은 그래도 그 꽃은 여러 모로 잘 쓰면 좋은 기 많다. 혼자 산에서 놀다가 심심할 때 꽃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밑자루 있는 데가 불그스름하게 보인다. 고개 숙이고 외진 데에 피어 있는 할미꽃이 꼭 남의 신세 같지 않더라. 한참을 보다가 꽃대를 꺾어서 머리에 꽂고 산을 여기저기 그리 돌아다녔다.
할미꽃을 귀 옆에 꽂고 좋다고 집에 돌아오모 우리 어머니는 항시 같은 말을 하셨다. “너도 늙으면 할미꽃 된다.” 그러면 나는 픽 웃고 말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세상 보려고 나온 생명인데 그리 꺾어 되느냐고 안쓰러워하던 어머니 마음을 이제는 알 것 같다. 병든 어린 딸이 무심코 꺾은 그 생명이 그냥 예사로 보이지 않으셨던 게야. 그리 함부로 꺾다가 혹시라도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모 어쩔까 걱정이 앞섰던 게야.
열다섯 살이 되니 그나마 학교에 가기도 힘들어졌어. 동네 사람들도 학교 선생님도 모두 나를 어디로 보내라고 어머니를 졸랐다. 우리 어머니는 우짜든지 나를 안 보내려고 용을 썼지만, 어쩔 수 없어서 애락원으로 가기로 했제. 우리 엄마가 해주는 국밥을 먹으러 오던 단골 중에 손상이라는 떠돌이 곡식 장수가 있었는데, 그 양반이 애락원을 말해줬어. 열서너 살에 말해줬는데 우리 어머니가 안 보낼라고 모르는 체 했거든.
더는 못 버티고 우리 어머니 손잡고 애락원으로 갔는데, 문 앞에서 헤어져야 하는 기라. 병자 아닌 사람은 안으로 못 들어가. 문을 가운데 놓고 엄마도 나도 손을 못 놓고 꼭 잡고 있었다. 보다 못한 직원이 나서서 강제로 꼭 잡고 있던 손을 떼어 놓고 나를 문 안으로 들이 밀었어. 나는 문 안에서 우리 어머니 보고 우리 어머니는 문 밖에서 나를 봤다. 담도 아이고 문을 가운데 놓고 들어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리 그리 서로 바라만 봤다. 돌아가야지.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가야 하고 나는 애락원으로 들어가야 하제. 어머니는 가면서 돌아보고 몇 발자국 가다고 또 돌아보고 했다. 나는 그냥 물끄러미 보고 있었다.
초등학교를 5학년까지 다니다가 애락원으로 갔다. 글도 모르고 밥장사하는 어머니였지만, 하나뿐인 딸은 공부도 가르치고 예삐게 그리 키우고 싶어 하셨다. 세상 부모 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어머니 생각은 지금도 난다. 근데 왜 어린 시절에는 기억이 잘 났는데 중년 이후로는 이리 기억이 흐리지노? 그리 우겨서 힘들게 보냈던 학교를 나는 졸업식에 못 갔다. 우리 어머니가 나 대신 졸업장 받아왔지. 얼매나 울었을꼬. 나도 어미 되고 이리 늙어가니 새삼 어머니가 보고 싶다. 참 보고 싶다.
우리 어머니는 여걸이었다. 실수가 없었다. 손끝이 야무져서 바느질도 참 잘하고 음식도 맛깔스럽게 잘 했다. 그래서 동네 큰일이 있으모 뽑혀가서 음식을 만들고는 했다. 밥장사는 고령 장날만 장에 가서 했다. 집에서는 떠돌이 장사치들을 상대로 하숙을 했다. 장사치들이 장을 따라 다니기도 하고 물건을 지고 여기저기 다니거든. 그러다가 우리 동네 가까이 오모 꼭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가는 기라. 그런 하숙이지. 애락원이 있다고 알려 준 손상도 그런 사람이었다. 손 씨인데 그때는 손상이라고 했다.
애락원에 들어갈 때 만원 줬다. 그때 그 돈은 엄청 큰 돈이었다. 굳이 돈을 안 줘도 되는데 우리 어머니는 나를 보내면서 그리 큰 돈을 줬다. 애락원은 병원 같은 데였다. 플래처 선교사가 의사이기도 했는데, 그 때는 건물이 2개 있었다. 나병원이라고 하더라. 우리 어머니는, 글도 모리던 우리 어머니가 시장에서 국밥 말아 팔고 장사치들 밥해 준 돈 만원을 내 치료해주라고, 잘 치료해서 꼭 낫게 해주라고 애락원에 냈다.
나는 ‘불효자는 웁니다’ 노래를 들으면 울고, 어머니 생각해서 울고 그냥 울고 매일 밤 한 번은 운다. “불러 봐도 울어 봐도 못 오실 어머님을 원통해 불러 보고 땅을 치고 통곡해요.다시 못 올 어머니 불초한 이 자식은 생전에 지은 죄를 엎드려 빕니다.” 이리 부르고 어머니 생각하고, 휴우~~~ 말해도 소용없는 지난 일 생각하고…… 그래서 운다. 그리 힘들게 번 큰돈을 갖다 바쳐도 안 되는 게 이 병이더라.
오빠가 있었다. 오빠는 초등학교 나와서 대구에서 포목 장사를 했다. 동생은 일본에서 대학까지 나왔다. 우리 어머니하고 오빠가 열심히 일해서 내 병원비랑 동생 학비를 댔다. 내가 병에 걸려 학교를 못 다녀도 고등수학까지는 안다. 옆에서 보고 들으면서 혼자 공부했다. 나는 경북 고령이 고향이다. 주민등록증에는 1921년 1월 5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1919년 1월 5일(양력)이다. 홍진으로 예방접종을 했다는 말은 들었다. 그때는 어린 아이들이 많이 죽었다. 그래서 호적에 늦게 올린 건가 싶다.
어머니가 해 주던 음식 중에 가죽 자반이 있다. 가죽을 뜯어서 살짝 데쳐서 말리거든. 살짝 말려야 돼. 약간 꼽꼽하게 마르면 밀가루 풀을 이파리 사이사이에 넣어서 잎을 반듯하게 만들어. 그 위에 찹쌀풀을 먹이는데, 그 찹쌀풀은 찹쌀하고 고추하고 소금을 넣어서 빻아서 만들어. 찹쌀풀을 서너 번 덧발라 줘야해. 마지막 풀이 또 꼽꼽하게 되면 통깨를 뿌리고 말려서 단지에 차곡차곡 재여 놔.
좀 맵거든. 매우니까 병에 안 좋다고 우리 어머니가 못 먹게 해. 그런데 그게 참 맛있어. 어머니 몰래 하나씩 꺼내 먹으모, 아이고 참 맛있다. 매워서 헥헥 거리면서도 훔쳐 먹고는 했다. 그리 하는 것도 있고, 여린 가죽 이파리를 소금물에 절여 꼭 짜서 말린 후에 고추장 양념해도 맛있다. 그것 말고도 갈치가 참 맛있었다. 명태도 맛있고 함흥에 청어가 많이 났는데 그 청어도 맛이 있지. 아, 참 김밥도 맛있다.
2011년부터 이상하게 입안이 헐어서 안 나아. 요 안에, 입 안에 봐라. 헐어 있는 거 보이제? 아이고 많이 아프다. 김치를 참 좋아하는데 김치도 못 먹고 매운 것도 못 먹고 하니까 어머니가 만들어 주던 게 자꾸 생각이 나. 죽을 먹는데 김치도 없이 뭔 맛으로 묵노. 오늘은 김치를 물에 씻어서 먹었는데 그것도 김치라고 좀 낫더라. 전에 여기 성심원에 의사로 있던 이비인후과 선생이 요새도 한 번씩 오거든. 내처럼 이리 입안이 헐고 아픈 거 공부해서 꼭 낫게 해준다 했는데, 그 공부가 어려운가 아직 안 낫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