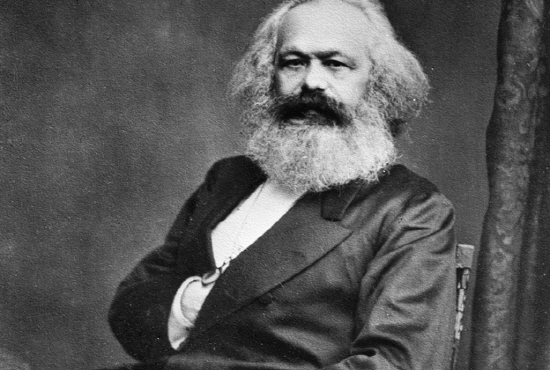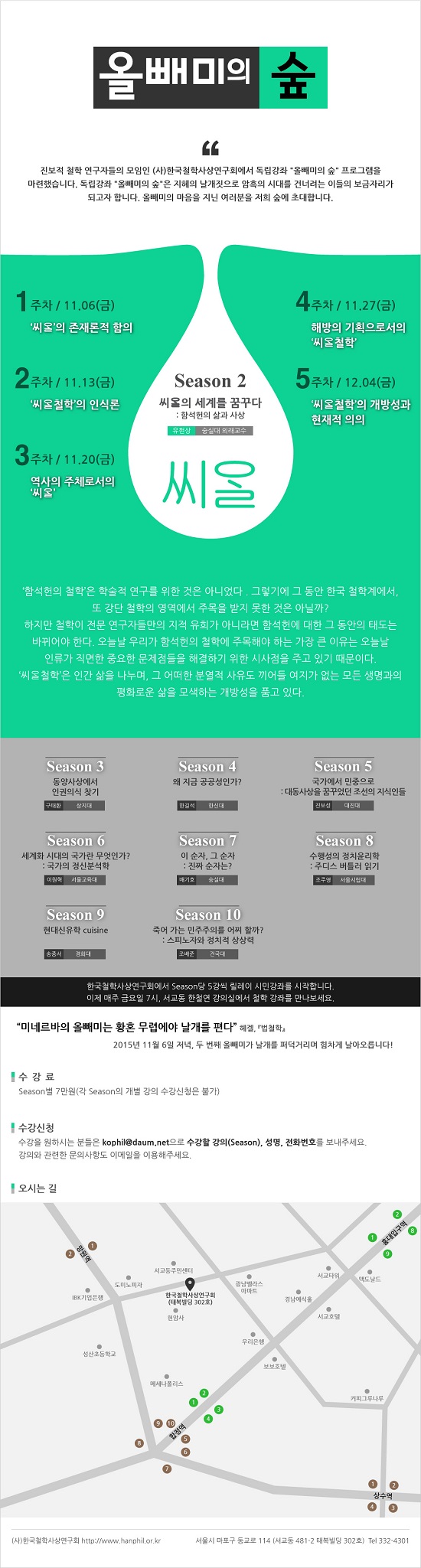있는 것이 아니면 없는 것이라고? 천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도 있어 [철학을다시 쓴다]-31-1
있는 것이 아니면 없는 것이라고? 천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도 있어 [철학을다시 쓴다]-31-1
윤구병(도서출판 보리 대표)
*이 글은 보리출판사의 허락을 받아 게재한 것임을 알립니다.
이제 미루고 미루고 또 미루어 왔던 ‘운동’의 문제라는 ‘벼랑 끝에서 허공으로 한 번 내딛기’의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이 문제를 다룰 길을 찾아왔지만 여전히 저는 사막 한가운데서 제자리를 맴도는 여행자의 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 변화된 환경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쭈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그 동안 몸담아 왔던 지방 대학을 떠나 한 해 말미로 이 땅에서는 가장 머리 좋은 학생들이 모여 있다는 중앙 도시의 국립 대학 대학원 철학과 석사 과정 학생들에게 ‘존재론’을 강의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 계획은 거창했습니다. 이 기회에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양 존재론 전통의 맥을 짚어 가면서 ‘존재’와 ‘운동’의 문제를 중심에서부터 파고들자는 욕심을 부렸으니까요. 이 무리한 욕심이 저를 파멸로 몰아넣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저는 제가 빠져들 수밖에 없는 ‘운동’의 깊은 늪에 뛰어드는 시기는 되도록이면 뒤로 미루자고 마음먹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은 그 동안 제가 조금씩 쌓아올렸던 존재론의 비축 양식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것으로 버텼습니다. 잘 하면 이미 쌓아 놓은 양식으로 한 학기를 더 버틸 수도 있겠다는 약삭빠른 생각이 문득 머리에 떠올랐지만 저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어차피 이번 한 학기가 제가 대학에 머무는 마지막 날들이었습니다. 다음 해부터는 시골에 들어가 농사를 지을 작정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 좋은 기회를 적당히 뭉개 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동안 망설이고 망설이면서 뜸만 들이고 있던 솥뚜껑을 열어 보자고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모순’을 회피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제 모순 속에 빠져들어 모순을 극복할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원탁 강의실에 둘러앉아 저를 지켜보고 있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두 점이 있다고 칩시다. 점〔point〕은 물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하나로 있는 것이 그렇듯이 크기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것은 모든 끝(한계, peras)이 그렇듯이 크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두 점은 우리가 감각으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감각에 들어오지 않는 이 두 점이 서로 관계를 맺는다고 칩시다. 당구공 두 개가 서로 맞닿아 있는 당구대를 연상해도 됩니다. 이 때 서로 맞닿아 있는 이 두 점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제 물음이 무슨 뜻을 지녔는지 모르는 눈치가 역력했습니다. 저는 달리 물어야 하겠다고 느꼈습니다.
“두 개의 점이 나란히 맞닿아 있을 때 이 두 점 사이에 크기(또는 길이)로 드러나는 공간이 생긴다고 보아야 하겠습니까?”
제 질문에 어떤 학생이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선생님, 점은 본디 크기가 없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크기가 없는 두 점이 나란히 놓여 있다고 해서 그 사이에서 크기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크기가 없는 두 점이 맞닿아 있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지요? 만일에 두 개의 점이 맞닿아 있는데 그 사이에 크기가 없다면, 다시 말해서 두 점이 서로 따로따로 차지하는 자리가 생겨나지 않는다면 그 두 점은 한 자리에 있다는 말이 되고, 두 점이 한 자리에 있다는 말은 두 점이 겹쳐서 하나가 된다, 곧 합동(合同)이 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끝, 곧 한계〔peras〕가 하나인 것만이 크기를 갖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두 개의 점이 있다는 말은 끝이 두 개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지요? 끝이 둘인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지요?”
“선〔line〕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옛 피타고라스학파의 전통에 따르면 끝이 두 개인 것은 선분이라고 정의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선〔line〕에서 두 끝 사이에는 끝이 없는 것〔apeiron〕이 들어 있지요? 따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점이 두 개 있고, 그 두 개의 점이 관계를 맺으면 그 두 점 사이에는 끝이 아닌 것, 곧 끝이 없는 그 무엇, 다시 말해 크기가 생겨나고, 길이로 나타나는 끝이 아닌 그 무엇과 두 개의 끝을 서로 연관시켜 우리는 그것을 선분으로 정의한다고 말입니다.”
“글쎄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럴싸하기는 한데, 그래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데요. 어떻게 크기가 없는 점 두 개가 맞닿는다고 해서 그 사이에서 크기가 생겨난다, 공간적인 거리가 생겨난다고 할 수 있지요?”
“그것이 바로 둘이 가지고 있는 신비한 특성이자 하나와 다른 점이지요. 모든 하나는 어떤 하나이든 크기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간의 규정을 벗어납니다.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형상〔idea〕의 세계에는 모든 형상이 하나하나 다 고립되어 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에 공간이 없습니다. 플라톤의 형상들은 하나, 둘…… 하고 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찌어찌해서 어떤 하나가 다른 하나와 관계를 맺어 둘을 이루면, 다시 말해 둘이 나타나면 이 둘 사이에는 이 하나도 아니고 저 하나도 아닌 것이 나타나는데, 점의 형상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듯이 두 개의 하나가 저마다 크기가 없는 것, 끝, 한계이므로 이 하나도 저 하나도 아닌 것은 크기가 없는 것이 아닌 것, 끝이 아닌 것,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둘이 없으면 크기도 없고 공간도 없습니다. 둘은 이 하나와 저 하나의 만남의 다른 이름이고, ‘실체’의 이름이 아니라 관계의 이름입니다. 여럿에는 실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둘(여럿의 최소 단위)은 있는 것이 아니고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있는 것은 하나이지 둘은 아니니까요.”
“아니, 선생님! 그런 터무니없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께서는 분명히 ‘이 하나, 저 하나’‘점 두 개’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여러 하나’라든지 ‘모든 하나’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런데 금방 말을 바꾸어 하나, 둘, 셋……으로 셀 수 있는 하나가 두 개가 모여서 둘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둘이나 여럿이 ‘만남의 이름’이고 ‘관계의 이름’이라니, 그런 엉터리없는 논리의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정하지요. 저는 지금 분명히 모순되게 여겨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말은 모두 사유의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추론을 반영하는데, 알다시피 추론에는 공간, 다시 말해서 이 하나도 아니고 저 하나도 아닌 것, 규정할 수 없는 것이 끼어들어, 하나가 아닌 것을 하나로 보이게도 하고, 관계를 실체로 여기도록 만들기도 하니까요. 미리 앞당겨서 성급히 이야기하자면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도 없고, 추론을 이끌어 낼 수도 없는데, 없는 것을 생각하고 없는 것을 바탕으로 추론이 전개된다는 한계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이렇게 왔다갔다한다고 보면 되겠지요. 아무튼 이제까지 내가 한 말 가운데서 이 말만 귀담아들어 두면 됩니다. ‘공간은 두 하나의 만남에서 생겨나는데, 하나는 하나이지 둘이 될 수 없으므로, 두 하나라는 말은 관계 맺음의 다른 이름이다.’”
학생들은 의아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지만 저는 짐짓 모르는 척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씨름해야 할 문제는 공간의 생성 배경이 아니라 ‘운동’의 생성 배경이라고 보았고, 어차피 ‘운동’과 ‘공간’은 한배에서 태어난 쌍둥이이므로 ‘운동’의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공간 탄생의 내력도 저절로 드러나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두 점이 만날 때 드러나는 또 하나의 이상한 사건을 학생들에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자, 다시 두 점이 맞닿아 있는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 봅시다. 크기가 없는 점이 맞닿아 있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기 힘들다면 당구공 두 개가 맞닿아 있는 모습을 머리에 떠올려도 좋겠지요. 당구공 두 개는 한 점에서 맞닿아 있겠지요? 우리는 이 점을 ‘접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접점은 당구공 두 개 가운데 어느 것에 속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묻자 한 학생이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접점이 어느 당구공 하나에 속한다고 말하기는 힘들겠는데요.”
“그러면 그 접점은 당구공 두 개에 모두 속한다, 그러니까 당구공 두 개가 접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나요?”
“그렇다고 보아야겠지요.”
“그렇다면 ‘어느 한 점을 공유하고 있는 두 개의 당구공은 붙어 있다.(이어져 있다.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둘이 아니다.’라는 반론이 나온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무어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글쎄요. 참 대답하기 곤란한데요. 그러니까 그 접점은 어느 순간에는 이 공에, 또 다음 순간에는 저 공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이 공, 저 공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두 공이 맞닿아 있게 하는 촉매 역할을 한다고 보아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두 개의 공이 맞닿아 있을 때 이 ‘두 개의 공은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지요?”
“소박하게 표현하면 붙었다 떨어졌다 한다고 할 수도 있고…… 다시 말해서 접점이 끊임없이 운동한다고 할 수도 있고…….”
“더 엄밀하게 정의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입체인 구(球)를 단순화해서 두 개의 원(圓)이 맞닿아 있는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 보기로 합시다. 이 때 두 개의 원은 한 점에서 만난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접점이라는 말이 생겨났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위에서 우리는 ‘점은 끝(한계, peras)이 하나인 어떤 것을 말한다, 그리고 끝에는 크기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는 어떤 하나이든 크기가 없고 따라서 운동하지 않는다(정지해 있다)’는 말도 했지요?”
“예, 파르메니데스가 증명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두 원 가운데 어느 하나를 다른 원 위로 굴려서 처음에 두 원이 맞닿아 있던 점까지 한 바퀴 돌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때 한 원의 모든 끝은 다른 원의 모든 끝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맞닿는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잘 생각하고 대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유의 실험에서 우리는 아주 기묘한 결과를 얻게 되니까요.”
“무엇이 기묘하지요?”
“먼저 원 둘레의 모든 점은 한정된 것〔peperasmenon〕이므로 이 한정된 것의 집합도 역시 한정된 어떤 것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나 원주율을 측정하려는 현대 수학은 아직까지도 한정된 측정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반복되는 수의 계열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주율에는 한정되지 않는 어떤 것이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되풀이되지 않는 수의 계열이 무한히 연속된다는 것은 원을 이루는 곡선 안에 무한〔apeiron〕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지요. 우리의 추론과 실제 측정치 사이의 이런 불일치가 기묘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거 참! 그건 그렇다 치고 다음으로 기묘한 결과는 어떤 것을 가리키지요?”
“점은 끝이고 크기가 없는 것이라는 정의가 맞다면, 크기가 없는 점을 무한히 더해 보아야 크기가 있는 어떤 것이 나올 수 없는데, 알다시피 선분〔line〕의 한 끝을 한 자리에 고정시켜 놓고, 다른 끝을 고정된 한 끝과 같은 거리로 움직여서 드러나는 자취를 그린 원은 크기를 갖게 되거든요. 크기는 없지만 서로 맞닿아 있는 두 개의 점을 가지고 실험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크기가 없는 것에서 크기가 나온다는 것이 기묘하지 않습니까?”
“이거야 뭐. 야바위 노름 같은 느낌이 드는데, 선생님 말씀을 드러내 놓고 야바위 노름으로 몰아붙이기도 그렇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당장 뭐라고 하기 힘든데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접점의 성격을 살펴봅시다. 접점은 서로 맞닿아 있는 두 개의 점이지요?”
“그렇습니다. 아 참! 그렇고 보니 끝이 두 개 있으면 그 사이에 끝이 없는 것, 크기로 드러나는 것이 끼어들어 선분〔line〕으로 규정된다는 이야기를 앞에서 하셨지요?”
“기억을 해냈군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접점의 성격 가운데는 더 까다로운 무엇인가가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앞에서도 잠깐 비쳤지만 그걸 이른바 둘이 가지는 모순, 둘에서 생기는 원시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선 모순의 측면을 적극적인 것으로 원시 우연의 측면을 소극적인 것으로 나누어 놓고 생각해 봅시다. 먼저 두 점이 만나면 그 사이에서는 원초적인 공간 규정인 크기도 생겨나지만, 원초적인 시간 규정인 운동도 생겨난다고 귀띔했던 것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접점에서 만나는 두 점은 이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는 조금 앞서 했습니다. 그런데 만남, 관계의 성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만 있다면 만남도, 관계도 없지요. 만남은 늘 둘 이상의 무엇이 있음을 전제합니다. 그런데 있는 것은 하나로 있고, 바로 하나라는 특성 때문에 사유의 공간에서도 벗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있는 것 바로 그것을 사유로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없는 것 바로 그것도 사유의 대상이 아님은 거듭해서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있다, 없다고 하는 것, 있는 것, 없는 것이라고 일컫는 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로 있는 것도 아니고, 아예 없는 것도 아닌 그 무엇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다, 없다, 있는 것, 없는 것이라고 부르는 것은 모두 관계 속에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시간과 공간의 규정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물을 볼 때 그것이 무엇임이 드러나는 측면을 보고 있는 것이라 하고 무엇임이 드러나지 않는 측면을 보고 없는 것이라고 부르는 일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컴퓨터는 1과 0으로 드러나는 이진법(二進法) 체계를 써서 정보를 처리하는데 1과 0은 그 자체로서는 어떤 기능도 할 수 없습니다. 컴퓨터의 전원(電源)을 꺼 버리면 컴퓨터 안에서 1과 0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이에 따라 컴퓨터 화면에 떠올랐던 모든 정보는 눈 앞에서 사라집니다. 우리가 앞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이야기했듯이 1(하나)을 있는 것으로 보고 0을 없는 것으로 보면 모든 정보의 체계는 바로 이 1과 0을 관계 맺어 주는 ‘운동’(이 말을 1과 0의 만남에서 생겨나는 운동이라고 불러도 됩니다.)에서 세워진다고 볼 수 있겠지요.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는 어떤 사물의 끝(겉이라고 불러도 좋고 갓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이 세 낱말─끝과 겉과 갓은 같은 말에서 나왔으니까요.)을 보고 그것이 무엇임을 알고, 그 무엇인 것을 있는 것이라고 부르고, 그 사물의 안(끝도 갓도 겉도 없는 측면)은 보이지 않으므로 무엇인지 알 수 없으니까 무엇임이 드러나지 않는 이 측면을 가리켜 없는 것이라고 흔히 부른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겉과 속, 안과 밖, 끊어진 데와 이어진 데가 있는 모든 것은 관계 맺음이 드러나는 한 방식이며, 이 방식을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크기와 운동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관계에서 공간 규정과 시간 규정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있는 것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인 것, 다시 말해 규정할 수 있는 어떤 것이고, 없는 것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다시 말해 어떤 방식으로도 규정되지 않는 어떤 것이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늘 이 세상에는 진짜로 있는 것도 없고 진짜로 없는 것도 없다고 주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지요?”
“이를테면 나 윤구병은 윤구병으로서는 있는 것이지만 나 밖의 다른 모든 사람으로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윤구병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그물코에 얽혀 있는 관계의 산물이라는 뜻이지요. 다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적으로 여기 있는 것은 저기 없는 것이고, 저기 있는 것은 여기 없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없는 것이고 미래는 아직 없는 것인데 지금 있는 것인 현재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과거―현재―미래라는 시간의 흐름을 형성합니다. 내가 시간과 공간을 비롯해서 여럿과 운동으로 드러나는 삼라만상 모두가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이름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여기에 있지요.”
“선생님은 없는 것이 있다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사는 이 시공간에는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없는 것이 있다는 말은 빠진 것이 있다는 말과 같다고도 하셨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없는 것은 빠진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없는 것이 갖는 특성 가운데 두드러진 것 하나가 바로 빠진 것, 결핍이지요.”
“그런데 빠진 것은 과거에 있었던 것이 지금 없는 것을 가리키거나 어느 자리에 있는 것이 다른 자리에는 없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빠진 것이 있다는 말은 있을 것이 없다 함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있을 것은 반드시 과거에 있었던 것만을 가리키거나 지금 있는 것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지만 머지않아 있게 될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또 여기에도 없고 저기에도 없고 아무 데에서도 눈에 띄지 않지만 거시 세계나 미시 세계의 어딘가에 있으리라고 짐작되는 것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아무튼 빠진 것은 무엇인가가 없음을 가리키는데 그 무엇은 있는 것을 가리킬 터이므로 없는 것이 있다는 말이 꼭 없음, 곧 허무의 실재를 전제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낱말들을 다시 한 번 달리 규정하고 들어갑시다. 그 동안 나는 일부러 있음이나 없음 같은 낱말을 쓰지 않으려고 애써 왔습니다. 우리 말에서 있음이나 없음을 하나의 개념어로서 쓸 경우에 자연스러운 우리말 질서를 깨뜨리는 흠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사이에 존재나 무(이런 말 내가 무척 싫어하는 까닭은 이미 밝혔지요?)의 여러 층위에 관해서 혼동이 있는 것 같으니, 앞에서 우리가 있는 것 바로 그것이라고 했던 것을 있음으로 고쳐 부르고, 아예 없는 것이라고 불렀던 것을 없음이라고 바꾸기로 하지요. 앞에서 여러 차례 밝혔듯이 있음이나 없음은 우리의 사유 공간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있음이나 없음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있음이나 없음을 두고 우리는 있다, 없다는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 밖에 내어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 있는 것인데, 생각은 사유의 공간에서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 공간을 벗어나는 것은 도무지 입 밖에 나올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주장대로라면 있는 것 바로 그것이나 있음이나 아예 없는 것이나 없음 같은 말도 존재나 무의 실상을 드러내는 말이라고 할 수 없겠네요.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입 밖에 낼 수도 없는 것을 근거삼아 이런 논의를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있다, 없다는 말을 빼 놓고는 여럿과 운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현상계를 의식에 제대로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있다, 없다는 말은 모든 인류의 사유에 바탕이 되는 기본 언어예요. 에이나이(einai)가 없는 그리스 말, 에세(esse)가 없는 라틴어, 에트르(etre), 비(be), 자인(sein)이 없는 불어, 영어, 독일어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언어학자들에게 우리말 있다, 없다에 해당하는 말을 일상 언어에서 빼놓고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언어 공동체가 어디 하나라도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존재론이 인식론이나 가치론 같은 철학 분야의 기초가 되는 까닭은 바로 있다, 없다는 말, 그리고 그 말이 반영하는 사유 체계의 주춧돌 위에 철학, 과학, 상식…… 이 모든 것의 기둥과 벽과 지붕과 창틀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 의식이 어떤 경로를 밟아서 추상의 최고 단계에서 나타나는 가장 보편적인 이 개념을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가장 자주 쓰는 낱말로 삼았느냐를 밝힐 수 있느냐인데, 나로서는 아직 이 수수께끼를 풀 능력이 없어요.
다만 있다, 없다는 말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하기에 앞서 어린 시절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말이고, 이 주어진 말의 통로를 따라 우리의 생각이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은 이 말 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만 밝히기로 하지요.
어쨌건 있음이나 없음은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 우리 사유의 가장 넓은 테두리를 이룹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은 이 울타리 안에서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의 의식 공간에서 있음과 없음이 관계를 맺으면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있음은 여러 하나인 있는 것들로 분산되고 없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는 하되 없다는 규정 아닌 규정을 받아들이는 어떤 것으로 바뀌어 나름으로 있게 되고 있는 것으로서 어떤 힘을 지니게 됩니다.”
“선생님이 우리의 사유 속에 있는 것이든 현실 세계에 있는 것이든 있는 것, 또는 없는 것으로 규정되는 모든 것은 실재하는 것도 실재를 부정하는 것도 아닌 관계의 이름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려는 의도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는 것, 없는 것으로 규정되는 여러 하나와 운동의 세계가 있음(하나)과 없음의 관계 맺음에서 비롯한다는 것도 받아들인다고 칩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럿과 운동 속에서는 있는 것도 없는 것도 모두 상대적 규정일 뿐이고, 있는 것이 없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없는 것이 있는 것과 다를 바도 없으며, 있는 것이 없는 것이요 없는 것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극단의 가능성까지도 인정할 수 있겠지요. 불교 경전의 하나인 《반야심경》에 나오는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色不異空 空不異色 色則是空 空則是色)’이라는 말도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교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모든 것이 모든 것과 관계를 맺어 순간순간 바뀌는 이 연기(緣起)의 세계에서 ‘늘 머무는 것〔常住〕’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덧없이〔無常〕 생겨났다가 없어졌다〔生滅〕 하겠지요.
그런데 관계라는 이 끝없는 흐름의 어느 측면을 어떤 방식으로 고정시켜서 우리는 있는 것이라 일컫고, 또 어떤 측면을 일컬어 없는 것이라고 부르지요?”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어쩌면 우리는 이 논의를 통해서 의식이 저지르는 잘못 가운데 가장 큰 잘못인 실체화의 오류(이 끔찍한 말을 용서하기를!)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살아 있는 화석(化石) 언어라고 할 수 있는 한어(漢語)를 예로 들어 이야기의 실마리를 풀어 갈까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어에는 명사가 따로 있고 동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글자가 놓이는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 명사가 되기도 하고 동사가 되기도 하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글자가 전체 문장의 어디에 자리잡느냐에 따라서 고정된 실체의 모습을 띠기도 하고 운동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섣부르다는 욕을 먹을 셈치고 물리학의 용어를 빌어 말하자면 한 낱말의 위상을 관계 고리의 어느 측면에서 관찰하느냐에 따라 낱말의 입자성과 파동성이 그때 그때 달리 드러나는데, 이것은 관찰자의 위치에 탓이 있는 게 아니라 낱말과 그 낱말이 반영하는 객관 세계의 여러 있는 것 안에 그것들을 고정시키는 공간과 그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운동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공간도 시간도 관계의 이름입니다. 공간이라는 관계의 그물 속에서 질〔quality〕은 저마다 따로 떨어져서 고정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있는 것이라고 부르는 것은 공간 관계 안에서 흩어진 모습으로 드러나는 질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시간이라는 관계의 그물 속에서는 질들이 서로 엉켜 있습니다. 이를테면 앞에서도 예를 들었듯이 하나의 기타 줄에는 무한히 많은 소리들이 한데 엉켜서 이어진 음의 계열을 이루는데, 30센티미터의 기타 줄 안에 엉킨 채로 들어 있는 저마다 다른 이 소리들의 무한한 계열을 어떤 무모한 사람이 하나하나 따로 떼어 내어 공간 속에 늘어놓으려고 든다고 칩시다. 그 사람은 현악기의 줄을 건반 악기의 건반으로 바꾸려고 들 텐데, 이 경우에 30센티미터의 현악기 줄에 담긴 소리를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담는 건반 악기의 건반 수는 무한할 수밖에 없고, 만일에 이 우주 공간이 유한하다면 그 건반 악기는 우주 공간을 다 채우고도 우주 밖에서 무한히 늘어놓이는 건반들을 주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모순되면서도 불가사의해 보이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겠습니까? 현상 세계의 모든 현상들을 공간 속에 좌표화할 수 있다는 사고는 이런 단순한 좌표화의 실험조차도 견딜 수 없는 무지몽매한 단순함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로써 밝혀졌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이 우주가 원자(편의에 따라 이렇게 부릅니다만 물질의 최소 기본 단위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겠습니다.)와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고대 원자론자들로부터 현대 물리학자들에 이르기까지 공유하고 있는 전제를 틀렸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자를 만들고, 그 자로 질과 양을 나누고 재는 일, 공간 축과 시간 축이라는 좌표를 만들어 차원을 설정하고 그 단순화된 차원 속에 삼라만상을 배치하는 일은 삶의 필요에 따라 사람의 의식이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에 텅 빈 공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진공’이라고 부르는 것도 모든 질이 다 빠진 텅 빈 순수 공간은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시간의 흐름이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향하는 이른바 ‘비가역적’이라는 말도 바르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미 개념화한 말을 빌어 표현하자면 이 우주는 서로 엉켜 있는 질〔quality〕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말을 더 단순화하면 이 우주(이 말도 개념입니다. 여기에 대응하는 실체는 없습니다.)에는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습니다. 이 우주는 일관된 사유의 법칙으로 정리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진화의 방향을 두뇌 용량을 늘리고 두뇌 회로의 길이를 연장하여 의식이 성장하는 쪽으로 돌려 삶의 길을 찾은 인간의 경우에 떼를 이루어 살아야 한다는 사정도 겹쳐, 말하자면 흐르는 물을 하나하나의 물방울로 고정시키려는 소망이 싹텄습니다. 그 소망의 가장 명료한 표현은 옛 그리스인들의 의식 속에 못박힌 뒤로 지금까지 이 우주를 재는 바뀌지 않는 잣대 노릇을 해 온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또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바뀌지 않는 세계에는 참된 변화와 운동은 없습니다. 우주 안에 있는 이러저러한 것들은 바뀔 수 있으나 우주는 바뀌지 않습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란 이러한 세계관의 반영입니다. 우주는 있는 것을 대표하는 하나, 곧 영원불변한 하나의 단위로 설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큰 단위가 설정되면 그 다음 일은 쉬워집니다. 그 큰 단위를 이루는 하부 단위들을 일정한 체계에 따라 설정하면 되니까요. 그리스 학문의 전통은 이것을 주춧돌로 삼아 세워졌고, 그 전통은 현대 과학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의심할 여지없는 전제 위에 서구 과학도 종교도 서 있습니다. 이 우주는 하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그 우주는 그 사람들의 우주고 당신들의 우주입니다. 내 우주에는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습니다. 거꾸로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내 우주에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마찬가지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