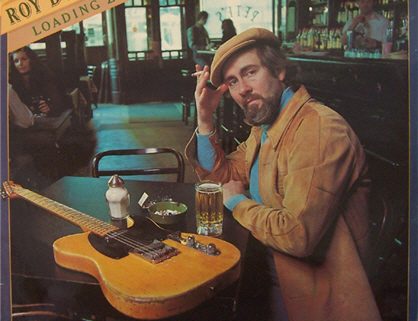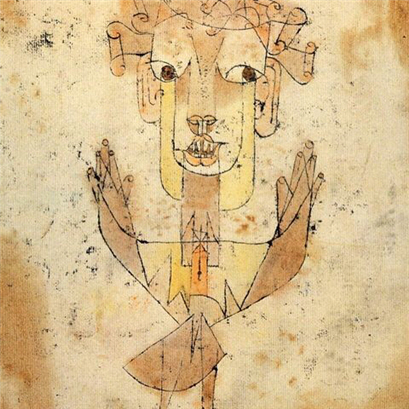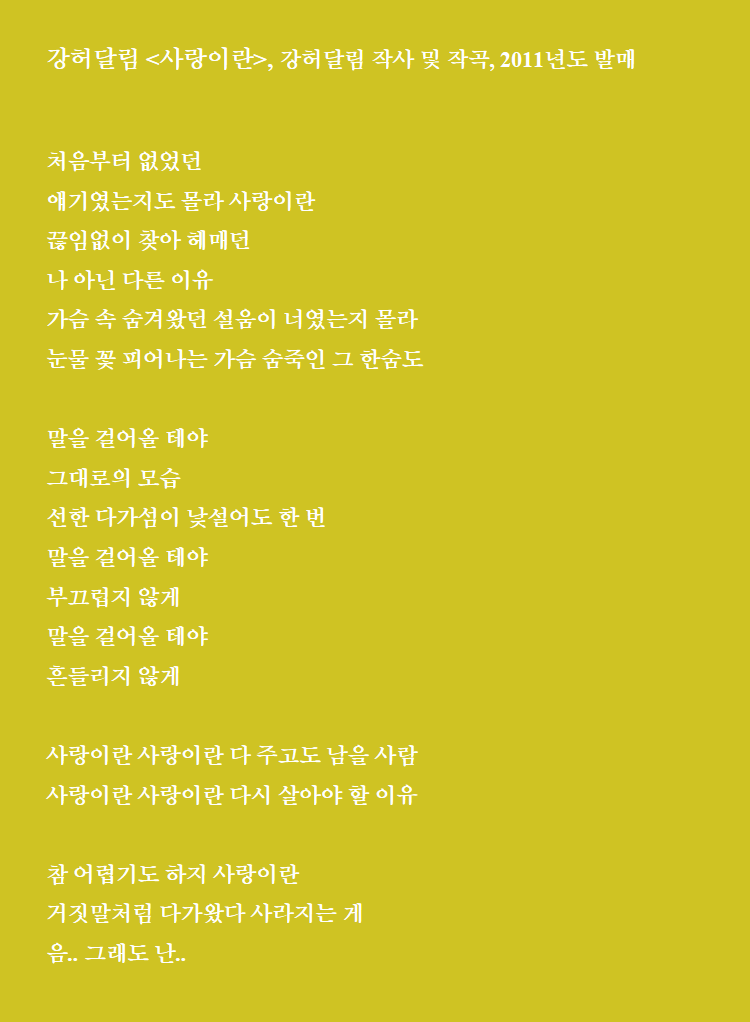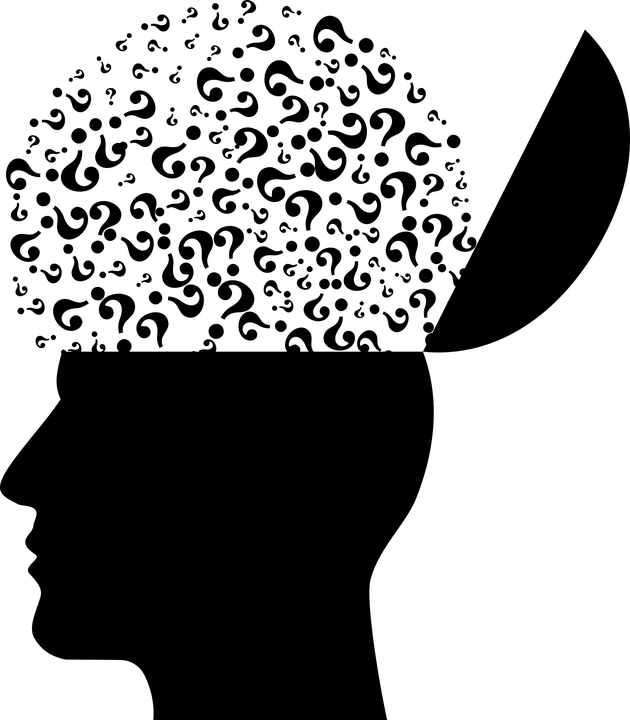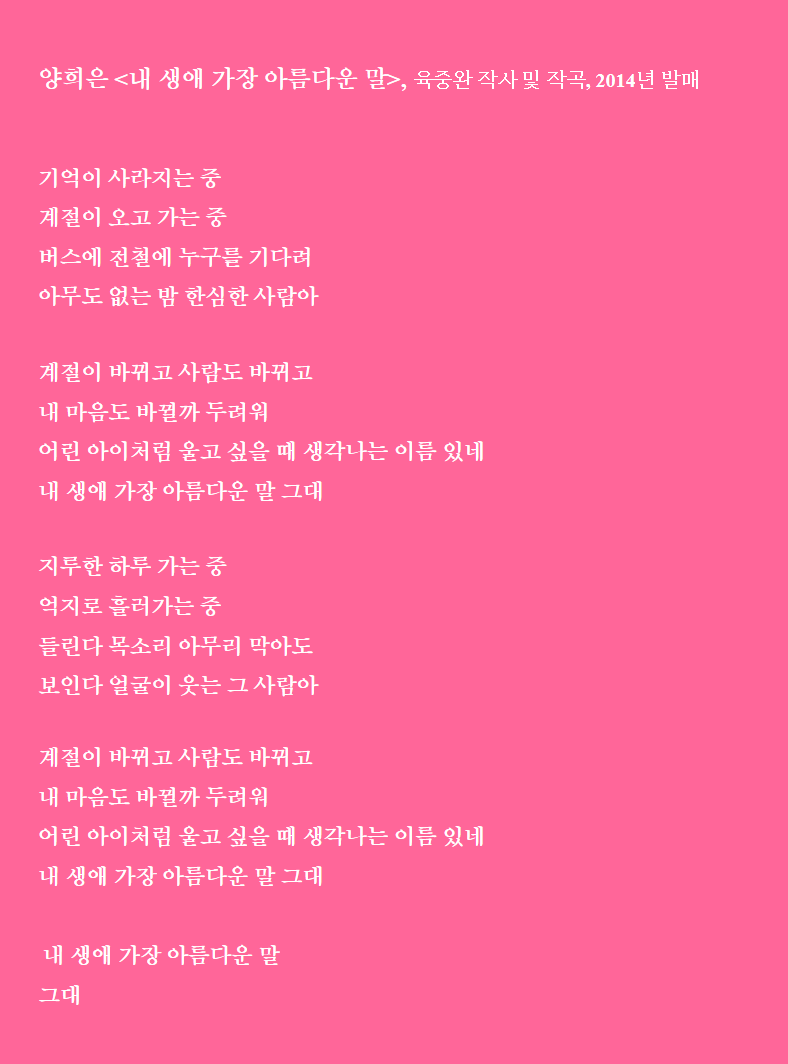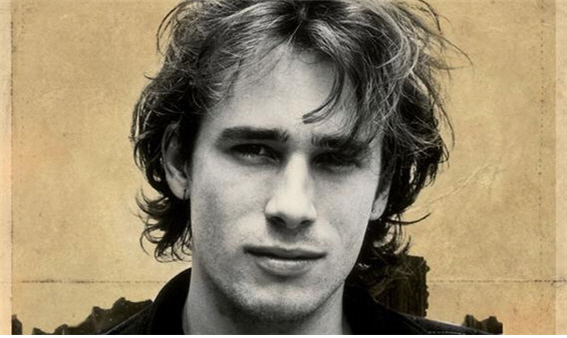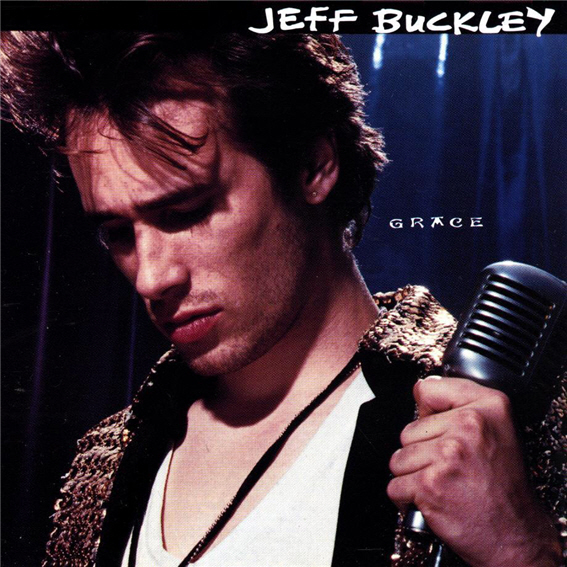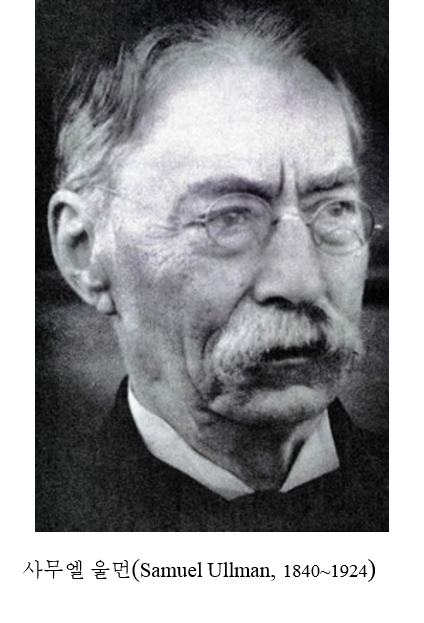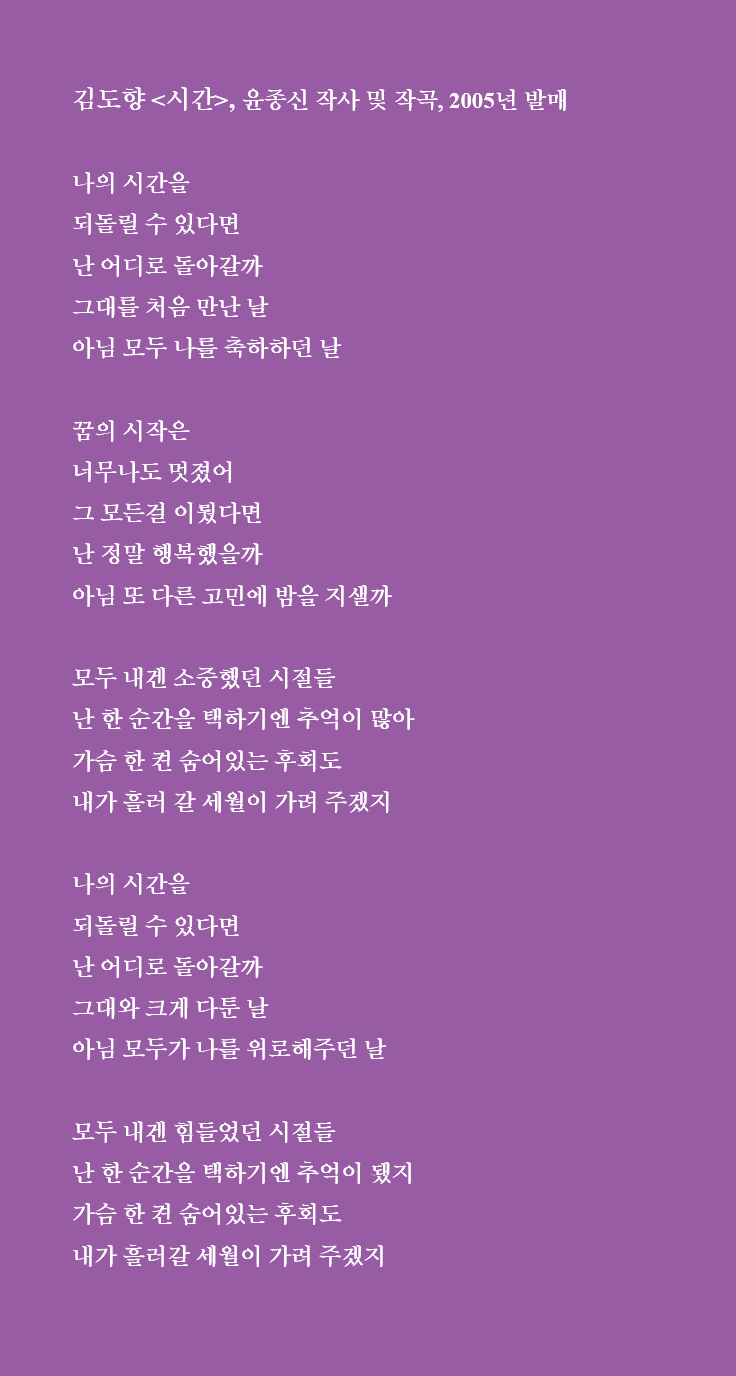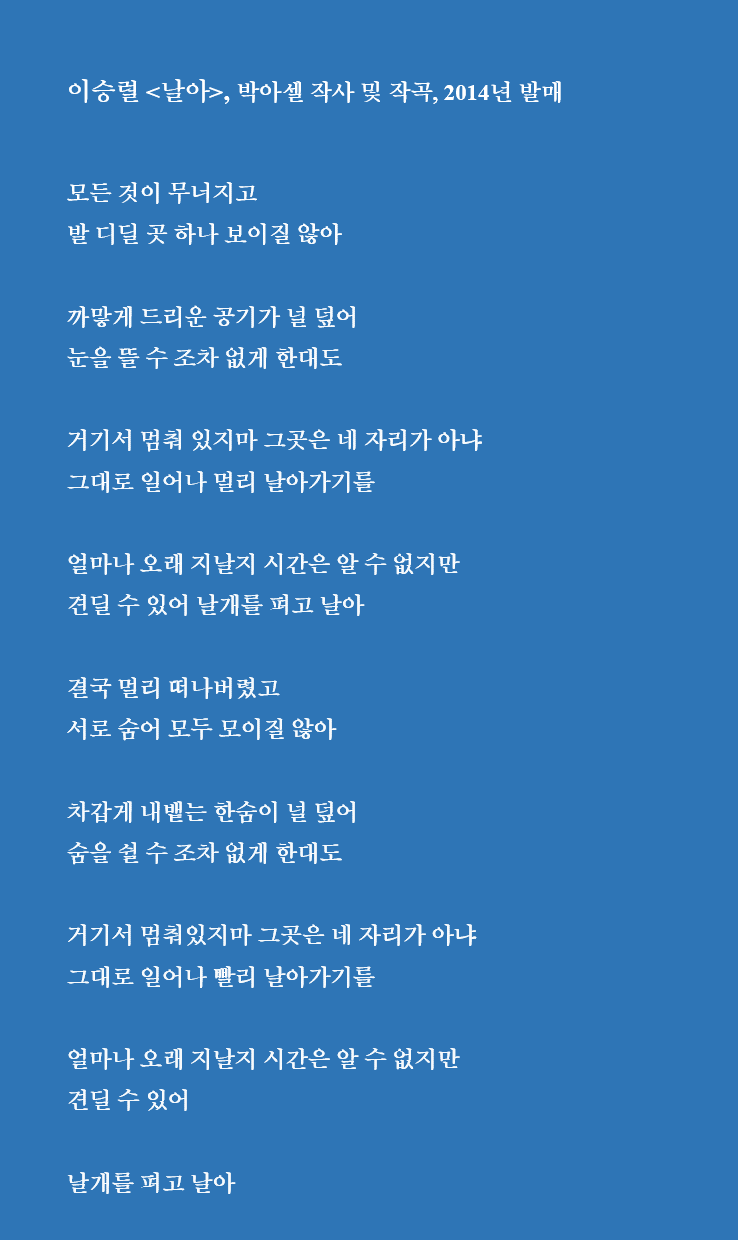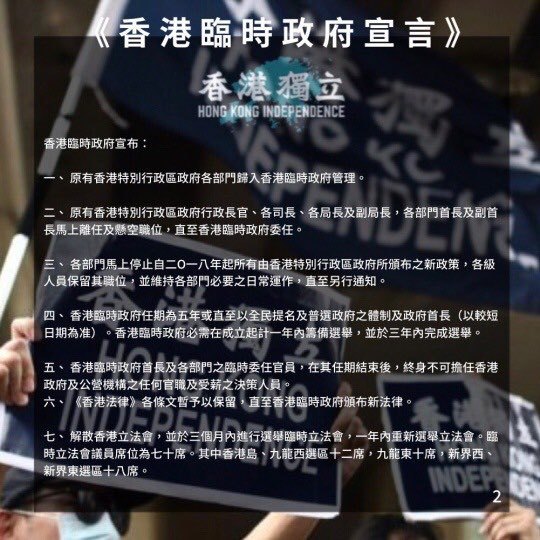플라톤의 <국가> 강해 ㉟
1-2 수호자의 교육(376c-412b)
1-2-1 시가 교육(376e-403c)
1-2-1-1 무엇을 말해야 할 것인가 – 시인들이 지켜야할 규범(계속)
[380d]
* 소크라테스는 “신은 선하다. 신은 나쁜 일의 원인일 수 없으며 오직 좋은 것들의 원인이다”라는 사실을 시인들이 시가를 지음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첫 번째 규범이자 법률로서 제시한 후, 두 번째 규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이를 위해 소크라테스는 아데이만토스에게 우선 1) 신이 마법사γόης여서 마음먹은 대로 그때그때 다른 형태ἰδέα로 나타날 수 있는φαντάζεσθαι 존재인지 아니면 2) 우리 눈을 속여서 자기에 대해 그런 것으로 여기도록 만드는 존재인지 또 아니면 신은 단순하며ἁπλόος 자신의 본모습에서 벗어나는 일ἐκβαίνειν이 무엇보다도 적은 존재인지를 묻는다.
———–
* 이제 첫 번째 규범에 이어 두 번째 규범이 논의된다. 논의는 여기서부터 제2권 끝(383c)까지 위의 1)(380d-381e)과 2)(381e-382e)의 순서로 다루어진 후 마무리 부분(382e-383c)에서 둘째 규범이 정리된 상태로 제시된다.
[380d-381b]
* 1)(380d-381e)은 ‘신은 여러 가지 형태를 갖지도 변화하지도 않는다’는 소크라테스의 주장을 담고 있다. 논변은 다른 것에 의한 변화ὑπ᾽ ἄλλου μεθίστασθαι(380d-381b)와 자신에 의한 변화ὑφ᾽ ἑαυτοῦ μεθίστασθαι(381b-381e)로 구분해서 진행된다.
* 우선 ‘신은 외부에 의해 변화를 겪는가?’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아래와 같은 논변을 제시한다.
1) 본모습에서 벗어난다는 것ἐκβαίνειν은 자신 혹은 다른 것에 의해 변화한다는 것이다.(380d)
2) 그런데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것τὰ ἄριστα ἔχοντα은 다른 것에 의해 변화ἀλλοιοῦν 또는 운동κινεῖν을 가장 덜 겪는다. 가장 건강한ὑγιέστατον 몸이 음식이나 힘든 일에 영향을 가장 덜 받고 가장 강한ἰσχυρότατον 식물들이 태양열이나 바람 등에 영향을 가장 덜 받는 이치와 같다.(380e)
3) 혼도 가장 용감하고ἀνδρειοτάτην 가장 분별 있는φρονιμωτάτην 경우, 외부에 의한 영향이나 변화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적다. 집과 옷, 가구 등 잘 만들어진 것들과 좋은 상태에 있는 것들도 시간이나 다른 영향들로 인한 변화ἀλλοιοῦν를 가장 적게 받는다.(381a)
4) 이처럼 자연적으로건 또는 기술에 의해서건ἢ φύσει ἢ τέχνῃ 또는 이 두 가지에 의해서건 훌륭한 상태에 있는 것τὸ καλῶς ἔχον은 다른 것에 의한 변화μεταβολή를 가장 적게 받는다.(381b)
5) 그런데 신과 신에 속하는 것들τὰ τοῦ θεοῦ은 모든 면에서 가장 좋은ἄριστα 존재이다.(381b)
6) 그러므로 신은 다른 것에 의해 여러 가지 형태μορφή를 취할 가능성이 가장 적다.(381b)
—————–
* 신과 관련한 두 번째 규범을 구성하는 첫째 원리는 ‘신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소크라테스는 변화를 외적 요인에 따른 변화와 내적인 요인에 따른 변화로 구분하고, 그 어느 경우이든 왜 신에게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지를 밝힌다. 여기서 소크라테스는 변화를 의미하는 말로 μεθίστασθαι, ἀλλοιοῦν, μεταβολή 등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의 의미상 차이는 별로 없다. 다만 그러한 말 가운데에 ‘운동’의 의미를 갖는κινεῖν(kinein)이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어서(380e) 혹자는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신이 불변자인 동시에 부동자인가라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말에도 ‘마음을 움직이다’라는 표현이 마음의 변화를 나타내듯이 그리스어 κινεῖν(kinein)은 ‘운동’의 의미와 함께 ‘변화’의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 사실 신은 말도 하고 행동도 하므로(383a) 애당초 부동자일 수는 없다. 소크라테스가 여기서 ‘신은 변화하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그 불변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신이 가지고 있는 형태ἰδέα, μορφή와 언행의 일관성은 물론 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훌륭한 상태로서의 내적 속성의 불변을 뜻한다. 특히 여러 번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는 형태와 언행의 일관성은 온갖 모습으로 변덕을 일삼는 전통 신들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비판과 부정을 담고 있다. 그리고 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훌륭한 상태가 외적인 영향을 가장 덜 받는다는 말은, 신이 그 상태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서 신적 상태의 훌륭함과 더불어 능력의 탁월성도 함께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외부의 영향으로 훌륭한 상태가 변화한다는 것은 이미 그것이 갖는 나약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은 건강한 몸과 강한 식물이 그러하듯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영향 하에도 흔들림 없이 자신을 지켜내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 신적 불변성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언급은 신이야말로 장자 나라를 통치할 수호자들이 닮아야할 대상임을 보여줌과 동시에 왜 새로운 신관이 정의로운 나라에서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수호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서로 시기질투하며 갈라져 싸우거나 마음이 흔들리거나 변덕을 부리거나 함이 없이 늘 하나같은 모습을 유지해야 하며 그것을 위협하는 어떠한 외부의 영향들로부터도 전혀 흔들림 없이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강한 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소크라테스는 신이 갖는 가장 훌륭한 상태가 변화를 겪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몸과 식물 그리고 혼 등 자연적 산물만이 아니라 집과 옷, 가구 등 인공적 산물까지도 함께 끌어들여 ‘자연적으로건 기술에 의해서건’ἢ φύσει ἢ τέχνῃ ‘가장 훌륭한 상태에 있는 것’은 다른 것에 의한 변화를 가장 적게 받는다고 말한다. 이것은 신이 자연적 본성의 훌륭함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능력 또한 탁월함을 보여준다. 실제로 플라톤은 <티마이오스>에서 데미우르고스(demiourgos라는 말 자체가 ‘장인’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를 우주를 선하고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 내는 신으로 내세워 장인적 기술에 있어 지고지상의 본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 데미우르고스의 신적 우주 제작 기술의 원리를 나라의 통치자들이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본받아야 할 통치 기술의 근본 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도 신은 통치자들이 닮아야 할 대상인 것이다.
[381b-381e]
* 이어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에 의한 변화ὑφ᾽ ἑαυτοῦ μεθίστασθαι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은 논변을 제시한다.
1) 그렇다면 신은 스스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바꾸는가? 바뀐다면 그 변화는 더 낫고βέλτιόν 아름다운κάλλιον 쪽인가 자기보다 더 못하고χεῖρον 추한αἴσχιον 쪽인가?(381b)
2) 신은 아름다움과 뛰어남에 있어κάλλους ἢ ἀρετῆς 분명히 부족함이 없다οὐ ἐνδεᾶ.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나쁜χεῖρον 쪽으로 변화하는 것이다.(381c)
3) 신이건 사람이건 자발적으로ἑκών 자신을 더 나쁘게 만들지 않는다.(381c)
4) 그러므로 신이 자신을 바꾸려ἀλλοιοῦν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ἀδύνατον 일이다.(381c)
5) 신들은 각자ἕκαστος 가능한 한 최대한 아름답고 좋은κάλλιστος καὶ ἄριστος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단순하게ἁπλῶς 자신의 모습μορφῇ으로 남아 있을 것 같다.(381c)
* 소크라테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아데이만토스는 그것이 전적으로 필연적인ἅπασα ἀνάγκη 것 같다고 대답한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시인들이 말하는 내용, 즉 신들이 온갖 모습을 하고 다닌다거나 신이 변장을 한다ἀλλοιόω고 말하는 것들은 모두 거짓말이며(381d) 그에 따라 시인들로 하여금 그러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하고 그것을 들은 어머니들이 어떤 신들은 별의별 이방인ξένος의 모습을 하고 밤중에 돌아다닌다는 식으로 나쁘게 말해 어린아이들을 겁에 질리게δειλοτέρους 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381e)
—————
1) ‘신은 다른 것들에 의해서 변화할 수 없다’는 앞서의 논변에 이어 ‘신은 결코 자신에 의해서도 변화할 수 없다’는 위와 같은 논변에는 시종일관 신이 아름다움과 뛰어남에 있어κάλλους ἢ ἀρετῆς 그 어떤 결여나 부족함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언제나 단순하고 늘 자신의 모습으로 남아있다는 근본 전제가 깔려 있다. 자기 변화를 낳는 유일한 동기는 결핍인데 신에게 그러한 결핍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주장에는 앞서 살핀 신의 기술적 탁월성ἀρετῆ뿐만이 아니라 신적인 자기 충족성 내지 자기 완전성이 포함되어 있다. 논의를 마무리하며 신을 표현하는 말 즉 ‘늘 단순하게 자신의 모습으로 남아있다’μένει ἀεὶ ἁπλῶς ἐν τῇ αὑτοῦ μορφῇ는 말에서 ‘단순하다’ἁπλόος(haploos)라는 그리스말에는 simple의 의미만이 아니라 타자와 단절된 ‘절대’absolute의 의미는 물론 ‘타자와 어떤 섞임도 없음’not compound, ‘단일함’single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게다가 ‘늘 자신의 모습으로 남아있다’μένει ἀεὶ ἐν τῇ αὑτοῦ μορφῇ는 말은 신적 불변성과 자체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렇듯 소크라테스에게 신은 처음부터 순수하고 완전한 존재이며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 자체적인 존재이다. 신을 표현하는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언급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신관이 유일신적인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왜냐하면 완전함이란 부족함이 없는 충만함인데 충만함이 여럿 있다는 것은 이미 그것이 충만치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분명 여기서 신을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도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위에서 인용한 마무리 부분의 문장 또한 ‘신들 각자’로 시작되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의문에도 불구하고 일단 플라톤의 신관이 유일신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단언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 완전한 것들로서 신들 각각의 완전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2) 우리는 그 해답의 일단을 앞에서 살핀 신적 능력이 갖는 기술적 특성에서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여기서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신의 가장 훌륭한 상태, 결함이 없는 상태 그리고 그것을 보전하는 힘은 우리로 하여금 제1권에서 소크라테스가 언급한 ‘엄밀한 의미에서의 기술’을 떠올리게 한다. 그곳에서 엄밀한 의미의 기술은 그 자체로 완전하여 그것에 대한 능가pleoneksia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어떠한 결함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엄밀한 의미의 기술자는 어떠한 실수도 저지르지 않으며 게다가 그 기술은 오로지 대상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본질적으로 선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른바 기술들은 각기 자신의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기능에 있어 완전하고 결함이 없다. 그러니까 완전한 기술들이 여럿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신들의 영역에서도 신들은 각기 고유한 역할들이 있고 그 고유한 역할에 있어 가장 훌륭하고 뛰어나며 나아가 그 뛰어난 상태를 늘 하나같이 보전할 수 있는 능력을 제각기 갖추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곳에서 소크라테스가 언급한 신 즉 완전하고 결함이 없으면서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신 역시 반드시 하나일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
3) 그런데 그 신들 각자가 완전하면서도 그 자체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신들이 자체성 내지 자기동일성을 하나같이 보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곳의 신들은 플라톤의 이데아와도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곳에서의 신들은 모습을 갖고 있고 말과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초월적 이데아와 단순 비교될 수는 없다. 그러나 신이 신화 상의 실재라는 점을 고려하면 우주에서 자체적 존재로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뛰어난 존재인 신들을 최소한 그 자체성과 자기동일성의 측면에서 이데아에 견주어 생각하는 것도 크게 이상할 게 없다. 플라톤의 신학과 철학의 내적 통일성의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실제로 플라톤은 <티마이오스>에서 본paradeigma을 보고 우주를 가장 선하게 만든 데미우르고스를 최상의 신으로 그리고 있음은 물론 그가 직접 만든 항성들 즉 영원한 자기 운동자들 역시 모두 신들로 그리고 있다. 그래서 많은 플라톤 연구가들은 그 데미우르고스를 그와 같은 우주의 영원한 자기 운동성과 자체성의 근원으로 해석하고 그것이 갖는 선성과 존재성에 기초하여 그를 혹은 그가 바라본 본을 <국가>에서 언급되는 ‘선의 이데아’와 직접 연관 지어 고찰하기도 한다. 우리는 앞에서 이곳에서의 신들이 통치자들이 본받아야 할 신들로 언급한 바가 있는데, 우주 제작자 데미우르고스를 정의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통치자가 본받아야 할 최고의 원상으로 유추하는 것 역시 크게 이상할 것이 없다. 이미 플라톤은 <티마이오스>에서 우주에 관한 이야기가 나라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381e-382e]
* 위와 같이 1) ‘신은 온갖 모습으로 변화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된 후 2) 신들은 스스로 바뀌지 않는μὴ μεταβάλλειν 존재이지만 우리에게 자신들이 별의별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게끔 우리를 기만하고 홀리는지ἐξαπατῶντες καὶ γοητεύοντες 즉 ’신은 거짓말을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다.(381e)
* 소크라테스는 아데이만토스에게 신이 말로나 행동으로λόγῳ ἢ ἔργῳ 우리한테 환영φάντασμα을 내세워 속이는지ψεύδεσθαι를 묻고 그가 그에 대해 모르겠다고 답을 하자 만일에 ‘진짜 거짓’τό ὡς ἀληθῶς ψεῦδος이란 말이 허용된다면 그 진짜 거짓은 모든 신과 사람이 미워한다고 말하고 그 말의 의미를 묻는 아데이만토스에게 ‘그 누구도 자신의 가장 주된 부분에 있어서τῷ κυριωτάτῳ 가장 주된 문제들과 관련해서περὶ τὰ κυριώτατα 자발적으로ἑκὼν 속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고 거기에 거짓을 지니고 있는 걸 제일 두려워한다’고 말한다.(382a)
* 그래도 아데이만토스가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소크라테스는 그 말을 아래와 같이 풀어서 설명한다. 즉 사람들은 ‘있는 것들’τὰ ὄντα과 관련해서 혼에서 속는 것ψεύδεσθαί을, 그리고 그렇게 ‘거짓에 빠져 무지한 것’ἐψεῦσθαι καὶ ἀμαθῆ εἶναι을, 그래서 혼에 거짓을 들여와 갖게 된 것을 누구라도 꺼릴 것이고πάντες ἥκιστα ἂν δέξαιντο 그런 경우의ἐν τῷ τοιούτῳ 거짓을 가장 싫어한다는 것이다.(382a)
* 그런 연후 앞에서 말한 진짜 거짓을 ‘거짓에 빠진 자의 혼 안에 있는 무지’ἡ ἐν τῇ ψυχῇ ἄγνοια ἡ τοῦ ἐψευσμένου로 칭하고καλοῖτο, 말에서의 거짓τό ἐν τοῖς λόγοις ψεῦδος, 즉 거짓말과 대비시킨다. 거짓말은 혼이 처한 그런 상태παθήματος의 일종의 모방물μίμημά이자 나중에 생긴 영상εἴδωλον이어서 완전히 순수한 거짓이 못 된다οὐ πάνυ ἄκρατον ψεῦδος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진짜 거짓’은 신들과 인간들 모두의 미움을 산다’고 앞서의 주장을 재차 확인한다.(382b)
*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진짜 거짓과 거짓말을 위와 같이 대비시킨 후, 화제를 바꾸어 ‘말에서의 거짓’ἐν τοῖς λόγοις ψεῦδος 즉 거짓말이 미움을 사지 않을 정도로 유용할χρήσιμον 때는 언제이며 누구에게 유용한지를 묻는다. 이를테면 적πολέμιος들에 대한 거짓말, 광기μανία나 어떤 어리석음ἄνοια으로 인해서 나쁜 짓을 저지르려는 친구φίλος들에 대한 거짓말, 그리고 옛날παλαιός 일들을 몰라 허구τὸ ψεῦδος를 최대한 진실ἀληθής 같도록 만드는 설화 이야기μυθολογία 속 거짓말들이 그렇다는 것이다.(382c)
* 소크라테스는 위와 같이 거짓말이 가져다주는 유익한 경우들을 언급한 후, 도대체 그 중 어느 점에서 거짓이 신에게 유용한지 즉 거짓말을 해서 신에게 유용한 경우가 있는지를 묻는다.(382d) 그런 연후 소크라테스는 신은 옛날에 관해 몰라 시인처럼 허구를 지을 일도, 적을 두려워할 일도, 친근한 이들의 어리석음과 광기에 빠질 일도 없으므로 ‘신이 누구를 위해 거짓을 말할 일은 전혀 없다’οὐκ ἔστιν οὗ ἕνεκα ἂν θεὸς ψεύδοιτο고 말을 한다. 요컨대 영전인δαιμόνιόν 존재와 신성한θεῖον 존재는 어느 모로 거짓됨이 없다는 것이다.(382e)
——————-
* ‘자신의 가장 주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주된 문제들과 관련해서’라는 표현에서 ‘가장 주된’의 원어는 ‘힘을 가진, 권위 있는’(having power or authority over)의 뜻을 가진 kyrios의 최상급형인 kyriōtatos를 번역한 말이다. 즉 이 말은 ‘가장 힘이 있고 가장 권위 있는 것 최고의 관심사와 관련해서’의 뜻이다. 다시 말해 이 문맥은 ‘누구든 자신이 가장 신경을 쓰는 최고 관심사와 관련해서 속임을 당하는 것보다 더 싫고 두려운 것은 없을 것이고 그런 만큼 그런 일에 자발적으로 속으려 하는 일은 더욱 없을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플라톤은 나중에(505d-e) 누구든 ‘좋은 것들’ἀγαθὰ 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대로 정말 좋은 것들을 추구하고 그와 관련한 억견δόξα은 경멸한다고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에 기초해서 여기서 플라톤이 말하는 주된 것을 구체적으로 ‘좋은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 382a에서 말하는 ‘있는 것들’τὰ ὄντα(ta onta)은 역본에 따라 ‘사실들’, ‘사실로 그런 것들’(505d)로 옮겨지기도 한다. 사실 원어 ta onta는 우리가 보통 존재 또는 실재로 옮기는 ’to on’의 복수형이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있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실재하는 것들로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 그냥 ‘주어진 현실 내지 현존하는 것들’ 정도를 나타내는 말일 수도 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의 경우 실재는 차치하고 일상의 현실사와 관련해서 쉽게 거짓에 빠지거나 속임수를 당하기 일쑤이다. 그러나 참주 같은 자들의 경우,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이기적이고 일상의 현실사들 역시 영악하게 잘 알고 있어서 오히려 그러한 현실 정보들을 이용하여 남들을 나쁜 목적으로 속이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참주 또한 모종의 지식이 있는 자이다. 그러나 참주가 알고 있는 것은 단순한 일상사와 관련한 현실 정보들일 뿐 결코 실재와 관련한 참된 앎일 수는 없다. 플라톤에게 앎은 도덕과 분리되지 않는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러한 참주를 지자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 가운데 가장 무지한 자로 부른다. 플라톤에게 ‘무지’amathia, anoia는 일상사 내지 주어진 현실사들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실들을 인지하고 평가하는 능력으로서 혼이 내적으로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플라톤에게 무지는 혼이 내적으로 불균형 상태ametria에 빠져있을 때 생기는 것이다. 플라톤은 <소피스트>(228c-d)에서 무지란 혼의 불균형 상태로서 혼의 질병이자 악덕, ‘분별로부터 비켜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국가> 제6권(480d)에서도 사고dianoia는 혼이 균형상태emmetria에 있을 때 각각의 실재의 이데아로 쉽게 인도된다고 말을 한다. 즉 철학자는 현존하는 사실들과 문제 상황들을 균형 잡힌 혼의 총체적인 안목을 통해 그 진실을 포착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지만, 참주는 혼이 불균형 상태에 있으므로 그러한 일상의 사실들과 상황들을 순전히 이기적 관점에서 왜곡하고 그 분별에서 벗어나 있어서 결국 부정의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소크라테스가 ‘진짜 거짓’to hόs alethōs pseudos이란 말을 사용하면서 ‘그 말이 허용된다면’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다. 그것은 원어에서 참을 나타내는 alethēs란 말과 거짓을 나타내는 pseudos란 말이 형용모순처럼 함께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 ‘속는 것’psedesthai(현재 부정사)은 ‘거짓pseudos에 빠지는 것’으로 옮길 수 있고 ’거짓에 빠져‘epseudesthai(완료 부정사)는 ‘속아 넘어가’로 옮길 수도 있다. ‘들여와 갖게 된 것’ἐνταῦθα ἔχειν τε καὶ κεκτῆσθαι을 직역하면 ‘안에 가져서 획득한 것’ 즉 속은 다음 그 속은 상태를 지속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적들에 대한 거짓말, 광기나 어떤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나쁜 짓을 저지르려는 친구들에 대한 거짓말‘은 제1권(331e-332b) 폴레마르코스와 나눈 대화를 환기시키는 말이고 ’옛날 일들을 몰라 허구를 최대한 진실 같도록 만드는 설화 이야기‘는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를 비롯한 이후 설화 작가 내지 시인들을 환기시키는 말이다. 광기μανία는 극단적이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무지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한다.
————–
1) 신에 관한 둘째 규범으로서 ‘신은 변화하지 않는다’, ‘신은 부족함이 없다’, ‘신은 언제나 단순하게 자신의 모습으로 남아있다’ 등에 관한 내용들이 논의된 후 이제 ‘신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다. 소크라테스는 앞에서 ‘신이 변화해야 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것을 내세워 ‘신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당화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여기에서도 소크라테스는 똑같은 방식 즉 ‘신은 인간들처럼 거짓말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세워 ‘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당화한다.
2)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그것을 위해 흥미롭게도 ‘진짜 거짓’과 그것의 모방물로서 ‘말에서의 거짓(거짓말)’이라는 개념을 끌어들인다. 그런 연후, 신은 진짜 거짓은 물론이려니와 말에서의 거짓도 결코 행하지 않을뿐더러, 흔히들 인간들이 행하는 유익한 거짓말조차 전혀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밝히는 방식으로 ‘신은 일체의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의 논의를 이해하려면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진짜 거짓과 말에서의 거짓, 그리고 유익한 거짓말의 의미가 각각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
3) 우선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진짜 거짓’은 ‘혼 안에 있는 무지’, ‘혼의 무지 상태’이다. 혼의 무지 상태는 이미 혼에 거짓이 들어와 거짓에 빠져 있는 자의 상태이다. 그리고 말에서의 거짓 즉 거짓말은 이 혼 안에 있는 무지로서 진짜 거짓의 모방물이자 나중에 생긴 영상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말은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온 것이라고 얘기하듯이, 거짓말은 혼에서의 무지가 선행 원인이 되어 그것이 말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이다. 즉 그것은 진짜 거짓이라는 원상의 그림자이자 모방물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원상인 진짜 거짓의 모방물인 한에서 완전히 순전한 거짓이 못 된다. 그러므로 거짓말은 완전히 순전한 거짓의 모방물인 한, 모방의 정도에 따라 진짜 거짓에 아주 가까운 거짓말에서부터 비교적 그것보다는 좀 떨어진 그것과 덜 비슷한 거짓말 등 여러 종류의 거짓말들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앞에서도 나왔듯이 자신이 속아서 혼의 무지 상태에 있음에도 자신이 속은 줄도 모르고 마치 진실인 양 떠들어 대는 경우의 거짓말이 있을 수 있다. 오늘날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듯이 이른바 가짜 뉴스를 진실로 알고 떠들어 대는 사람들의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그리고 같은 거짓말이기는 하지만 이와 순전함의 정도가 다른 거짓말도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자신은 사실들을 알고 있으면서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남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도 거짓말을 행하는 자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한, 그것은 이미 그의 혼 안에 거짓이 있다는 것으로서 그 역시 혼의 무지 상태에서 거짓말을 한 경우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알고 있다는 사실들 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실재에 관한 앎이 아니라 일상사 내지 현실 정보들로서 장차 혼의 무지에 의해 왜곡되어 나쁜 목적에 쓰일 재료이자 도구들일 뿐이다. 특히 참주들은 그러한 거짓말을 하는 자들 가운데 정보량에 있어서나 그것을 나쁘게 활용함에 있어서나 가장 월등한 자들이고 그만큼 가장 나쁜 자들이다. 그러나 참주는 여전히 그 누구보다도 무지한 자일뿐이다. 왜냐하면 참주는 불균형한 혼을 가져 분별에서 벗어나 있어 그러한 현실 정보들의 내적 관계와 본질들 즉 그것들이 삶과 현실에서 어떻게 총체적으로 서로 관계 맺고 있는가에 대한 진실에 무지할뿐더러, 그 진실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모두가 행복하고 선한 삶을 이루어낼 낼 것인가에 대한 앎 또한 전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자기가 속은 줄도 모르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보다 참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훨씬 더 ‘진짜 거짓’에 가까운 거짓말을 하는 자이다. 왜냐하면 전자는 일부 특수 사안에 속아서 나온 거짓말이지만 참주의 경우는 현실의 모든 사안들과 연관된 근본적이고도 총체적이고도 원리적인 앎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거짓말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진짜 거짓인 혼의 무지에서 나온 모방물로서 거짓말들은 인간들 각자의 가장 주된 부분, 주된 문제 영역에서 결코 유익함을 가져다주지 못함은 물론 참주의 경우가 보여주듯 유익은커녕 인간 삶의 전체 국면에서 전적인 불행을 안겨다 주는 것이다.
4)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논의를 마친 후 거짓말이 때로는 유익한 경우가 있다고 말을 한다.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언급은 앞에서 우리가 살핀 내용들과 상충한다는 점에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든다. 그래서 혹자는 앞에서 소크라테스가 거짓말을 완전히 순전한 거짓이 아니라고 말했다는 것에 근거하여 어차피 순전하지 않으므로 때로는 유익함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 언급되는 유익한 거짓말은 자기의 이익이 아닌 친구나 대상의 이익을 위한 선한 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다가 나중에 철학 통치자들도 행하는 거짓말이라는 점에서, 앞에서 말한 진짜 거짓의 모방물로서 거짓말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거짓말이다. 만약 유익한 거짓말을 그러한 거짓말의 하나로 포함한다면 그러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 특히 철학 통치자가 진짜 거짓 즉 혼에서의 무지 상태에 빠져있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혼에서의 무지 상태 즉 진짜 거짓의 모방물로서 거짓말 속에는 가장 유익하지 않은 상태에서부터 덜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정도 차이만을 갖는 나쁨이 있을 뿐 어떠한 유익함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적들에 대한 거짓말, 광기나 어떤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나쁜 짓을 저지르려는 친구들에 대한 거짓말, 그리고 옛날 일들을 몰라 허구를 최대한 진실처럼 만드는 설화 이야기 속 거짓말들은 나쁨이 아닌 좋음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도 유익한 거짓말은 혼의 무지 상태로서 진짜 거짓의 모방물이 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보면 결국 거짓말은 크게 나누어 혼의 무지상태에서 나온 거짓말과 혼이 속지 않는 상태 즉 앎의 상태에서 나온 거짓말로 나누어지고 앞서 살폈듯이 전자에는 속은 줄도 모르고 진실인 양 떠드는 거짓말과 사실을 알면서 나쁜 목적을 위해 남을 속이는 거짓말 등이 속해 있을 것이고 후자에는 이른바 유익한 거짓말들이 속해 있다 할 것이다.
5) 그런데 우리가 유념할 점은 거짓말과 관련한 이곳 내용의 초점이 소크라테스가 말하고 있는 거짓말의 의미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진짜 거짓에서 나온 거짓말이든 유익한 거짓말이든 그 어떤 경우든 신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맞추어져 있다는 점이다. 특히 유익한 거짓말에 관한 이야기는 별다른 설명 없이 앞에서의 거짓말에 바로 이어서 나타나 그 의미의 일관성과 관련하여 우리로 하여금 당혹스러움을 안겨주지만, 전후 문맥을 잘 들여다보면 그것은 다만 인간과 달리 신들의 경우에는 애초부터 유익한 거짓말을 할 이유조차 존재할 수 없음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신들이 거짓과는 전혀 무관한 완전무결한 선성을 가진 존재임을 더욱 부각하려는 의도에서 별도의 화제로 삽입된 것이다.
6) 한편 위와 같은 해석과 달리 위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 1) 신이든 사람이든 가장 주된 것 즉 ‘좋은 것’에 관해서는 자발적으로 속으려 하지 않는다. 2) 좋은 것과 관련한 거짓을 갖고서(속고서) 속은 줄도 모르는 상태가 혼의 무지로서 진짜 거짓이다. 3) 말을 통한 거짓 즉 거짓말은 자신은 속지 않은 상태에서 남을 속이는 것이므로 진짜 거짓에 비해 아주 완전한 거짓은 아니다. 4) 그러므로 거짓말에는 적에 대해 하는 거짓말, 정상이 아닌 친구에게 하는 거짓말 등의 경우처럼 유익한 거짓말도 있다.
7)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는 말을 통한 거짓이 진짜 거짓의 모방물이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이 잘 설명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들이 말하는 거짓말에 존재하는 속성 ‘자신은 속지 않은 상태’는 그것이 모방하고 있는 진짜 거짓에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즉 그것은 진짜 거짓의 모방물이 아닌 것이다. 게다가 그러한 해석은 나중 철학 통치자들이 행하는 유익한 거짓말의 경우를 설명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유익한 거짓말이 진짜 거짓인 혼의 무지의 모방물이라면 철학 통치자들이 행하는 유익한 거짓말의 경우까지 혼의 무지 상태에서 나온 것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해석은 시민을 속이는 참주와 그것에 속은 줄도 모르는 대중을 비교할 때 시민이 혼의 무지의 원상이 되고 참주가 그 모방물이자 영상이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왜냐하면 참주는 자기는 속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을 속이는 자 즉 진짜 거짓에 빠진 자가 아닌 반면에 오히려 자기가 속은 줄도 모르는 시민이 진짜 거짓에 빠진 자가 되기 때문이다. 즉 진짜 거짓은 시민의 상태가 되고 참주는 그 시민을 모방한 자로서 혼에 있어 시민 보다 덜 무지 상태에 빠진 자가 된다. 그러나 플라톤에게 좋은 것과 관련해 가장 무지한 한 자 즉 혼의 무지가 누구보다도 극상의 상태에 있는 자는 다름 아닌 참주이다. 요컨대 이러한 해석은 참주의 거짓말이 최악의 진짜 거짓말이라는 것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
[382e-383c]
* 위와 같은 논의가 이루어진 후 소크라테스는 그 논변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둘째 규범δεύτερον τύπον을 제시한다. 즉 ‘신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ἔν τε ἔργῳ καὶ λόγῳ 전적으로 단순하고ἁπλόος 진실ἀληθὲς 하거니와, 스스로 바뀌지도 않으며 다른 사람들을 속이지도 아니한다’ 신은 인간에게 환영φαντασία이나 말로도 꿈속에서건 생시건 자신을 바꾸거나 남을 속이는 어떤 징조σημεῖον도 보내지 않으며(382e) 말에서든 행동에서든 결코 우리를 오도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383a)
* 그러므로 신들에 관해 이야기를 하거나 시를 지을 때 반드시 이 규범을 지켜야 하며, 비록 우리가 호메로스의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은 칭송하지만, 만일 이 규범에 어긋난 말을 할 경우에는 칭송하지 않을 것이며οὐκ ἐπαινεσόμεθα(383b) 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 대해 화를 낼 것이고χαλεπανοῦμεν 그에게 합창 가무단χορός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소크라테스는 말한다. 그리고 수호자들οἱ φύλακες을 최대한 신들을 경외하는θεοσεβής 인간이자 거룩한 이들θεῖοι로 키우려면 교사διδάσκαλος들로 하여금 어린이 교육 과정에서ἐπὶ παιδείᾳ τῶν νέων 이 규범에 어긋난 이야기를 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οὐδὲ ἐάσομεν고 말한다. 그러자 아데이만토스는 그 규범에 전적으로παντάπασιν 찬동하며συγχωρειν 그것 또한 법률νόμος로 삼았으면 한다고 대답한다.(383c)
——————-
*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전통 신화들과 시인들의 작품은 정기적으로 연극의 형태로 공연되면서 아테네인들의 삶에 대한 의식과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 연극은 일종의 시민 교육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국가는 나랏돈은 물론 부유층들의 기부금을 받아 그러한 공연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합창가무단도 그러한 지원의 일환으로 공연이 이루어질 때마다 제공되고 있었다.
* 정의로운 나라의 시가 교육에서 채택될 규범에는 전통적인 신화와 상충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음에도 소크라테스는 신과 관련한 규범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호메로스의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여전히 찬송하고 있다는 말을 덧붙인다. 이는 앞서도 살폈듯이 플라톤의 시가 교육론 내지 종교론은 기본적으로 기존 체제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비판적인 분별의 방식으로, 일부는 계승하고 일부는 부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 이로써 ‘신은 선하며 나쁜 것들의 원인이 아니다’, ‘신은 변하지 않으며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규범은 시가 교육과 시가 창작을 함에 있어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자 법률로 확립되기에 이른다. 그러한 규범들은 앞서 살폈듯이 단순히 시가 교육상의 규범을 넘어서 정의로운 나라의 근간이 되는 새로운 세계관 내지 가치관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 규범들이 담고 있는 신에 대한 관념들은 전통적인 신들과는 차별되는 플라톤 고유의 신관 내지 종교관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앞에서도 살폈듯이 이곳에서 언급된 신에 대한 새로운 관념들과 장차 본격적으로 언급될 이데아에 대한 관념이 자기 완전성과 자체성의 측면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 역시 플라톤의 신학과 철학의 내적 통일성과 일관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플라톤의 신관 내지 종교관을 사상사적 관점에서 크게 요약하자면 그것 역시 플라톤 철학의 연장선 위에서 i) 기원전 7-8세기 형성되고 전승된 신화적 세계관과 ii) 기원전 6세기 이오니아로부터 과학적 사유가 유입된 이래 당대 아테네 사상계에서 형성된 철학적 세계관 즉 엘레아적 일원론과 다원론적 세계관, 그리고 iii) 피타고라스 이후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며 자리 잡은 영혼불멸 사상 등을 그야말로 총체적인 관점에서 종합하고 통일한 것이다. 이른바 개인의 혼 안에서 그리고 사회적 삶 속에서 <서로 다른 ‘여럿’들의 조화와 공존의 길>을 모색하려 했던 플라톤 평생의 꿈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 이것으로 이제 제2권은 마무리되고 이어서 시가 교육에 있어 영웅들과 관련한 논의들이 다루어지고 그것을 본받아 인간들이 지녀야 할 덕목들이 함께 제시된다.
<국가> 제2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