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소설] <그대에게 가는 먼 길> 1부 – 23회|7. 철학과 대학원 (4) [이종철의 에세이 철학]
23회
-
철학과 대학원 (4)
그가 박사 논문을 쓴 다음에 그를 둘러싸고 흉흉한 소문이 돌았다. 그가 미쳤다는 것이다. 그는 교수 연구실을 찾아다니면서 “니가 뭐냐?” 하고 삿대질하고 행패를 부렸다. 그 친구 때문에 교수들은 봉변을 피해서 강의가 끝나면 바로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그 이전에는 박사 논문을 출판한 것을 들고 지방 대학에 자리를 잡고 있는 선배들을 찾아다니면서 술을 얻어먹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 적도 있었다. 강원도 소도시의 깡촌에서 서울로 유학 온 그가 명문대에서 철학박사를 취득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가? 그의 박사 논문은 1992년에 『비트겐슈타인의 철학과 마음』이란 이름으로 <자유사상사>에서 출간했다. 이 책은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을 불교 철학의 관점에서 서술한 책인데, 국내에서는 이 방면으로 아마도 최초일 것이다. 그는 학위 논문을 그 당시 모 출판사 대표였던 김한용씨가 살던 북한산 근처에서 썼다. 그런데 논문이 마지막으로 접어들 때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한다. 잠을 못 자면 기가 위로 뻗쳐서 머리가 돌 가능성이 높다. 수승화강(水昇火降)이라고, 무거운 수기(水氣)는 위로 끌어 올리고 가벼운 화기(火氣)는 아래로 끌어 내려야 한다. 그래야 기의 순환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다. 산속의 수행자들도 종종 수행과정에서 기가 뻗치는 현상이 나타나곤 해서 반드시 이를 잡아 줄 사람이 필요하다. 학위 논문을 마치고 그것을 책으로 출판하면서 그에게 이런 증세가 본격적으로 터진 것이다.
대학원 시절 아주 친하게 지냈지만 그즈음 우리는 무엇 때문인지 거의 만나지 못했다. 특별히 싸운 것은 아니지만 비트겐슈타인과 불교 철학을 하는 그와 헤겔과 마르크스를 하는 내가 서로 대화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 이전에 무수히 논쟁과 언쟁을 반복하다가 싸운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내가 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법대 동기인 김이후와 함께 용제관 2층의 아주 특이한 방을 이용한 적이 있었다. 백양로를 한 참 걸어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상경관이 있었고, 정면에는 언더우드 동상과 그 뒤로 문과대 건물이 고풍스럽게 서 있었다. 오른쪽 언덕 길을 올라가면 유명한 청송대 숲이 있는데 용제관은 언덕 초입의 오른쪽에 있었다. 당시 가정대와 법대가 함께 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다. 우리가 사용했던 2층의 방은 화장실을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는 방이다. 때문에 화장실을 수많은 사람들이 들르면서도 이 방은 몰랐다. 문 속의 문이 있는 방인데, 이 안에 들어서면 백양로가 한눈에 보일 만큼 전망이 좋았다. 이 방에는 침대와 쇼파가 있었고, 두 명이 공부할 수 있는 책상도 있었다. 이 방은 원래 금융감독원을 다니면서 박사 논문을 썼던 정모 선배가 이용하던 방이었다. 그가 P 대로 임용되면서 나가게 되었는데, 그는 나중에 P 대 총장을 두 번 연임했다. 총장을 퇴임한 다음 몽골 울란바타르로 가서 ICT Univ. 총장을 역임하고 있다.
나의 법대 동기인 김이후가 정모 선배와 아주 친했기 때문에 그 방을 물려받은 셈이다. 당시 내 친구는 법철학으로 석사 논문을 마친 다음 미국 대학으로 유학을 준비 중이었다. 그와 나는 정립회관에서 만난 이후 지금까지 수십 년을 이어 온 절친이었다. 그와 대학 다닐 때 술을 엄청마시고 1주일에도 몇 번씩 남가좌동에 있는 그의 집에서 자곤 했다. 그의 어머니는 그때마다 전혀 눈살을 찌푸리지 않고 우리를 잘 받아주고 밥도 잘 챙겨 주었다. 그가 그 방을 맡게 되자 그는 바로 나를 그 방으로 끌어들였다. 그곳에서 우리는 각자 공부하기도 하고 함께 하버마스의 『인식과 관심』(Knowledge and human interests)이라는 책을 읽기도 했다. 나중에 그가 미국에서 하버마스와 푸코로 학위 논문을 쓸 때 이때의 강독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나는 종종 술을 마시고 이 방의 침대에서 잠을 자기도 했는데, 아침에 새소리를 들으면서 창가를 내다보면 연세 캠퍼스가 마치 나의 정원 같다는 느낌도 들었다. 이 방은 당시 대학가의 데모가 격렬했을 때 건물로 쫓겨 들어왔던 학생들의 피신처가 되기도 했고, 철학과의 선후배 동료들도 많이 찾아 주었다. 친구가 유학 간 다음에도 나는 이방을 혼자서 한참을 이용했는데 나중에 법대 학생회에서 문제 삼아 마지못해 내준 적이 있었다.
한 번은 이모 군과 신촌 시장에서 술을 먹다가 논쟁이 심하게 벌어진 적이 있었다. 개인과 사회의 문제였는데, 일종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식으로 끝이 없는 논쟁이다. 비트겐슈타인과 불교를 하는 그에게는 자유주의와 개인의 문제가 다른 어떤 것들보다 중요했다. 하지만 헤겔과 마르크스에 심취한 나에게 그런 이야기들은 그저 자유주의자들의 헛된 욕구에 불과해 보였다. 그날 심한 논쟁을 벌이다가 밤늦게 헤어져서 나는 용제관 그 방으로 돌아와서 쓰러져 잤다. 그런데 새벽에 이모 군이 찾아온 것이다. 그는 나랑 헤어진 후 밤을 꼬박 새운 후 새벽에 버스가 다니자 나를 찾아온 것이다. 그는 마음에 조금이라도 걸리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곱씹어서 완전히 털어 내야만 풀리는 성격이다. 일종의 결벽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당시 그는 박사 논문을 쓰고 있었고, 나 역시 논문 문제로 골머리를 썩다 보니 우리가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 상태에서 1992년 이른 봄 즈음 그에 관한 소식이 내 귀에도 들렸다. 그가 머리가 다소 돈 것 같고, 사람들에 대해 적대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다닌다는 것이다.
한 번은 내가 철학과 강사실에 볼일이 있어서 들른 적이 있었다. 그때 마침 그가 거기 있었다. 반가운 마음에 이름을 부르면서 악수를 청했다. 그러니까 그는 단호하게 내 손을 쳐 버렸다. 그는 머리를 군인처럼 짧게 잘랐고, 얼굴과 팔 곳곳에는 상처도 보였다. 막 교도소에서 나온 모습같이 험악해 보였다. 나를 빤히 쳐다볼 때는 평소의 그와 달리 살기가 느껴졌다. 더 이상 우리는 말을 하지 않고 헤어졌다. 그날이 내가 그 친구를 마지막으로 본 날이다. 그의 행각은 여전히 거친 이야기로 들려 왔다. 한 번은 학생들 축제하는 기간 중에 텐트를 불 질러 버린 적이 있다. 학생이 공부나 해야지 무슨 축제냐고 하면서 그랬다는 것이다. 그 사건은 당시 일간지 사회 면에 보도된 적도 있고, 그는 바로 서대문 경찰서로 연행되기도 했다. 지도 교수인 P 교수가 힘을 써줘서 경찰서에서 풀려나자 그를 걱정한 친구들이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그러고 나서 한 두어 달 동안 잠잠했다. 그런데 아주 나쁜 소식이 들려왔다. 그가 병원에서 퇴원 후 고향으로 낙향했는데 부모가 있는 집에서 농약을 먹고 자살을 했다는 것이다. 내가 철학과에서 숱한 경험을 했지만 그 일은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의 하나였다. 무지렁이 부친은 농약 먹고 고통스러워 떼굴떼굴 구르는 아들을 그냥 몇 시간 동안 방치했고, 죽자 바로 가마때기에 싸서 산에 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중에 우리가 원주의 가파른 치악산을 올라가 그의 무덤을 만들어 주었고, 간단하게 나마 추도식을 올려 주었다. 그가 죽은 지 벌써 30 여 년이 흘렀다. 여전히 껑충한 키에 오른쪽의 혹을 돌리던 그의 모습은 지금도 생생하다.
이종철(철학박사)은 『철학과 비판』(도서출판 수류화개)과 『일상이 철학이다』(모시는 사람들) 그리고 『문명의 위기를 넘어』(공저, 학지원)를 썼다. 그는 『헤겔의 정신현상학』(J. Hyppolite, 1권 공역/2권, 문예출판사), 『사회적 존재론』(G, Lukacs, 2권/4권(공역), 아카넷), 『나의 노년의 기록들』(A, Einstein, 커큐니케이션스북스)등 다수의 번역서들을 냈다. 현재는 연세대 인문학 연구소 전문 연구원이자 인터넷 신문 ‘브레이크뉴스’와 ‘내외신문’의 칼럼리스트로 활동하면서 NGO 환경단체인‘푸른 아시아’의 홍보대사를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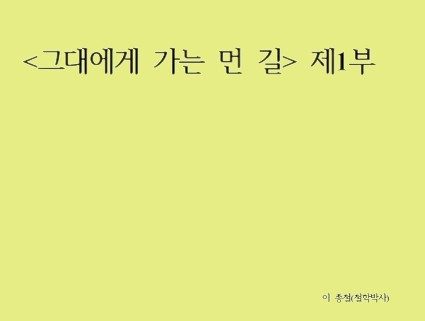


Leave a Reply
Want to join the discussion?Feel free to contrib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