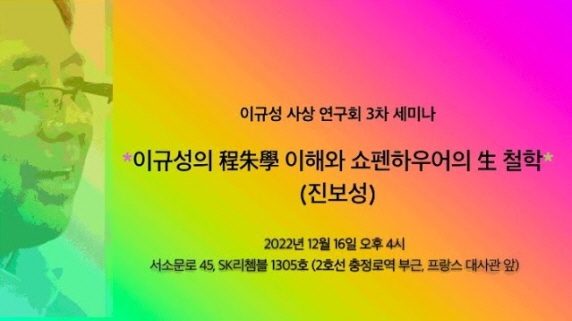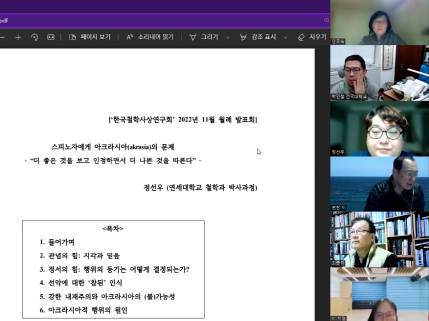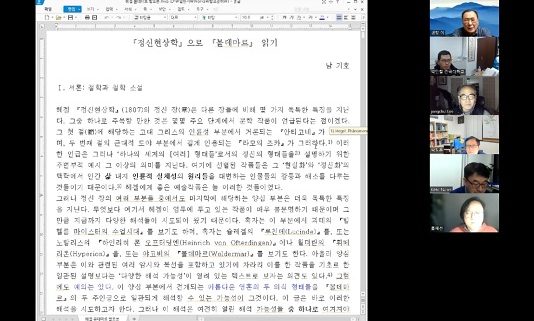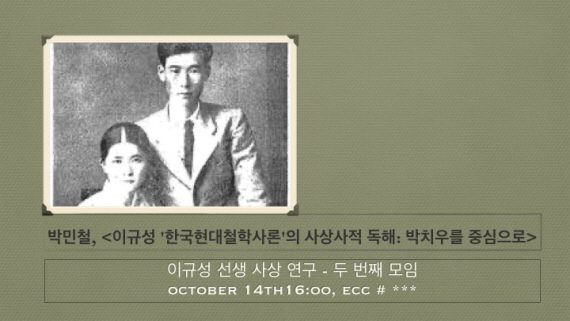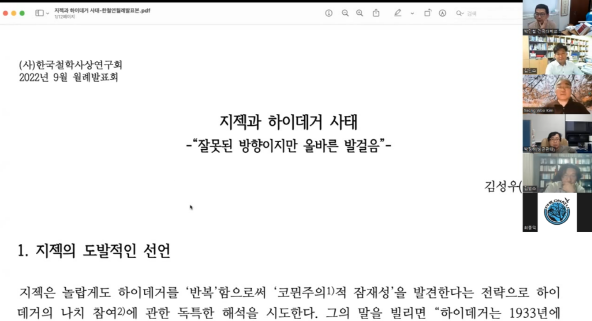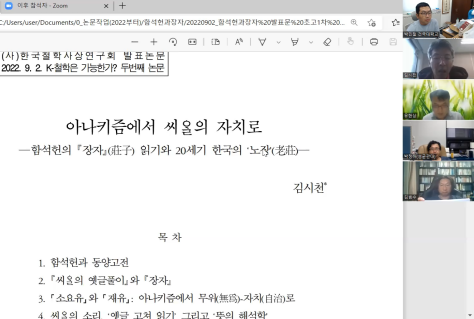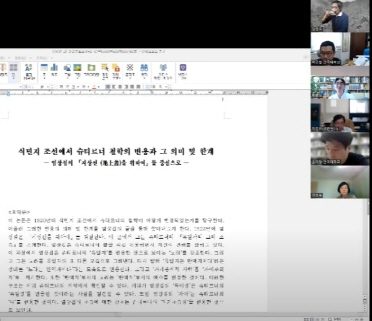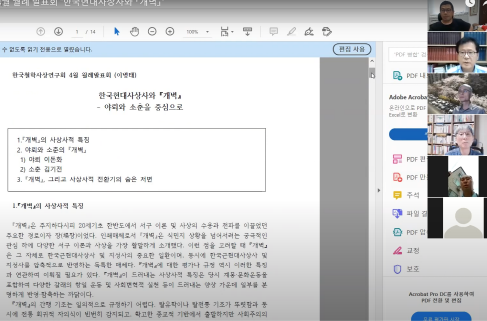이규성 철학 연구회 2022년 12월 제3차 정기세미나 영상 “이규성의 程朱學 이해와 쇼펜하우어의 生철학 (1)” 2022.12.16. [월례발표회·세미나]
[이규성 철학 연구회] 세 번째 정기 세미나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사정상 동영상이 아닌, 음성파일로 올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의지와 소통으로서의 세계』(2016)의 ‘Ⅶ. 아시아 철학과 선험적 구성론’에서 ‘1. 주희朱熹와 쇼펜하우어’의 내용을 중심으로 저자 이규성의 程子와 주희에 대한 연구논문의 일부를 참조하여 정리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합니다.
다음 세미나는 2023년 2월 16일(목) 16시 잠정 시행 예정으로 최종덕(독립학자, philonatu.com) 선생님의 『의지와 소통으로서의 세계』에 대한 자세한 평론(가제: 쇼펜하우어로 본 이규성의 소통과 혼융의 철학)으로 진행합니다.
주 제 : 이규성의 程朱學 이해와 쇼펜하우어의 生철학 (1)
발표자 : 진보성(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 시 : 2022년 12월 16일(금) 오후 4시~6시
장 소 : 서소문로 45 소재, 이병창 교수 ‘정치학교’ 연구강의실
방 식 : 대면+비대면 zoom 회의
♦ 동영상 출처 : https://youtu.be/mqXvRjLUv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