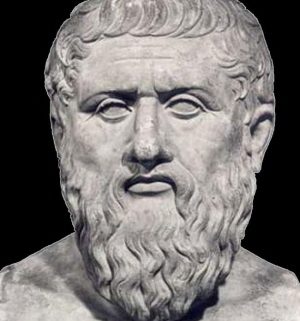플라톤의 『국가』 강해 ㉚ [이정호 교수와 함께하는 플라톤의 『국가』]
플라톤의 <국가> 강해 ㉚
2-4. 무역상, 소매상, 임금 노동자 등 서비스업과 화폐의 발생(371a-371e)
* 앞서 문자의 비유가 보여주듯 최초의 나라가 유기체적 성격을 갖는 것임을 고려하면 최초의 나라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자기 성향에 있어서 서로가 다르게 태어나서 저마다 다른 일을 한다’(370b)는 플라톤의 언급은 매우 자연스런 귀결이다. 그것은 적성에 따른 분업을 정당화하는 중대한 전제로서 장차 정의로운 나라의 속성을 규정하는 핵심 토대가 된다. 플라톤에게 인간은 소피스트들의 생각과 달리 결코 이기심을 본성으로 갖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혼자서는 살 수 없고 그에 따라 서로 필요에 따라 의존하고 협동하지 않으면 안 될 사회적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적성 또한 서로 다르게 가지고 태어나 기꺼이 서로의 필요에 부응하는 자질 또한 갖추고 있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라는 소피스트들의 생각은 단지 당대 아테네가 패권주의를 지향한 이래 상업화되고 개인주의화되면서 마치 이기심이 자연적 본성인 양 왜곡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정의로운 국가는 근본으로 되돌아가 협동적 존재로서 인간의 사회적 본성을 토대로 새롭게 다시 구축되지 않으면 안 된다.
[371a-b]
* 상대국과의 거래 즉 수입εἰσάγειν 및 수출ἐξάγειν이 요구되는 한, 나라는 상대국 사람들에게 필요한 종류의 것들도 필요한 만큼 생산해야 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농부들과 장인들이 필요하다. 게다가 각 종류의 물건들의 수입과 수출을 도와 줄 심부름꾼διάκονος 즉 무역상ἔμπορος도 필요하고 해상 운송에 정통한 사람τῶν ἐπιστημόνων τῆς περὶ τὴν θάλατταν도 필요하다. 그리고 서로의 필요 때문에 협력 관계κοινωνία를 맺고 나라를 수립했으므로 나라 안에서도 물건들을 서로 팔고 사는 일이 필요하여 시장과 교환을 위한 표σύμβολον로서 화폐νόμισμα가 생겨난다.
[371c-e]
* 그리하여 시장ἀγορά에서 생산물의 유통을 위해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생산물을 교환해줄 심부름꾼으로서 소매상πρᾶσιν διακονοῦντας이 나타나고 짐 운반 등 체력의 사용을 파는 사람들οἳ δὴ πωλοῦντες τὴν τῆς ἰσχύος χρείαν 즉 체력 사용의 대가로서 임금μισθός을 받는 임금노동자(고용인)μισθωτοί도 생겨난다. 소크라테스는 소매상을 ‘제대로 다스려지는 나라들의 경우 대개 신체적으로 가장 허약하고 그 밖의 다른 일을 하는 데에는 무용한 사람들’πόλεσι σχεδόν τι οἱ ἀσθενέστατοι τὰ σώματα καὶ ἀχρεῖοί τι ἄλλο ἔργον πράττειν로 묘사하고 있고(371c) 임금노동자는 ‘지적인 일에서 동반자 관계에 그다지 어울리지는 않는’τὰ μὲν τῆς διανοίας μὴ πάνυ ἀξιοκοινώνητοι ὦσιν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371e)
* 소크라테스는 이처럼 농부와 건축공, 직물공, 제화공, 목부 그리고 무역상과 소매상, 임금노동자를 최초 국가의 정원(구성원)πλήρωμα πόλεώς 즉 최소한도의 필요에 따른 국가로 언급하고 그 최소한도의 필요를 충족하는 만큼 ‘완전 하리 만치 성장한 나라’ἡ πόλις, ὥστ᾽ εἶναι τελέα라고 말한다.(371e)
———————
* 여기서 무역상ἔμπορος은 수출입을 전문으로 하는 상인이고, ‘해상 운송에 정통한 사람’은 선박으로 사람과 화물을 운반하는 해운업자ναύκληρος이다.
* 보통 화폐νόμισμα가 가지고 있는 기능으로 가치의 교환, 가치의 척도, 가치의 저장 기능을 든다. 그러나 이곳에서의 플라톤의 언급은 화폐가 처음에 교환을 위한 물표로 생겨났음을 보여준다. 이후 화폐는 우리가 주지하다시피 언제라도 필요한 물건과 바꿀 수 있는 가격 즉 가치의 저장 기능을 갖게 되었고 시장에서도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상점과 상인이 생겨났고 그에 따라 화폐는 거래 물건들의 경제적 가치를 표시하는 척도가 되었다. 특히 화폐가 가치의 저장 기능을 갖게 된 이후 화폐는 교환 수단을 넘어서 장차 높은 가격으로 되팔기 위한 매점의 수단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화폐 자체가 이윤을 창출하는 상품이 되면서 화폐의 소유욕의 증대에 비례하여 차입의 욕구 또한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이른바 돈으로 돈을 버는 직종 즉 사용가치가 아닌 교환가치의 유통과 판매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 금융업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화폐의 발생을 통해 사용가치를 갖는 구체적 물건들이 화폐로 추상화되고 가격으로 일원화되면서 사용가치에 대한 교환가치의 우위가 초래된 것이다. 게다가 금융의 발달에 따른 사용가치에 대한 교환가치의 절대적 우위는 생산자 계층에 대한 관리 계층의 우위는 물론 인간의 욕망을 부에 대한 욕망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금전만능주의를 탄생시켰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말대로 인간이 자신을 위해 만든 수단에 거꾸로 종속되는 이른바 소외(Entfremdung)가 발생한 것이다.
* 아테네 당대에만 해도 이미 은행이 존재했고 개인들 간의 금용 거래는 물론 고리채 또한 성행했다. 플라톤은 이미 그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플라톤이 여기서 화폐의 기능을 교환 기능으로 한정하여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단지 일반론 차원에서 최초국가 단계에서의 화폐의 기원을 언급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화폐의 사적 소유욕의 증대와 고리채 등 금융을 통한 부의 축적이 일상화된 당대 아테네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 때문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플라톤의 정의로운 국가에서는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배 계층에 속한 사람들에게 아테네 당대의 상황과는 전혀 다르게 극단적이라 할 정도로 재물의 사적 소유가 금지되고 있다. 재물의 소유와 축적은 오직 생산자계층에게만 허용되고 있고 통치자 계층에게는 최소 필수품 이외의 어떠한 소유도 허락되지 않는다. 권력과 부를 함께 갖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권력은 순수하게 시민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자신의 덕이자 행복으로 여기는 자의 몫이다.
* 플라톤이 소매상을 ‘가장 허약하고 그 밖의 다른 일을 하는데 무용한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다고 해서 플라톤이 소매상이나 허약한 사람을 폄하하고 있다고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곳에서는 최초국가에서 소매상도 나라 안에서 서로를 위해 필요한 사람이고 그 또한 그 일을 맡기에 가장 적절한 사람이 수행해야 한다면 그 일은 태생적으로건 후천적으로건 신체가 약한 사람들이 맞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무용하기로 말하면 철학자들 역시 농사나 소매상 등 생산이나 유통 관련 일에서는 무용하기 짝이 없다. 그리고 플라톤이 소매상을 ‘그 일을 눈여겨보고 스스로 떠맡는 사람εἰσὶν οἳ τοῦτο ὁρῶντες ἑαυτοὺς ἐπὶ τὴν διακονίαν τάττουσιν ταύτην(371c)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도 소매상이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부여된 일이 아니라 필요와 적성에 근거하여 자발적으로 선택된 것임을 뒷받침해준다. 체력의 사용을 파고 사는 사람들 즉 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묘사 또한 소매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성과 소질에 따라 그 일을 스스로 떠맡는 사람들이며 그들 또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최소한도의 필요에 따라 최초의 나라의 정원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소매상과 임금 노동자에 대한 플라톤의 언급은 그들에 대한 폄하를 포함하고 있다기보다는 신체적 능력과 지적 능력의 차이가 현실적으로 현존하고 그러한 사정이나 여건이 달리 변화할 가능성이 거의 힘들다면, 그들의 사정과 적성에 따라 그들에게도 서로가 필요한 사회적 역할이 주어질 수 있고 주어져야 함을 언급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여기에 나오는 임금 노동자들이 노예가 아니라는 점이다. 자신의 노동의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한 채 예속되어 강제로 노동하는 노예와 달리 최소한 이들은 그 일을 강제가 아닌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그 일에 대한 대가도 받고 있다. 실제로 완전하리만치 성장한 이곳 최초의 국가의 정원에는 노예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것에 근거해서 플라톤이 그리는 정의로운 국가에 아예 노예 자체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비록 노예가 맡은 일의 대부분이 체력을 쓰는 일이지만 시민 가운데에도 체력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곳의 임금 노동자가 바로 그 시민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다. 게다가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를 사람이 아닌 마소로 여겼고 플라톤 역시 당대의 시대적 한계를 넘어서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면 노예의 존재는 이미 정의로운 국가에서도 당연한 존재로 전제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
* 플라톤이 언급하고 있는 최초 나라의 정원(구성원)πλήρωμα πόλεώς을 보면 결국 최소한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나라는 농부, 직물공, 건축공, 목부 외에 무역상과 해운업자 그리고 소매상과 임금 노동자로 구성된 나라이다. 이들 모두는 직접 생산과 유통을 도와주는 이른바 물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심부름꾼들로서 장차 플라톤이 그리고 있는 정의로운 나라를 기준으로 보면 크게 생산자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소크라테스는 흥미롭게도 아직 정치가나 지식인, 철학자가 없는 이와 같은 최초 국가를 ‘완전하리 만치 성장한 나라’로 묘사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 이쯤에서 우리는 아테이만토스 형제가 소크라테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그 요구에 대한 답변을 시작하면서 문자의 비유를 통해 이야기를 나라에 관한 이야기로 확대시키고 있는 배경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아테이만토스 형제의 요구는 한 마디로 ‘정의와 부정의 각각이 개인과 나라 안에서 어떤 힘(dynamis)으로 작용하기에 정의가 부정의보다 강하고 낫다는 것인지’를 설명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하는 어떤 힘이란 개인의 경우 영혼들의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이라는 것이 이미 언급된 바 있다.(358b) 사실 그것은 장차 개인의 정의를 설명하는 키워드로서 영혼 3분설에 따른 영혼의 이성적인 부분, 기개적인 부분, 욕구적인 부분임을 예고하는 것이자 소크라테스가 답변을 시작하면서 다룰 대상이 다름 아닌 개인의 영혼임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다. 그리고 실제로 소크라테스는 개인을 살피는 것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소크라테스는 개인을 살피되 그것을 보다 잘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같은 성격을 갖는 나라를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다시 개인을 살피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한다. 물론 이러한 제안은 장차 개인과 나라를 유기적이고 통일적인 관점에서 살피려는 플라톤의 주도면밀한 의도를 반영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어쨌거나 일단 이 제안이 개인의 영혼들을 보다 더 잘 들여다보기 위한 방편으로 끌어들여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나라에 대한 고찰이 내용적으로 개인의 영혼들에 대응해서 제시될 것이라 예상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개인 영혼의 세 부분은 나중에 드러나듯이 나라의 세 계층 즉 통치자 계층, 전사 계층, 생산자 계층과 그대로 대응된다. 이와 같은 논의 구도상의 전후 맥락을 염두에 두고 최초국가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언급을 살필 경우, 결국 소크라테스가 그 최초의 국가를 생산자들로 구성된 나라로 구성하고 그것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것은 이 최초의 나라가 결국 플라톤의 정의로운 나라를 구성하는 생산자 계층의 성립을 보여주기 위한 포석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실제로 최초 국가에 이어 사치스런 나라가 소개되고 그 사치스런 나라에서 수호자 계층이 나오고 장차 그곳에서 다시 통치자 계층이 등장하게 되는 것도 그것을 뒷받침해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최초의 나라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언급은 나라의 기원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에 관한 언급이라기보다는 애초부터 정의로운 나라의 세 계층이라는 전체 구도를 염두에 두고 그 가운데 우선 생산자 계층의 성립과정부터 설명하기 위한 일종의 기획된 언급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해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최초의 나라가 장차 사치스런 나라로 계속 변화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가 이 최초의 나라를 ‘완전하리만치 성장한 나라’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전체 논의 구도에서 우선 일차적으로 생산자 계층에 관한 논의가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요컨대 플라톤은 최초국가에 대한 기술을 통해 부정의가 생기기 직전 단계까지 즉 필요에 있어서 최소한도의 수준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장차 드러날 정의로운 국가를 구성하는 3계층 가운데 물적 기반의 토대를 이루는 생산자 계층의 성립 단계를 우선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371e]
* 이러한 나라를 수립한 후 소크라테스는 “그렇다면 이 나라 안 어디에 정의와 부정의가 있으며,ποῦ οὖν ἄν ποτε ἐν αὐτῇ εἴη ἥ τε δικαιοσύνη καὶ ἡ ἀδικία; 그 각각은 우리가 이제껏 검토해온 것들(주민들 또는 기능들)중 어느 것과 더불어 생겨났을까”καὶ τίνι ἅμα ἐγγενομένη ὧν ἐσκέμμεθα;를 묻는다. 그에 대해 아데이만토스는 “사람들 상호간의 어떤 필요” χρείᾳ τινὶ τῇ πρὸς ἀλλήλους에 의해서 그 각각이 생겼다고 답을 한다. 즉 위의 나라는 사람들 상호간의 필수적인 필요χρείᾳ에 입각하여 수립된 나라라는 것이다.
—————–
* 그러나 이 최초의 나라는 앞서 우리가 살핀 전체 논의 구도상 첫 단계의 완결일 뿐 종결은 아니다. 실제로 최초의 나라는 그 상태 그대로를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변화를 맞이한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유기체의 경우, 순진무구하게 생존의 욕구만 충족되면 불만이나 고민도 없는 어린이 상태로 계속 있을 수 없고 점차 신체적으로 성장하고 욕구 또한 다양화되고 증대되면서 어른으로 자라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치와도 같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 소크라테스가 완전하리만큼 성장한 최초의 나라를 언급한 후에 느닷없이 글라우콘에게 이 나라 안에서 정의와 부정의가 어디에 있고 무엇 때문에 정의와 부정의가 생기는 지를 묻고 그 원인이 ‘필요’chreia임을 재차 확인하고 있는 장면은 나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최초의 나라는 완결되었지만 최초의 나라를 성립시켰던 필요는 완결을 넘어 계속 나라의 변화를 낳는 근본 원인임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재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즉 이들의 대화는 최초의 나라는 일단 마무리되었지만 그 다음의 단계 즉 정의와 함께 부정의가 발생하는 단계가 계속 이어질 것이며 그 원인은 하나같이 ‘필요’ 때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2-5. 건강한 나라, 참된 나라 그리고 돼지들의 나라(372a-372d)
[372a]
* 소크라테스는 최초의 나라가 완전하게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을 마무리하면서 필요의 확대에 따라 등장하게 될 나라를 다루기 전에, 최소한도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성립한 최초 나라의 모습 즉 서로에게 필요를 제공할 준비가 된 최초의 나라의 사람들οἱ οὕτω παρεσκευασμένοι이 어떤 방식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먼저 고찰한다.πρῶτον οὖν σκεψώμεθα τίνα τρόπον διαιτήσονται.
[372b-c]
* 소크라테스는 이 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아주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그 묘사를 요약하면 이와 같다. “그들 모두 좋은 자리에 누워 충분하게 먹고 마시면서 신들을 찬송하며ὑμνοῦντες τοὺς θεούς 서로들 즐겁게 교제하고ἡδέως συνόντες ἀλλήλοις, 가난이나 전쟁πενίαν ἢ πόλεμον을 ‘유념하여’εὐλαβούμενοι. 재력 이상으로ὑπὲρ τὴν οὐσίαν 자식을 낳지도 않으면서 건강과 함께 평화로움 속에서ἐν εἰρήνῃ μετὰ ὑγιείας 일생을 보내다가 아마도 늙은이로서 고령에 죽으면서 그와 같은 또 다른 인생을 후손에게 물려준다.”
————————
*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 먹거리들 즉 주식인 보리 가루ἄλφιτον와 밀가루ἄλευρον[372b] 그리고 부식(요리ὄψον)으로서 소금ἅλας과 올리브ἐλαία, 치즈τυρός, 삶은 구근βολβός과 채소λάχανον 요리, 그리고 후식τράγημα으로서 무화과σῦκον와 콩류ἐρέβινθος(완두콩) καὶ κύαμος(콩), 포도주οἶνος, 도금양μύρτη(방향성의 상록 관목, 아프로디테의 신목)의 열매μύρτον나 도토리φηγός 등(372c)은 당시 그리스의 일반 가정의 식생활을 짐작하게 한다. 주목할 점은 그리스가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이고 그에 따라 실제로 그리스인들 모두 반도에 정착한 이래 문어와 조개류 등 많은 어류들을 섭취했음에도. 플라톤이 서술하고 있는 식품에는 육류는 물론 어떠한 어류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사실 제1권 강해에서도 언급했듯이(338c 강해 참고) 그리스인들은 육류는 즐겨 먹지 않았다. 그러나 호사스런 나라에서는 육류의 수요가 생겨난다.(373c 참고)
* ‘요리’의 원어 ὄψον(opson)은 기본적으로 익힌 주식에 곁들여 먹는 부식을 뜻하지만 익힌 음식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 어떤 사람은 이것을 좁은 의미에서 육류와 어류 음식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래서 이들은 글라우콘이 앞에서 ‘요리도 없이 잔칫상을 받게 한 것 같다’고 말한 것은 플라톤이 언급한 음식들에서 육류나 어류 등 고급 먹거리가 빠져 있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그러한 지적을 듣고 이어지는 설명이 그에 대한 보완 설명이라고 본다면 글라우콘이 빠졌다고 지적한 것은 그 내용으로 보아 육류나 어류가 아니라 뒤에 이어지는 부식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보인다.
* 이곳에서의 플라톤의 세부 묘사들은 당시 그리스인들의 최소한 의식주에 있어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만족스러운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줌과 동시에 비록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는 없지만 플라톤이 생각하고 있는 자연적 정의 즉 정의의 원초적 상태가 무엇인지를 함께 보여준다. 그들이 유일하게 조심하는εὐλαβούμενοι 것은 가난이나 전쟁이지만 그것조차 말 그대로 ‘조심’ 또는 ‘유념’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것은 마치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의 타락이전의 삶 즉 에덴동산의 삶을 연상시키기까지 한다. 요컨대 그 요체는 건강과 평화이다. 건강은 말 그대로 신체적인 강건함이요 평화는 나라 사이에서건 개인 사이에서건 그리고 개인의 내면에서건 갈등과 분열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사실 최초 국가의 사람들처럼 최소한도의 필요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의 경우, 인생을 살아가며 목표하는 것으로서 이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소크라테스가 바로 이어 이런 나라를 일컬어 ‘건강한 나라’라고 묘사하는 것은 일종의 유기체로서 이 나라가 갖고 있는 신체적 건강 때문일 것이고 나아가 ‘참된 나라’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 또한 이 나라가 보전하고 있는 자연적 정의 즉 분열과 갈등이 없는 평화의 상태 때문일 지도 모른다.
[372d]
* 그러나 글라우콘은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언급에 대해 그렇게 수립된 나라는 “돼지들의 나라ὑῶν πόλις”라고 폄하한다.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최초 나라 사람들의 생활은 주로 먹고 사는 일인데 그것은 돼지들의 삶과 다를 바가 없으며 소크라테스가 그런 식으로 돼지의 나라를 수립하려했다면 과연 그런 것들만으로 돼지들을 살찌울 수 있겠느냐 그 밖에 다른 것들도 주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반문한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를 되묻고 글라우콘은 ‘흔히 하는 대로ἅπερ νομίζεται 그들이 불편을 감수할 사람들τοὺς μέλλοντας μὴ ταλαιπωρεῖσθαι이 아닌 한, 그들은 땅바닥 돗자리 위가 아닌 침상에 누워 식탁에 차려진 식사도 하고 요즘 사람들이 먹는 요리와 후식 즉 좀 더 고급스런 음식을 먹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소크라테스는 글라우콘의 반문을 호사스런 나라가 어떻게 성립되는가 하는 것도 고찰해보자라는 요구로 받아들인다.
——————-
* 소크라테스가 앞에서 글라우콘에게 나라에서 정의와 부정의가 생기는 원인을 묻고 그 답이 ‘필요’chreia라는 것을 확인하는 장면(372a)과 이곳에서 글라우콘이 소크라테스가 세우려는 나라가 돼지들의 나라인 한, 그가 말한 것들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다고 말하는 장면은 논의 구도상 최초의 나라에서 호사스런 나라로 이행하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즉 소크라테스가 말한 최초의 나라는 돼지들의 나라와 진배없으며 그에 따라 마치 돼지가 일정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필요를 추가해서 더 안락한 삶을 욕구하듯이 최초의 나라는 결코 그것으로 완결되지 않고 욕구가 증대하여 종국에는 사치스런 욕구까지 발생하여 결국 다른 나라로 불가불 변화하게 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유기체의 성장이 필연이듯 사람의 욕구는 결코 일정 단계에서 멈추지 않고 늘 필요를 생산하며 그에 따라 욕구 또한 필연적으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즉 플라톤은 인간의 본성과 관련하여 최소한 인간의 욕구는 어떻든 간에 일단 다양한 형태로 확대된다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나아가 만약 그 증대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 서로의 갈등은 물론 전쟁까지 초래될 수 있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인다. 즉 최초의 나라가 사치스런 나라로 변모하고 그에 따라 갈등과 다툼이 생겨나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인 것이다.
* 여기서 인간의 욕구가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는 것이 필연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곧 인간은 근원적으로 이기적이라는 주장으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욕망의 증대가 제한된 가치 총량을 넘어설 때는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지만 인간의 가치에 대한 관념이 결코 일원적으로 환원되지 않는 한, 가치의 총량이란 말은 그 자체로 무의미하다. 정신적 가치 내지 서로 다른 가치에 대한 욕망은 따로 총량이 없다. 일부 물질적 가치 영역에서 갈등과 다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인간의 이기적 본성이나 행태를 뒷받침하는 일반적 근거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 플라톤이 그리고 있는 인간 욕구의 증대에 따른 나라 내지 사회 계층의 변화는 사회적 변화를 생산관계의 모순에서 찾고 있는 마르크스의 변증법을 연상시킨다. 최초의 나라는 시민들의 욕구 증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모순을 드러내면서 호사스런 나라로 변모하고 호사스런 나라는 호사를 추구하는 시민들의 욕구 증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모순을 드러내면서 비로소 최고 단계인 자기 정화가 가능한 이상 국가의 등장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 결국 글라우콘의 냉소적 태도는 이러한 나라는 자신들이 듣고자 하는 정의와 부정의가 문제되는 현실의 나라도 아니고 부정의를 정화하여 정의를 구현하는 나라도 아님을 내비친 것이다. 사실 최초의 나라는 인간이 살아가는 현실의 나라와 거리가 멀다. 비록 건강과 평화 상태가 존재하고는 있지만 나라나 개인이 질병과 분열을 적극적으로 이겨내고 성취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의식주 등 필수적인 욕구에 만족한 채 살아가는 돼지 같은 삶이 가져다주는 건강과 평화이다. 그에 따라 이 나라에는 타자에 대한 긴장도 고민도 문제도 없으며 그런 까닭에 아직 정부도 정치도 철학도 없다. 물론 최초의 나라에는 비록 각자가 서로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스스로 선택하여 수행하는 상태 즉 자연적인 정의가 존재한다. 그러나 인간의 욕구는 지속해서 증대하고 그에 따라 나라가 규모나 수에서 확대 되고 필요가 충족되지 않음에 따라 필연적으로 다툼과 갈등이 생기고 그로부터 부정의가 발생하며 그에 따라 그에 대한 대책 또한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다시 말해 부정의를 다스리고 정의를 보전하기 위한 장치가 새롭게 요구되면서 그 일을 맡을 심부름꾼으로서 수호자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결국 철학과 정치·문명은 정의와 부정의가 함께 현존하는 위와 같은 현실 국가에서 요구되는 불가피한 필요인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의로운 나라란 부정의가 생겨나기 이전에 이른바 자연적 정의 상태가 존재하는 최초의 나라 같은 나라가 아니라 부정의가 함께 현존하는 현실에서 그것을 통제하고 이겨내면서 정의를 보전해내는 그러한 나라를 말하는 것이다. 장차 플라톤이 구축하려는 나라가 바로 이러한 나라이다. 그러한 한에서 플라톤이 목표로 하는 것은 최초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호사스런 나라를 최대한 정화하여 최대한 정의를 보전하고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나라라 할 것이다.
* 앞서도 간단히 언급했지만 플라톤의 이상국가가 통치자 계층, 수호자(전사) 계층, 생산자 계층으로 이루어진 국가라면 소크라테스가 이곳에서 언급하고 있는 최초의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의 형성 단계상 초기 단계의 국가 즉 생산자 계층으로만 구성되는 국가이다. 나라를 구성하면서 이처럼 생산자 계층의 나라를 최초의 나라로 상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 수립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할 요소가 다름 아닌 의식주라는 물적 기반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인간 또한 유기체인 한,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어야 그 다음 정치도 철학도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말대로 물적 토대라는 하부구조 없이 정신과 문화 등 상부구조는 세워질 수 없는 것이다. 물론 토대와 상부구조가 모두 성립한 이후에 어느 것이 구조 전체를 지배하고 구조의 보전과 지속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가의 문제는 별개의 논점을 구성하는 것이라 해도, 플라톤 역시 물적 조건 내지 생산자 계층의 역할이 나라 자체의 성립을 위한 일차적이고도 필수적인 기반인 것만은 결코 부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 그리고 이 나라는 비록 생물학적 자기 보전 자체에 만족하는 이른바 돼지들의 나라이긴 할지라도 이 나라를 구성하는 생산자 계층들 사이에는 협동적 삶이 유지되고 있고 그에 따라 고민과 갈등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일단 플라톤은 부정의의 원인을 생산자 계층의 고유한 특성과 연계시키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국가>에서 정의를 다루면서 왜 수호자 계층만을 주로 다루고 생산자 계층은 크게 다루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다. 물론 플라톤은 부정의를 바로 잡는 주체에서 생산자 계층을 배제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비판했던 민주정의 중심 세력으로서 민중이 기본적으로 생산자 계층임을 고려하면 플라톤은 여전히 생산자 계층을 불신하고 있음을 부정하기 힘들다. 그러나 플라톤의 대중에 대한 불신은 생산자 계층의 고유한 역할 자체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그 고유 영역을 넘어서 정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데서 온 것이다. 플라톤은 근본적으로 정의로운 나라를 구성하는 물적 토대로서 생산자 계층의 역할과 협동적 삶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신뢰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무엇보다도 플라톤은 생산자 계층이 자기 고유 역할을 넘어서 정치에 참여하게 된 원인을 생산자 계층에서 찾지 않고 그 이전에 그들로 하여금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게 만든 지배 계층의 탐욕적 욕망에서 찾고 있다. 실제로 플라톤은 제8권 정치체제의 타락과정을 설명하면서 민주정 치하에서 기본적으로 생산자 계층인 대중이 드러낸 욕망의 왜곡이 생산자 자신 때문이 아니라 통치자 계층의 그릇된 욕망과 잘못된 정치행태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부정의의 근원은 소수의 지배계층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시 말해 나라에서 발생하는 모든 해악의 뿌리는 근본적으로 생산자 계층이 아닌 지배 계층의 탐욕에 있었던 것이다. 다만 플라톤은 통치가 소수의 권력자들의 전유물이었던 시대적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 까닭에 소수 권력 계층의 지성화를 유일한 해결책으로 열망하게 되었고 그 방책을 구축하는 데 온 힘을 쏟았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역사는 오히려 권력의 지성화가 소수 기득권 계층이 아니라 시민의 지성화, 다중 집단의 지성화를 통해 달성되어야 하고 달성될 수 있으며 달성되는 것임을 증명하고 있다. 플라톤 정치 철학의 핵심이 양적 차원에서 소수 권력에 의한 지배를 정당화하는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질적인 차원에서 지성에 의한 권력의 지배 즉 권력의 지성화에 있었음을 고려하면 플라톤의 정치철학은 오늘날 민중의 지성화를 위한 철학적 원리로도 여전히 유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그러나 플라톤이 생산자들로 구성된 최초 나라를 건강과 평화가 담보된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플라톤이 생산자 계층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것은 생산자 계층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만 전체 논의 구도를 염두에 두고 정의와 부정의의 발생 과정을 설명하려는 차원에서 부정의가 발생하기 직전까지의 상황을 보여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전체 논의 구도 하에서 최초의 나라를 넘어서, 즉 물적 토대로서 생산자들로 구성되는 단계를 넘어서 문명과 문화적 욕구의 단계에 들어와야, 비로소 정의와 부정의가 생기는 것임을 말해주기 위한 포석일 뿐이라는 것이다.
* 젤러(E. Zeller)는 ‘돼지의 나라’라는 글라우콘의 언급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견유학파의 시조로 평가되고 있는 안티스테네스(Antisthenes, 기원전 445?-365?)에 대한 경멸을 담고 있다고 해석한다. 안티스테네스는 플라톤과 달리 소크라테스의 실천적인 면모에 주목하여 강건한 정신과 몸으로 소박한 삶에 자족하는 삶을 이상으로 여긴 사람이다. 즉 글라우콘의 냉소는 그와 같은 잘못된 이상에 대한 일종의 아이러니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여기서 플라톤이 그리고 있는 최초 나라의 모습은 안티스테네스가 꿈꾸는 그러한 삶을 담고 있다. 그러나 아담과 헨켈(Stud zur Gesch, Lehre vom Staat, 8 f.)등은 이러한 젤러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실제로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최초의 국가는 다만 이상 국가의 성립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첫 단계로 그려진 것으로서 일부 아이러니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곳에서 언급된 필요와 분업, 협동의 원리는 이후에도 수정되고 대체되면서 논의 기본 바탕이 된다. 그러한 점에서 최초의 국가는 아직 이상적인 나라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생산자 계층의 삶에 대한 불쾌함을 담고 있는 것도 아니다. 최초 나라의 편안한 삶(εὐχερὴς βίος Pol. 266 C)을 돼지의 삶에 비교한 것은 나름 적절하다. 다만 소크라테스와 달리 글라우콘이 냉소를 표하고 있는 것은 그 최초의 나라가 자신이 소크라테스의 답변을 통해 기대하고 있었던 현실 국가와 아주 동떨어져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기개θυμοειδής를 크게 중시하는 글라우콘으로서는 그러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물질적 욕구ἐπθυμμα 이상으로 상승하지 않는 나라의 삶을 경멸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아담 주석 참고)
2-6. 호사스러운 나라, 염증상태의 나라(372e-373d)
[372e]
* 이처럼 글라우콘의 냉소를 접한 소크라테스는 글라우콘의 요구가 그러한 나라만이 아니라 호사스런 나라도 어떻게 성립하는지를 고찰해보자는 요구로 받아들인다.[372e] 즉 글라우콘이 원하는 나라는 그러한 현실에 존재하지도 존재할 수도 없는 나라가 아니라, 늘 정의와 부정의가 문제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자신들의 요구나 관심사도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는 현실에서 엄연히 현존하고 있는 나라 즉 ‘호사스런 나라’τρυφῶσας πόλις인 것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보기에 참된 나라ἀληθινὴ πόλις는 앞서 서술한 건강한 나라ὑγιής πόλις인 것 같지만 글라우콘이 정 그러한 나라를 살피기를 원한다면 ‘호사스런 나라’를 살피는 것도 그리 나쁠 것도 없다고 말한다. 정의와 부정의가 어떻게 해서 나라들에 있어서 생겨나는지를 알아낼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 사실 앞서도 간단히 살폈듯이 소크라테스가 필수적인 필요에 입각한 나라를 먼저 말한 것은 장차 부정의가 문제되면서 수호자 계층이 요구되는 현실 국가를 끌어들이기 이전에 그 첫 단계로서 생산자 계층의 성립을 말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최초국가와 호사스런 나라의 모습을 보다 대조적으로 잘 드러내기 위한 밑 작업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가 언급하고 있듯이 이른바 ‘참된 나라’ἀληθινὴ πόλις, ‘건강한 나라’ὑγιής πόλις를 먼저 두고 그 다음에 호사스런 나라를 살펴야 정의와 부정의가 처음에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보다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깨끗한 흰 백지 위에 뭔가를 그려 넣어야 더 분명하게 보이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 그런데 여기서 소크라테스가 최초의 나라를 ‘참된 나라’, ‘건강한 나라’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두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우선 어떤 이는 이곳 최초의 나라가 자연적 적성과 서로의 필요에 따라 각자 자기가 할 일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 일을 맡아 수행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장차 밝혀지겠지만 자연적 본성에 따라 각자 자기가 할 일을 잘 수행해내는 것이 플라톤의 정의인데 이 나라는 이미 그러한 정의가 자연적으로 구현된 나라라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건강한 나라’라는 표현은 몰라도 ‘참된 나라’라는 표현은 일종의 아이러니로 해석한다. 참된 나라는 종국적으로 철학을 통해 부정의가 극복되고 정의가 구현되는 나라를 말하는데 이 최초의 나라는 철학적 사유는커녕 그저 먹고 사는 것에 만족을 드러내는 일차원적인 인간들로만 구성된 나라이기 때문이다. 또 한편 앞서 소개하였듯이 안티스테네스 같은 사람들은 소크라테스가 필수적인 욕구에 만족하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나라를 ‘참된 나라’ἀληθινὴ πόλις, ‘건강한 나라’ὑγιής πόλις라고 부른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이러한 나라야말로 실제로 그가 꿈꾸었던 이상국가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플라톤은 안티스테네스와 달리, 그저 생산자 계층만이 존재하는, 실제 현실과 거리가 먼 그런 나라가 아니라, 다양한 계층과 욕구가 이글거리고 서로 부딪치는 현실 그 조건 위에서 그것들 모두가 가장 이상적으로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나라를 이상적인 나라로 꿈꾸고 있다. 문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런 나라를 꿈꾸는 것은 사실 공허한 일이다. 플라톤의 이상국가는 현실 조건에서 가장 이상적인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본(paradeigma)으로 제시될 수 있는 현실의 조건 위에 선 이상국가인 것이다. 오히려 앞에서 소크라테스가 말한 건강한 나라, 돼지들의 나라는 어쩌면 루소(J. Rousseau)가 ‘자연으로 돌아가라’라고 외쳤을 때 그가 염두에 둔 최초 자연 상태의 인간 사회, 또는 무정부주의자들이 꿈꾸는 이상향, 또는 노자(老子)가 말하는 이상적인 과소(寡少)국가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