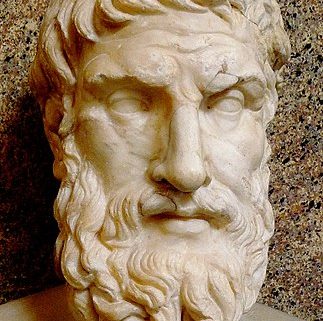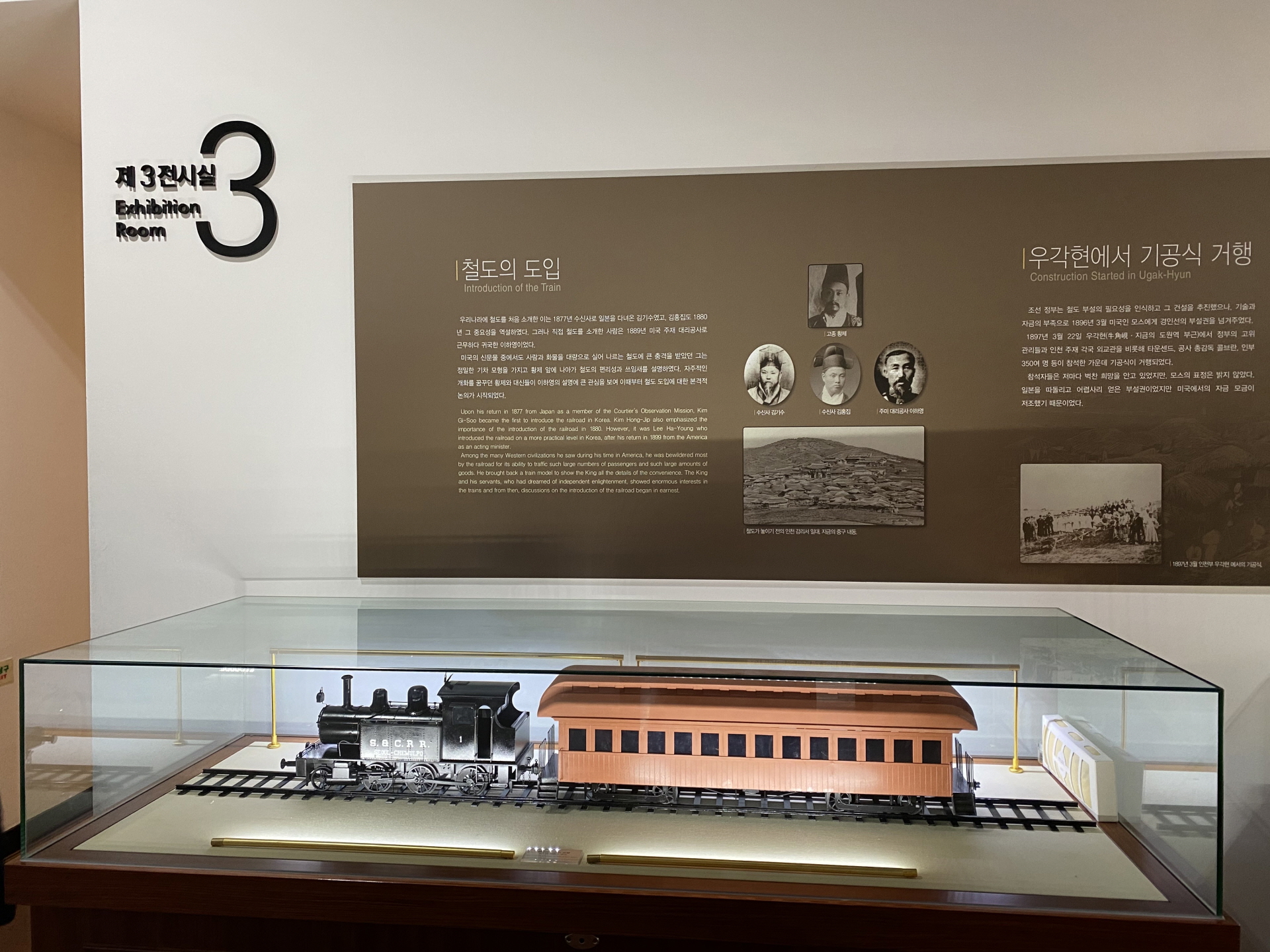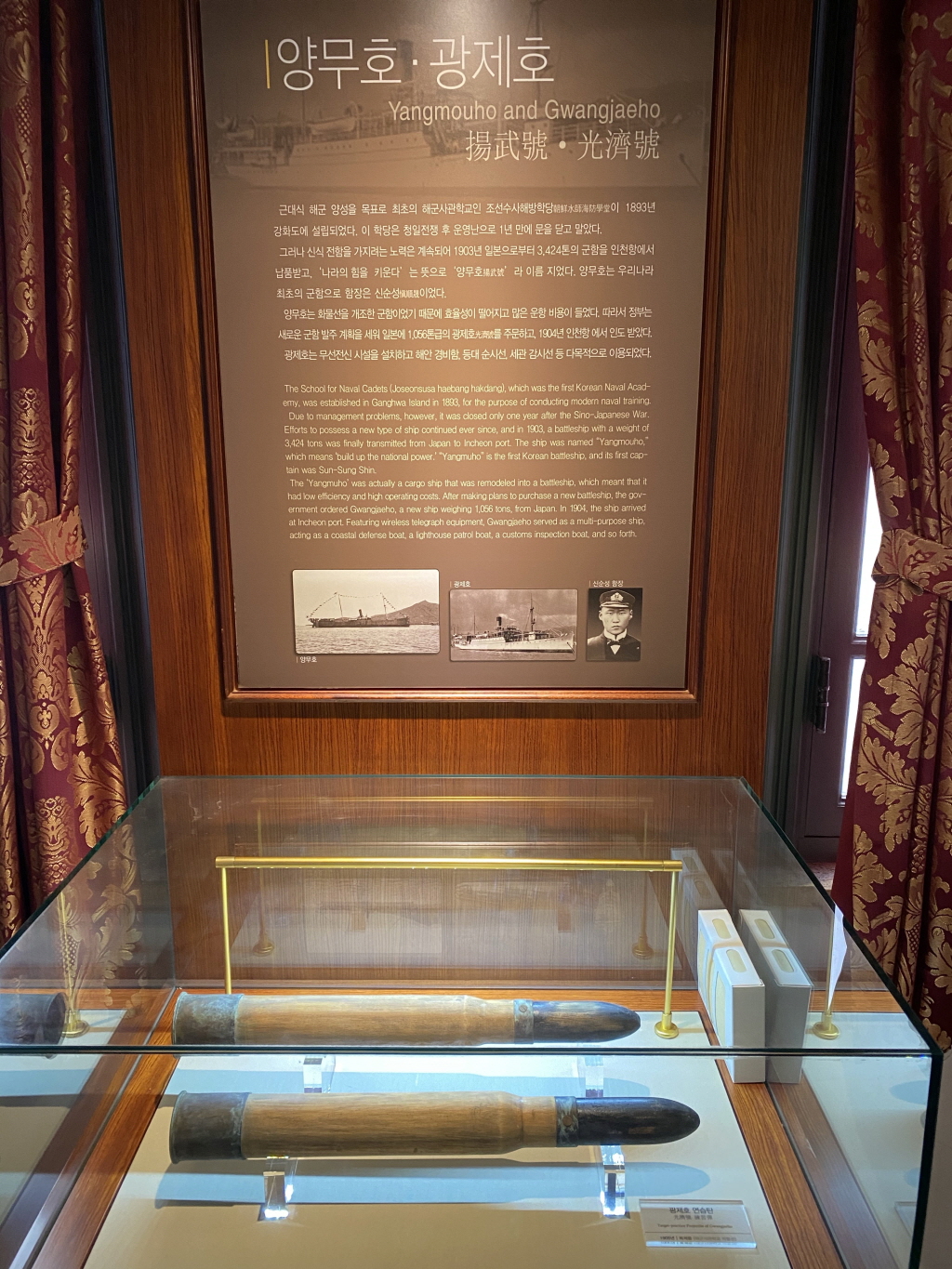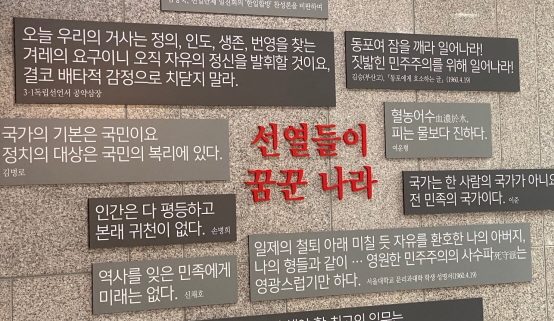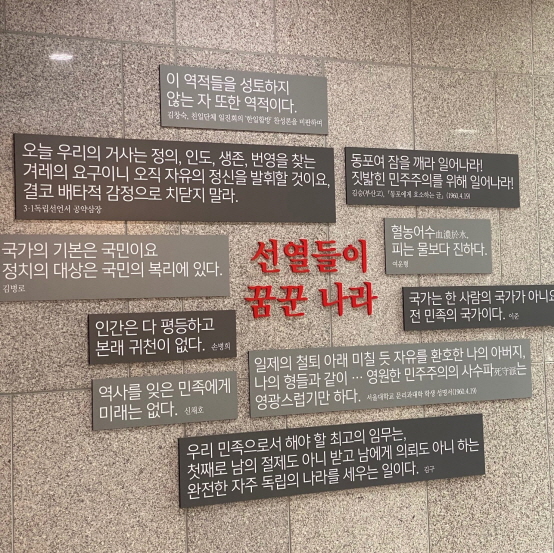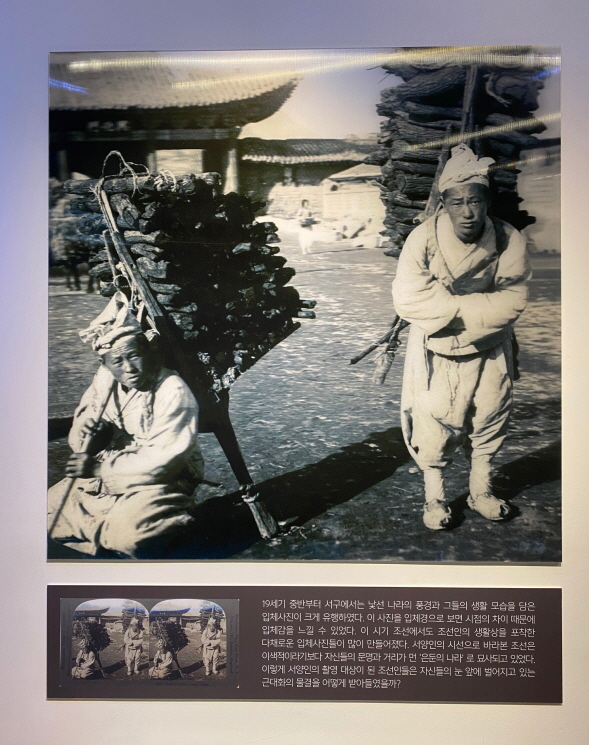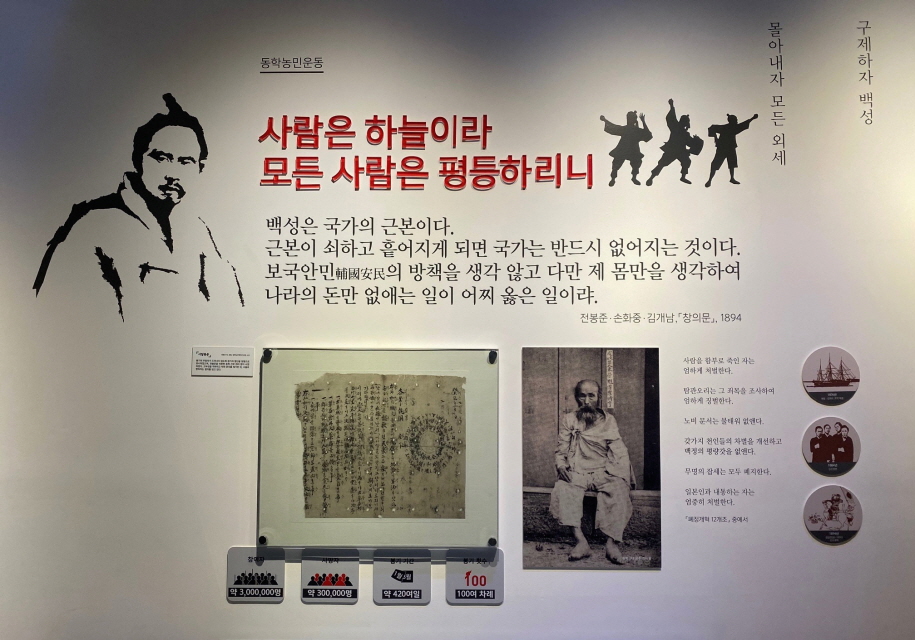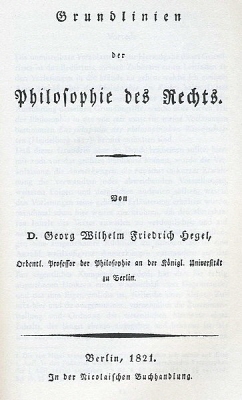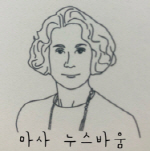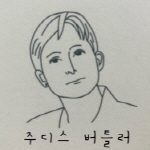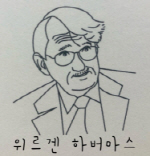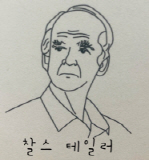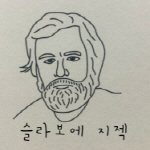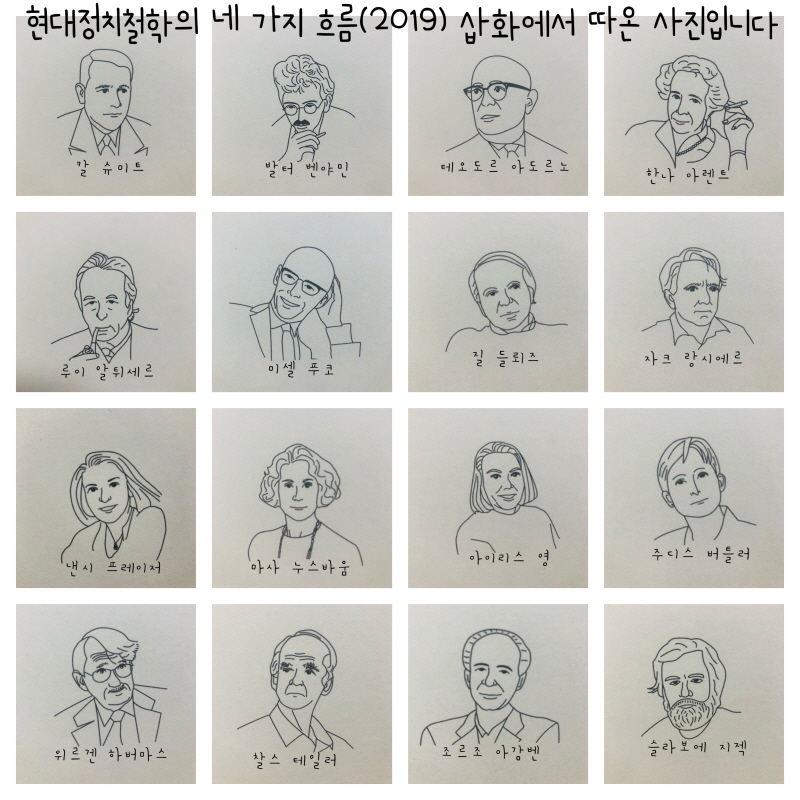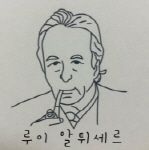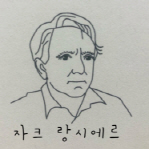한국철학사상연구회, 『현대 정치철학의 네 가지 흐름』(2019, 에디투스)에 대한 서평:
‘자유’-‘욕망’-‘차이’-‘저항’-‘해체’의 여정 (1부)
최종덕(한철연 회원)
철학은 비판과 반성을 겪어가는 삶이다. 정치는 그런 삶의 조건이면서 삶의 현장이다. 철학은 정치에 제약을 받지만 정치를 반성하고 느리지만 변화시킬 수 있다. 나로부터 멀어진 정치를 나에게 되찾아오고, 나와 우리 사이의 조작된 경계를 알려주는 철학적 사유의 지도가 정치철학이다. 그런 정치철학의 지도가 탄생했다.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회원들이 함께 쓴 『현대 정치철학의 네 가지 흐름』(2019, 에디투스)이라는 책이다.
이 책은 제목대로 ‘전체주의와 독재 문제를 다룬 영역’과 ‘해체주의와 구조주의 프랑스 정치철학의 영역’, ‘차이의 정치 혹은 페미니즘 정치철학의 영역’, 그리고 ‘근대 민주주의의 세속화와 혁명정치를 다룬 영역’의 4가지 정치철학 영역을 16명의 현대 정치철학자의 논의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16명의 정치철학을 다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내부의 독재를 다룬 영역에서 칼 슈미트(Carl Schmitt, 1888~1985),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 1892~1940), 테오도르 아도르노(Theodor W. Adorno, 1903~1969),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1906~1975), ②해체와 구조의 주제를 다룬 영역에서 루이 알튀세르(Louis Pierre Althusser, 1918~1990),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1926~1984), 질 들뢰즈(Gilles Deleuze, 1925~1995), 자크 랑시에르(Jacques Ranciere, 1940~), ③기존 정의론을 비판하면서 차이의 정치를 다룬 영역에서 낸시 프레이저(Nancy Fraser, 1947~), 마사 누스바움(Martha Nussbaum, 1947~), 아이리스 매리언 영(Iris Marion Young, 1949~2006),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 1956~), 마지막으로 ④근대성을 해부하여 민주주의의 속살을 벗겨내는 영역으로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 1929~),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 1931~),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 1942~), 슬라보예 지젝(Slavoj Zizek, 1949~)까지, 이렇게 모두 정치철학의 16가지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이들의 담론은 198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철학만이 아니라 사회학, 정치학, 매체학, 미학과 문학 및 예술분야를 포함한 한국 지식사회 전체에서 격렬히 논쟁되는 것들이다. 이 책에서 다루는 16명의 국내 번역서가 무려 300종이 넘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들의 논의가 한국 지성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평자도 현대 정치철학의 담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너무 전문적이고 방대해서 그동안 전체 맥락을 따라갈 수가 없었다. 그런데 2019년에 출간된 책, 『현대 정치철학의 네 가지 흐름』을 읽으면서 전공자가 아닌 일반인도 ‘현대 정치철학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16명 정치철학자들의 논점을 이 책의 순서대로 요약하고 정리하는 방식으로 리뷰를 시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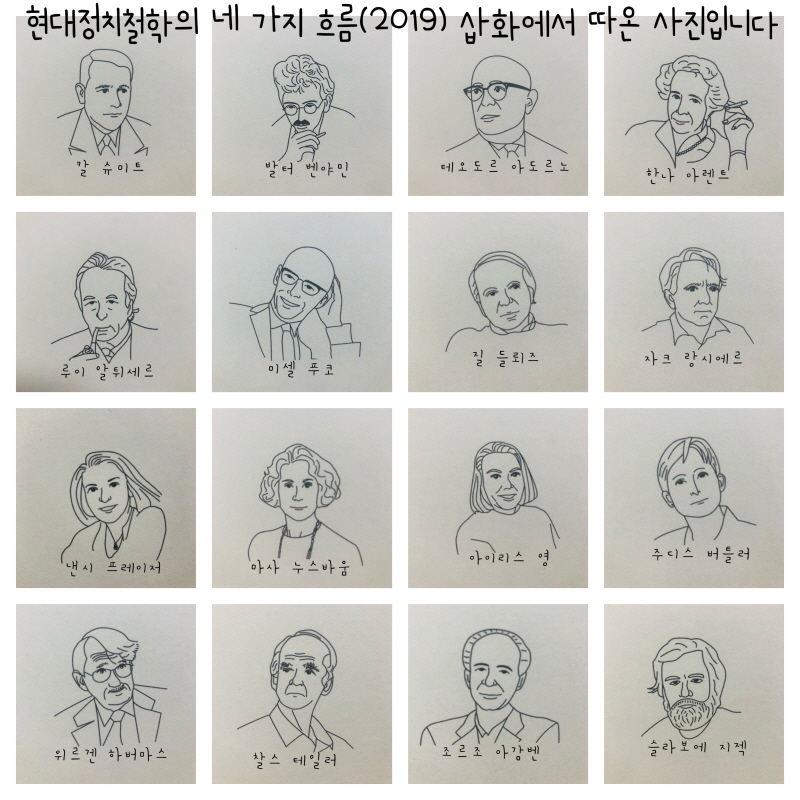
첫 번째 흐름 : 전체주의에 대한 철학적 반성
 <칼 슈미트>첫 번째 전체주의를 비판하는 1부의 시작은 전체주의를 옹호하고 나치를 정당화했던 칼 슈미트(1888~1985)의 정치철학이다. 슈미트 이론 안에는 민주주의의 붕괴선이 노출되어 있는데, 거꾸로 말해서 슈미트의 위험한 정치철학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약점과 함정을 피하고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이론분석에 의미를 두었다고 필자 남기호는 말한다.
<칼 슈미트>첫 번째 전체주의를 비판하는 1부의 시작은 전체주의를 옹호하고 나치를 정당화했던 칼 슈미트(1888~1985)의 정치철학이다. 슈미트 이론 안에는 민주주의의 붕괴선이 노출되어 있는데, 거꾸로 말해서 슈미트의 위험한 정치철학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약점과 함정을 피하고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이론분석에 의미를 두었다고 필자 남기호는 말한다.
칼 슈미트의 전체주의 이론은 쉽게 말해서 말 많고 겁 많은 의회제도 대신에 일인 통치자 중심으로 강력하게 국가를 끌고 가는 총통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데 있다. 한국 정치에서는 이미 박정희 미신 덕에 익숙해진 내용인데, 이 글을 읽으니 왜 전체주의가 되살아나는지 명쾌하게 이해되었다. 군주제에서 벗어나는 민주주의는 민족, 인민 등 이종적 대중들 사이에서 투쟁이 일어나는 각축장으로 표현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의회의 당파성으로 인해 협동적인 정치화합은 불가능하다고 슈미트는 단언했다. 민주주의가 자유주의로 동일시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의회주의를 이합집산의 자유주의 소산물로 보는 것이 슈미트 관점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합집산의 의회주의 대신에 사회의 자기 조직화로서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 이것이 슈미트가 설계하던 잠재적 전체주의 국가 모습이다.(27~28쪽) 나아가 민주주의에서 선거에 패배한 쪽은 배제되는데, 불평등으로 보이는 이런 현상의 실제는 민주주의가 자유주의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슈미트는 말한다. 이제 이러한 자유주의 이합집산을 막는 유일한 길이 파시즘이며 파시즘이 실질적 민주주의라는 칼 슈미트의 궤변이 시작된다. 20세기형 전체국가를 꿈꾸던 슈미트는 나치를 정당화하고 환호와 갈채를 독재자를 찬양한다. 슈미트의 오도된 민주정치 의식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안에 숨겨져 있을 수도 있는 전체주의 괴물을 경계하고 붕괴시켜야 한다고 필자 남기호는 강하게 말한다.
 <벤야민> 문화학자이면서 정치철학자인 벤야민(1892~1940)은 그의 유명한 저술,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1936)에서 세계변혁의 도구로 영화를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만큼 매체와 예술에 대한 벤야민의 혜안은 철학만이 아니라 대중문화와 예술 부문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을 주었다.(40쪽) 소비에트 스탈린과 독일 파시즘의 결탁으로 위기에 맞은 벤야민은 예술과 대중문화의 장르에 급진적 해방의 밑그림을 입혔다. 벤야민의 박사학위 주제였던 낭만주의 예술과 그 비평은 시와 사유의 결합이며 시인과 철학자의 결합이었다. 시가 미의 이념을 구현한 것이라면 철학은 구현된 미의 이념을 해명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예술이 철학보다 우위에 있다고 말한다.(52쪽) 영화를 예로 들어보자. 연극은 관객이 배우 안으로 빠져들지만, 영화는 상대적으로 배우와의 동일시에서 벗어남으로써 관객이 비평할 수 있는 태도가 넓어졌다. 영화의 영상은 ‘자기 자신을 연출하는’ 민중의 언어라는 벤야민의 어구는 아주 유명하다.(55쪽)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파시즘은 예술적인 자기만족을 시도한다. 이런 점에서 벤야민은 예술을 권력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경고했다. 예를 들어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이 나치 권력의 홍보용이었다는 점을 필자 박지용은 지적하고 있다.(57쪽)
<벤야민> 문화학자이면서 정치철학자인 벤야민(1892~1940)은 그의 유명한 저술,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1936)에서 세계변혁의 도구로 영화를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만큼 매체와 예술에 대한 벤야민의 혜안은 철학만이 아니라 대중문화와 예술 부문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을 주었다.(40쪽) 소비에트 스탈린과 독일 파시즘의 결탁으로 위기에 맞은 벤야민은 예술과 대중문화의 장르에 급진적 해방의 밑그림을 입혔다. 벤야민의 박사학위 주제였던 낭만주의 예술과 그 비평은 시와 사유의 결합이며 시인과 철학자의 결합이었다. 시가 미의 이념을 구현한 것이라면 철학은 구현된 미의 이념을 해명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예술이 철학보다 우위에 있다고 말한다.(52쪽) 영화를 예로 들어보자. 연극은 관객이 배우 안으로 빠져들지만, 영화는 상대적으로 배우와의 동일시에서 벗어남으로써 관객이 비평할 수 있는 태도가 넓어졌다. 영화의 영상은 ‘자기 자신을 연출하는’ 민중의 언어라는 벤야민의 어구는 아주 유명하다.(55쪽)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파시즘은 예술적인 자기만족을 시도한다. 이런 점에서 벤야민은 예술을 권력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경고했다. 예를 들어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이 나치 권력의 홍보용이었다는 점을 필자 박지용은 지적하고 있다.(57쪽)
벤야민의 <역사철학 테제>에서 보편사 이념에 기초한 진보 개념을 비판하고 혁명적 실천의 동력을 구현해야 한다고 했다. 서평자가 알기에 벤야민은 기독교적 구원론이 국가권력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신학 이론을 부정했는데, 벤야민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진보 개념은 역사적인 연속성의 노정에서 스스로 벗어났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벤야민은 당시 사민주의의 무기력함을 비판하면서도 소비에트 유물론을 거부하고 로자 룩셈부르크를 지향했다. 로자 룩셈부르크가 그렇듯이, “벤야민의 기여는 지금까지 좌절된 혁명의 이름을 다시 불러내는 데 있다”고 필자 박지용은 강조한다.(64쪽) 당대 아도르노와 브레히트 그리고 아렌트와 벤야민은 나치 히틀러를 피해 미국으로 갔다가 브레히트는 결국 당시 미국의 매카시즘 광풍에 눌려 동독에 정착했고, 벤야민은 미국행 직전에 이주가 좌절되어 약물 자살로 삶을 마쳤다. 죽음 직전의 원고에서 그가 한 말이다. “역사 유물론은 언제든지 승리한다.”
 <아도르노> 철학만이 아니라 사회학과 미학 그리고 음악에까지 학문적 업적을 남긴 아도르노(1903~1969)는 히틀러 정권을 피해 1938년 미국으로 이주했다가 1953년 프랑크푸르트대학의 교수로 귀환했다. 미국 시기 호르크하이머와 함께 저술한 『계몽의 변증법』은 미국 거주 시기에 받은 음악에 대한 문화적 충격과 미국 실증주의의 양면성들, 그리고 미국 시기 이전 루카치와 벤야민 등과 교류한 학문적 성찰을 담고 있다. 이러한 아도르노의 활동은 68혁명의 이론적 배경에 영향을 끼쳤다.(68~69쪽) 20세기 두 차례의 전쟁, 파시즘의 등장, 폭력적 독재 만연 등의 이유를 “계몽의 자기파괴” 혹은 “신화로 퇴보하는 계몽”에 있다고 진단한 것이 아도르노 『계몽의 변증법』의 요체이다. 계몽의 대상이 되어야 할 신화이지만 그 계몽 자체가 신화로 빠지는 역설, 변증법적 역설을 다룬다. 계몽이 추구하는 지식이 오히려 권력의 수단으로 되는 역설을 말한다. 계몽은 주체를 필요로 하는데 그 주체가 소멸하는 것이다. 전체주의가 보여준 야만성이란 합리적 주체라고 하는 계몽의 주체가 오히려 신화의 주인공으로 타락한 것이라고 해명한다.(68~71쪽)
<아도르노> 철학만이 아니라 사회학과 미학 그리고 음악에까지 학문적 업적을 남긴 아도르노(1903~1969)는 히틀러 정권을 피해 1938년 미국으로 이주했다가 1953년 프랑크푸르트대학의 교수로 귀환했다. 미국 시기 호르크하이머와 함께 저술한 『계몽의 변증법』은 미국 거주 시기에 받은 음악에 대한 문화적 충격과 미국 실증주의의 양면성들, 그리고 미국 시기 이전 루카치와 벤야민 등과 교류한 학문적 성찰을 담고 있다. 이러한 아도르노의 활동은 68혁명의 이론적 배경에 영향을 끼쳤다.(68~69쪽) 20세기 두 차례의 전쟁, 파시즘의 등장, 폭력적 독재 만연 등의 이유를 “계몽의 자기파괴” 혹은 “신화로 퇴보하는 계몽”에 있다고 진단한 것이 아도르노 『계몽의 변증법』의 요체이다. 계몽의 대상이 되어야 할 신화이지만 그 계몽 자체가 신화로 빠지는 역설, 변증법적 역설을 다룬다. 계몽이 추구하는 지식이 오히려 권력의 수단으로 되는 역설을 말한다. 계몽은 주체를 필요로 하는데 그 주체가 소멸하는 것이다. 전체주의가 보여준 야만성이란 합리적 주체라고 하는 계몽의 주체가 오히려 신화의 주인공으로 타락한 것이라고 해명한다.(68~71쪽)
전체성이란 자기동일성을 지키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타자를 배제하고 억압하는 시스템이다. 동일성을 지키는 주체는 편집증 환자가 된다는데, 즉 자신의 체계에서 벗어나는 것, 동일하지 않은 것에 대해 광기와 공포를 표출한다는 것을 필자 한상원은 편집증이라고 절묘하게 표현했다.(79쪽) 독재 권력의 전체주의로 인해 주체가 퇴보되고 있으면서 동시에 개인의 자유를 최고가치로 내세우는 자유주의에 기반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대중은 동일하고 규격화된 삶의 형식으로 빠지게 된다고 아도르노는 진단했다.(80쪽) ‘가상에 빠진 자유’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했다. 당과 계급이라는 교조화된 맑스주의 대신에 개인의 고유한 사람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사회적 해방이 아도르노가 찾아가는 또 다른 길이었다. 이를 한상원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자유주의적 개인주의가 개인을 무장해제 시킨 자리에는 곧바로 순응하는 군중이 출현하며, 이는 전체주의적인 지배의 위험으로 이어졌다.”(83쪽)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한국사회의 모습을 스케치하고 있는 듯하다.
 <아렌트> 1941년 미국으로 옮긴 후, 1959년 프린스턴대학 교수가 된 아렌트(1906~1975)는 저서 『인간의 조건』(1959)에서 인간 활동의 세 가지 기반은 노동(labor), 작업(work), 행위(action)라고 했다. 여기서 노동은 생물학적 충족을 위한 생산이며, 작업은 세속화된 물질세계를 만들면서 자연적인 것을 문화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며, 행위는 말을 통해서 정치적 관계를 풀어가려는 공공적 교환이다. 노동과 작업의 생산 관계가 행위의 정치 행위를 지배하는 틀에서 탈출하는 일이 바로 인간의 조건이라고 표현했다. 정치 행위가 배제되고 소통을 위한 아고라의 공적 영역이 무시되는 욕망 지배의 문화에서 벗어나 다양한 복층의 소통문화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유명한 아렌트의 “차이의 정치”이다.(101쪽) 차이의 정치를 보장하는 정치적 삶이 바로 아렌트가 말하는 비오스(bios)의 삶이다. 비오스와 대비된 조에의 삶이란 획일적이고 단수적이며 개체화된 삶이며, 기계적이고 운명의 굴레에 빠져 정치적인 삶의 황폐화에 이르는 길이다. 아렌트가 추구하는 차이의 정치는 비오스의 삶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한다.(102쪽)
<아렌트> 1941년 미국으로 옮긴 후, 1959년 프린스턴대학 교수가 된 아렌트(1906~1975)는 저서 『인간의 조건』(1959)에서 인간 활동의 세 가지 기반은 노동(labor), 작업(work), 행위(action)라고 했다. 여기서 노동은 생물학적 충족을 위한 생산이며, 작업은 세속화된 물질세계를 만들면서 자연적인 것을 문화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며, 행위는 말을 통해서 정치적 관계를 풀어가려는 공공적 교환이다. 노동과 작업의 생산 관계가 행위의 정치 행위를 지배하는 틀에서 탈출하는 일이 바로 인간의 조건이라고 표현했다. 정치 행위가 배제되고 소통을 위한 아고라의 공적 영역이 무시되는 욕망 지배의 문화에서 벗어나 다양한 복층의 소통문화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유명한 아렌트의 “차이의 정치”이다.(101쪽) 차이의 정치를 보장하는 정치적 삶이 바로 아렌트가 말하는 비오스(bios)의 삶이다. 비오스와 대비된 조에의 삶이란 획일적이고 단수적이며 개체화된 삶이며, 기계적이고 운명의 굴레에 빠져 정치적인 삶의 황폐화에 이르는 길이다. 아렌트가 추구하는 차이의 정치는 비오스의 삶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한다.(102쪽)
과거 독재정치나 전제정치는 아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합의가 파괴되고 그들만의 정당성을 합의 없이 축조하면서 그들 스스로 적법성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조작하는 정치를 아렌트는 “총체적 테러”라고 표현했다.(105쪽) 개인이 느끼지 못하고 저항할 수 없지만, 개인의 다양성이 말살된 상태이며, 이런 전체주의는 나치 이후에도 언제 어디서나 드러날 수 있다고 한다.(106) 총체적 테러를 극복하고 무작위적인 균등과 다른 진짜 평등성의 권리를 찾는 것이 차이의 정치이며, 차이의 정치는 정치적 삶과 저마다의 인권을 연결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것이 아렌트가 말하는 “권리를 가질 권리(the right to have rights)”이다.(109쪽) 정치와 인권이 연결되어야만 구성원 사이의 다양성이 보장된 공동체에서 나의 인권이 성취될 수 있다. 필자 조배준에 의하면 개인의 권리를 빼앗기고 소통이 차단되어 사회적 합의가 강압적인 그런 정치 권력은 정치 행위의 종말이며 정치의 붕괴를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평등은 공동체 안에서 실현 가능함을 아렌트는 강조한다. 평등은 주어진 것이 아니며, 우리는 평등하게 태어난 것도 아니라고 한다. 평등은 정치 활동을 통해 정의 원칙을 실천하려는 노력의 결실이다. 평등은 정치공동체 안에서 실현될 수 있다. 공동체를 무시한 개인의 균등성은 전체주의에 예속화된 삶의 결과일 수 있다.(110쪽) 2010년 이후 극심해진 양극화, 정치에 대한 냉소주의, 만연된 혐오 문화 등의 사회적 병리는 제도권 정치 수준에서 해결되지 못한다. 아렌트의 공동체 평등주의, 총체적 테러에 대한 붕괴와 방어의 노력, 정치적 다양성이 보장되는 합의 공간을 구현하려는 구체적인 실천이 바로 그런 한국의 사회적 문제를 푸는 열쇠일 것이라고 필자 조배준은 말한다.(113쪽)
두 번째 흐름: 1968 전후의 프랑스 정치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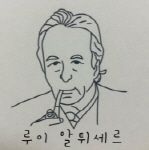 <알튀세르> 알튀세르(1918~1990)의 두 작품, 『맑스를 위하여』(1965)와 『자본을 읽자』(1965)는 최고의 맑스 해석서이면서 동시에 맑스를 철저히 해부하여 혁신시킨 정치철학의 깃발이다. 알튀세르를 맑스주의자이면서 맑스주의 비판자라고 한다. 예를 들어 맑스주의가 지닌 경제결정론과 역사목적론을 알튀세르는 거부했기 때문이다. 알튀세르는 하나의 사건이 역사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이 이미 역사적인 형식들, 즉 ‘최종심급’으로서 경제적 필연성 말고 그 어떤 것도 아닌 형식들 속에 삽입되어야만 한다고 말한다.(138쪽)
<알튀세르> 알튀세르(1918~1990)의 두 작품, 『맑스를 위하여』(1965)와 『자본을 읽자』(1965)는 최고의 맑스 해석서이면서 동시에 맑스를 철저히 해부하여 혁신시킨 정치철학의 깃발이다. 알튀세르를 맑스주의자이면서 맑스주의 비판자라고 한다. 예를 들어 맑스주의가 지닌 경제결정론과 역사목적론을 알튀세르는 거부했기 때문이다. 알튀세르는 하나의 사건이 역사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이 이미 역사적인 형식들, 즉 ‘최종심급’으로서 경제적 필연성 말고 그 어떤 것도 아닌 형식들 속에 삽입되어야만 한다고 말한다.(138쪽)
알튀세르는 군대, 경찰이나 법원 같은 억압적 국가장치가 아닌 또 다른 억압으로서 이데올로기 국가장치(ISA)를 묘사한다. 이데올로기 장치로서 종교, 교육, 정치, 노동조합, 커뮤니케이션, 문화 등이 존재한다. 이데올로기도 재생산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데올로기 재생산을 위한 투쟁은 완성될 수 없으며, 바로 그것 때문에 연이은 투쟁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152쪽) 여기서 ‘투쟁이 완성될 수 없다’는 말은 투쟁의 강도를 의미한다기보다는 투쟁의 목적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목적론과 결정론을 거부하나 여전히 최종심급이라는 또 다른 방식의 결정적인 기본 토대를 지향하는 알튀세르의 반(反)목적론 맑스주의를 표현하는 듯하다. 필자 최원은 최종심급의 끝에 미래만이 남는다고 표현했다.(154쪽)
 <푸코> 푸코(1926~1984)의 권력 개념은 푸코 정치철학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입구이다. 권력은 타자를 그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복종시키는 힘이다. 권력은 인격적이거나 거시적이거나 억압력으로 설명되지만은 않는다. 권력은 모세혈관처럼 보이지 않는 망을 이루며 우리 주변의 여기저기에 퍼져있다. 이를 보여주는 푸코의 지도가 ‘계보학’이다. 푸코가 나누고자 했던 지식은 광기, 병원, 감옥, 성이었으며, 그런 개념 위에서 그의 정치철학의 뼈대가 형성되었다. 필자 박민미는 푸코 철학 사유의 뼈대를 아주 쉽고 눈에 확 들어오도록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방법론에 있어서는 고고학과 계보학이 푸코의 핵심어이며, 사상의 핵심어는 권력/지식, 미시권력, 규율권력, 생명권력이다. 최근 주목받는 그의 핵심어는 통치성이다.”(162쪽) 주체의 형성사를 발굴하고 문제로 재구성하는 연구를 “역사적 재구성”이라고 했다. 역사적 재구성은 개인이 삶의 주체로 되어가는 흐름을 다루는 고고학, 권력에 종속되어가는 흐름을 다루는 계보학, 도덕 주체로 되어가는 개인을 다루는 윤리학이다.(162쪽)
<푸코> 푸코(1926~1984)의 권력 개념은 푸코 정치철학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입구이다. 권력은 타자를 그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복종시키는 힘이다. 권력은 인격적이거나 거시적이거나 억압력으로 설명되지만은 않는다. 권력은 모세혈관처럼 보이지 않는 망을 이루며 우리 주변의 여기저기에 퍼져있다. 이를 보여주는 푸코의 지도가 ‘계보학’이다. 푸코가 나누고자 했던 지식은 광기, 병원, 감옥, 성이었으며, 그런 개념 위에서 그의 정치철학의 뼈대가 형성되었다. 필자 박민미는 푸코 철학 사유의 뼈대를 아주 쉽고 눈에 확 들어오도록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방법론에 있어서는 고고학과 계보학이 푸코의 핵심어이며, 사상의 핵심어는 권력/지식, 미시권력, 규율권력, 생명권력이다. 최근 주목받는 그의 핵심어는 통치성이다.”(162쪽) 주체의 형성사를 발굴하고 문제로 재구성하는 연구를 “역사적 재구성”이라고 했다. 역사적 재구성은 개인이 삶의 주체로 되어가는 흐름을 다루는 고고학, 권력에 종속되어가는 흐름을 다루는 계보학, 도덕 주체로 되어가는 개인을 다루는 윤리학이다.(162쪽)
세상의 사물과 관계를 경계 지우는 경계선이 권력인데, 사회가 그어놓은 금기의 경계선에 도전하는 것이 푸코 정치철학의 기초이다. 푸코는 스스로 지식의 권력부터 거부한다. 지식은 권력을 떠날 수 없으며, 권력은 지식을 생산한다. 지식은 권력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이다. 푸코가 말하는 권력은 특정 권력이 아니라 사회조직을 구성하는 관계 전체를 말한다. 권력은 실제로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집단을 권력 안에 머물도록 강제화하는 보이지 않는 효과를 가진다. 권력은 대상화된 실체가 아니라 일종의 효과이다. 이를 권력효과라고 한다. 한편 권력은 저항을 산출한다. 이 점에서 권력과 저항은 역설적인 상호관계론으로 작동한다. 보이지 않는 권력효과의 위험성을 투시하고 투쟁하는 것이 진정한 지식인의 역할이라고 한다.(164쪽) 권력망을 투시하고 자신의 삶을 부단히 창안하는 자유를 동력으로 삼아 사회가 보이지 않게 쳐놓은 금기의 선을 ‘감히 넘어서 보라’(173쪽)는 필자 박민미의 말을 항상 기억해야겠다.
 <들뢰즈> 들뢰즈(1925~1995)의 철학에서 좌파는 소수자이다. 백인, 기독교인, 남성은 다수이며 인간을 정의하는 표준이라고 자부하는데, 그러면서 이 세상에는 표준에 들지 못하는 주변인의 소외가 늘어난다. 들뢰즈는 표준을 거부하고 소수자에게서 새로운 생성의 힘을 발견한다. 표준에 속하는 집단은 상대적으로 자신의 표준성에 안착하여 변화에 대한 의지나 욕구가 사라진다. 반면 소수자는 생성과 변화를 능동적으로 발휘한다. 들뢰즈는 유명한 카프카의 사례를 든다. 땅속줄기(뿌리)는 리좀이며, 자신은 땅속에 있지만 다른 것에 연결되어 그 다른 것을 활용하여 에너지와 힘을 생산하고 제공한다. 다양체로 번역되는 리좀은 더 위를 향해 생성의 지도를 그린다.(180쪽)
<들뢰즈> 들뢰즈(1925~1995)의 철학에서 좌파는 소수자이다. 백인, 기독교인, 남성은 다수이며 인간을 정의하는 표준이라고 자부하는데, 그러면서 이 세상에는 표준에 들지 못하는 주변인의 소외가 늘어난다. 들뢰즈는 표준을 거부하고 소수자에게서 새로운 생성의 힘을 발견한다. 표준에 속하는 집단은 상대적으로 자신의 표준성에 안착하여 변화에 대한 의지나 욕구가 사라진다. 반면 소수자는 생성과 변화를 능동적으로 발휘한다. 들뢰즈는 유명한 카프카의 사례를 든다. 땅속줄기(뿌리)는 리좀이며, 자신은 땅속에 있지만 다른 것에 연결되어 그 다른 것을 활용하여 에너지와 힘을 생산하고 제공한다. 다양체로 번역되는 리좀은 더 위를 향해 생성의 지도를 그린다.(180쪽)
개인의 주체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다른 세상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정체된 실체가 아니다. 주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들뢰즈는 주름에 비교한 것으로 유명하다. 주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여러 사회적 관계가 서로 주름을 안으로 접으면서 내부성을 만들면서 ‘되어가는’ 과정이 인간의 주체화다. 이차원의 평평한 밀가루 반죽을 접으면 그때 비로소 안으로 접힌 면을 우리는 내부라고 부르고, 밖으로 젖혀진 면을 외부 표면이라고 부를 뿐이지, 원래는 다 같은 평평한 하나의 동일면이었다. 내부는 안으로 접혀 들어온 외부 표면에 지나지 않는다. 주름이 안으로 접힌 밖인 것처럼 말이다. 밖을 경험하면서 밖의 경험들이 안으로 차곡차곡 혹은 어지럽게 접혀 여전히 밖의 표면이지만 마치 안처럼 내부화된 것이 바로 인간의 주체화라고 들뢰즈는 설명한다.(182쪽) 주체는 동일성에 의해 보장된다는 전통적인 철학을 넘어서 있는 것이 들뢰즈 철학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내재화된 주체에서부터 벗어나는 길과 주체의 동일성에서 탈출하는 길은 같지 않다고 한다. 주체를 넘어서기 위해서 주체 안에 차이가 있음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이는 다른 것과 비교해서 만든 차이가 아니라 주름의 뒤집힌 껍질이며, 밖이 있기에 가능한 변화의 주체이다. 변화의 주체란 주체가 변한다는 뜻이기보다는 변화 자체를 품고 있는 주체이다. 그래서 기존 관념으로 본 주체와는 전혀 다르다. 이런 차이가 행위의 조건이며 내적인 힘으로 형성되는 사건의 도래라고 필자 김범수는 설명한다.(188~190쪽)
차이의 내재화를 잘 보여주는 것이 들뢰즈의 욕망이론이다. 들뢰즈가 말하는 욕망은 나 자신에게, 내 가족에게, 혹은 내 국가에 결핍된 무엇을 채우려는 목적의지와 다르다. 목적 없이 욕망 자체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욕망인데, 들뢰즈는 이를 욕망하는 기계라고 표현했다. 개인에 얽매이지 않은 욕망은 그 자체로 혁명적이며 생산적이라고 필자 김범수는 말한다. 이렇게 욕망은 내재 된 차이의 변화하는 힘과 소수자만이 누리는 생성의 힘을 결합한다. 표준권력을 쥐고 있는 권력효과에서 탈출하기 위해 욕망을 동일성의 주체로부터 걷어내도록 하는 일이 들뢰즈 정치철학의 과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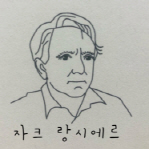 <랑시에르> 경직화된 이데올로기로 변한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인민 스스로의 통치’라는 의미를 이미 상실했다. 민주주의의 원래 의미를 되찾기 위해 평등의 정치가 구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치안’으로 전락한 현 제도의 정치체계, 즉 “감각적인 것을 분할 하는 체계”를 강하게 비판하는 것이 랑시에르 정치철학의 핵심이다. 이렇게 정치 개념과 치안 개념을 구분하면서 랑시에르의 정치철학이 전개된다.(198~199쪽) 1990년대 후반부터 자신이 제안한 ‘감각적인 것의 부활’ 개념을 미학에 적용하여 미학의 정치성을 부각했다. 이 시기 랑시에르는 알튀세르의 엘리트주의를 비판하면서 그와 결별했다. 계몽과 지도의 노력 없이도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해방될 수 있다고 필자 조은평은 랑시에르의 철학적 방법론을 쉽게 설명해주고 있다.(206쪽) 이 점에서 랑시에르와 양명학을 비교하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랑시에르> 경직화된 이데올로기로 변한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인민 스스로의 통치’라는 의미를 이미 상실했다. 민주주의의 원래 의미를 되찾기 위해 평등의 정치가 구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치안’으로 전락한 현 제도의 정치체계, 즉 “감각적인 것을 분할 하는 체계”를 강하게 비판하는 것이 랑시에르 정치철학의 핵심이다. 이렇게 정치 개념과 치안 개념을 구분하면서 랑시에르의 정치철학이 전개된다.(198~199쪽) 1990년대 후반부터 자신이 제안한 ‘감각적인 것의 부활’ 개념을 미학에 적용하여 미학의 정치성을 부각했다. 이 시기 랑시에르는 알튀세르의 엘리트주의를 비판하면서 그와 결별했다. 계몽과 지도의 노력 없이도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해방될 수 있다고 필자 조은평은 랑시에르의 철학적 방법론을 쉽게 설명해주고 있다.(206쪽) 이 점에서 랑시에르와 양명학을 비교하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랑시에르에 의하면 개인의 성향과 소질이 다르다는 것은 개인 간의 차이를 보여줄 뿐이지 결코 지적 능력이 불평등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207쪽) 그러나 세상은 무지한 자와 유식한 자를 구분하고 있다. “자기 무시의 늪”은 지식인에게도 두 가지 경고를 던진다. 그 하나는 지식인끼리 서로 지식의 우위를 따지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지식인이라는 자기 오만에 빠져 자신의 지적 능력을 뽐내는 경우이다.(208쪽) 랑시에르의 표현대로 “무지한 스승”에서 탈출하여 계몽과 지도 대신에 무지한 삶에서 스스로 해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지적으로 평등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해방의 의미이며,(208쪽) 이런 해방의 평등정치가 랑시에르 정치철학의 기초라고 필자 조은평은 설명한다.(201쪽)
정치공동체란 각 계급이 기여한 합리적 몫에 따라 권력을 분배하도록 합의하는 공동체라고 알고 있다. 이런 정치공동체에는 불화가 없을 듯 보이지만, 랑시에르가 보기에 몫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인민들은 자신의 몫을 찾지 못하는 불평등이 생긴다. 여기서 계급투쟁이 생기고 공동체 질서도 깨진다. 권력자는 이런 사람들을 공동체를 방해하는 자들로 여긴다. 여기서 유한계급층은 그런 방해자를 제어하는 치안(police)의 정치만을 필요로 한다고 랑시에르는 지적했다. 랑시에르는 이런 불평등을 “감각적인 것을 분할하는 체제”라고 표현했다.(215쪽) 평등을 되찾는 것이 정치이며 민주주의라고 랑시에르는 말한다.(217쪽)
(2부)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