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대에 대하여』를 환대하는 한 가지 방식 [철학자의 서재]
『환대에 대하여』를 환대하는 한 가지 방식
자크 데리다, 『환대에 대하여』(남수인 옮김)
환대에 대하여, 책의 제목부터 문제적이다. 왜냐면. 우리는 사실 누군가를 환대하는 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IMF 이후라고 할까, 신자유주의 이후라고 해야 할까. 무한 경쟁, 성과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후유증인지도 모르겠다. 모두가 서로에게 잠재적 ‘적’이다. 나는 저 친구보다 우월한 스펙을 쌓아야 하며, 회사에서는 동료보다 높은 실적을 올려야 한다. 이러한 사회는 동료도 난민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주노동자도 내 일자리를 ‘빼앗는’ 사람들일 뿐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내가 주인이고 그들은 이방인이고 타자일까. 데리다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질문한다. 어쩌면 태초에 어머니의 품에서 떠나온 우리는 모두가 이 지구의 이방인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데리다에 따르면 이방인은 질문하는 자이고 부성(父性) 로고스를 뒤흔드는 자(p. 58)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방인에게 적대적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 언제나 친구를 기다리고 손님을 기다린다. 휴대폰에 문자나 전화 한통 와 있지 않은 어느 날의 음울함에 대해 생각해보라. 나는 왜 나를 침입할지도 모르는 이방인, 타자 혹은 친구를 기다리는 걸까. 내가 사회적으로 소용되지 않고 다른 누군가에게 필요 없는 존재라는 느낌이 들 때 자기 존재 의의를 가질 수 있을까.
내 집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나는 주인일 수 있다. 하지만 손님에게 문을 여는 순간 나의 ‘주인성’은 침해당한다. 라캉식으로 말하면 빗금쳐진 주인,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일까. 데리다는 이를 ‘주인(손님)’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 표현은 정말 이상한 개념이다(p. 83). 아마 우리가 데리다를 접할 때 느끼는 어려움의 하나일 텐데 데리다는 항상 이런 개념을 우리에게 던진다. 파르마콘도 그 중 하나다. 약이자 독이라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채 경계에 서있기, 이건 쉬운 문제는 아니다. 우리는 언제나 흑백 논리, 이분법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여자 아니면 남자 하는 식 말이다. 하지만 지구상에 인간의 성이 n개일지도 모른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하지만 이 심각성을 회피하는 것만이 능사일지는 두고 볼 일이다. 데리다는 항상 이 지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것 같다.
타자를 환대한다는 것, 나를 모두 버리고 환대할 것인가, 나를 유지하면서 환대할 것인가, 가 항상 문제다. 무조건적으로 타자를 환대하면서 나를 지킬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것은 환대인가, 환대가 아닌가.
요즘엔 인터넷, 이메일, SNS 등으로 내가 구성되는데 이때 나는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서의 나인가 아니면 외부에, 타자, 이방인에게 내 의도와 무관하게 환대하면서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나는 나이면서 ‘나 아닌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는 이런 식으로 나를 침해하고 그 국가 권력과 정치화의 권력은 확장된다(p. 90). 여기에 나의 사적 공간은 보장되는가. 국가 폭력은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p. 95).
칸트는 우리에게 거짓말 하지 말라는 절대적 명령을 했다. 이렇게 그는 우리의 사적인 권리, 비밀의 권리, 국가 권력에 저항할 권리를 파괴하고 박탈해버린다(p. 97). 칸트는 순수 도덕성의 이름으로 경찰을 아무 곳에나 들여놓았다(p. 98).
정의의 환대와 권리의 환대, 무조건적 환대와 조건적 환대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아포리아일까. 우리는 이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할까.
환대의 무조건적 법은 추상적이고 유토피아적이다. 그것은 하나의 이념과 같은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법이기 위해 법의 조건 안에 있다. 이 둘은 분리되지 않는다. 이 두 체제는 서로를 함유하며 동시에 서로를 배제한다(p. 106). 내가 주인이면서 손님이라는 논리처럼 나는 이 둘 모두를 향해 동시에 열려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건 쉬운 일은 아닐 것 같다. 나는 교사이지, 교사이자 학생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랑시에르가 ‘무지한 스승’(양창렬 역, 궁리, 2016) 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무지한 스승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관점을 달리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레비나스는 무조건적인 환대란 ‘언어를 정지’시키는 것이라 했다(p. 141). 일상어의 정지, 는 새로운 언어를 불러들일지 모른다. 그것은 시적 언어이고, 철학적 언어이고 신조어 같은 것일 수도 있다. 새로운 언어는 기존의 관습적, 일상적 언어의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얼핏’이라도 ‘다른 세계’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언어 안에서(상징계)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조건 안에서 끊임없이 ‘무조건적’ 어떤 것을 항상 상상해야 하고 염두에 두고 ‘배려’해야 할지 모른다. 이런 입장이 데리다의 입장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읽기 쉬운 책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이방인과 타자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꺼리를 던져 주기 때문에 한번쯤 읽어봐야 할 책이다.
by 엄진희(시인, 문학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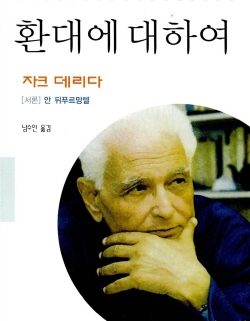

Leave a Reply
Want to join the discussion?Feel free to contrib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