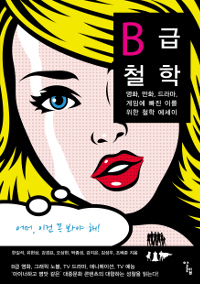B급 문화와 B급 철학 [피켓2030]
아래 글은 우리 한국철학사상연구회에서 최근 출판한 [B급 철학](알렙, 2016)을 읽고 대학교 2학년 학생이 보내온 서평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다른 측면에서 이 책에 관한 서평을 쓰고 싶으신 분들도 언제든 대환영이니 원고를 보내주시면 검토해서 게재하고 약소하지만 소정의 원고료도 드립니다.
권유리(건국대 건축학과 2학년)
2014년 1000만 관객을 이끌어낸 <겨울왕국>. 이 애니메이션에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열광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겨울왕국의 주인공 ‘엘사’와 엘사의 테마곡 ‘Let it go’는 이미 아이들에게 영웅과 다름없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아이들의 이런 공감을 이끌어 냈는가? 이처럼 질문을 갖는 것이 바로 대중문화를 제대로 마주하게 되는 첫걸음이다. 밤늦게까지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 집안일과 회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현대인들에게 주인공 ‘엘사’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부르는 ‘Let it go!’는 그들의 억압된 일상으로부터의 해방을 대신해준다. 많은 사람들은 ‘엘사’를 통해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엘사’라는 캐릭터는 [피로 사회](한병철 저)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안 되는 ‘규칙사회’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성과사회’로 전환된 사회에서 느끼는 현대인들의 단절감, 우울함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공감하며 때론 멀리 떨어진 입장에 서서 캐릭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자신도 모르게 제시한다.
정해져 있는 결말과 흔한 스토리, 한회만 봐도 앞뒤 내용까지 이해할 수 있는 드라마 <상속자들>을 보자. 안방에 앉아 동생과 보고 있자면 현실과 동떨어진 드라마 속 상황에도 분개하며 “재는 왜 저래?”, “친아빠 맞아?” 라는 말을 주고받는 것은 흔한 모습이다. 이런 단순한 질문 속에서 우리는 공자의 ‘효 사상’과 연결고리를, 또 ‘부의 추구’에 대한 연결고리를 스스로 찾아 낼 수 있을까?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되물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대중매체를 접할 때 주체가 아닌 하나의 소비자가 될 뿐이다.
일본 만화 <진격의 거인>은 기괴한 스토리와 암울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본은 물론 한국에서도 수많은 독자들을 가지고 있다. 인간을 잡아먹는 거인과 이를 막기 위해 거대한 장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정말 생존을 위해 살고 있는 만화 속 캐릭터들에게 정의와 선(善) 같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는 무시될 수밖에 없다. 언제라도 잡아먹힐 수 있다는 공포에 떠는 인간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방법은 소수들에 의한 철저한 지배이다. 비현실적이고 잔인한 설정에도 많은 사람들이 전율을 느끼며 계속해서 이 애니메이션을 찾는 이유는 일본과 한국인 속에 잠재되어있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전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 단 한가지의 목적을 위해 나아가는 주인공들의 모습은 마치 황제군의 모습으로 비추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진격의 거인>은 사람들 속에 잠재되어있는 피해의식을 자극한다.
지금과는 다르게 오랜 시간동안 문화는 대부분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 즉 부르주아 계층들만이 향유할 수 있는 것이었다. 현재는 기술, 미디어, 언론, 오락, 드라마, 영화 등의 발달로 문화는 훨씬 더 널리 보급되었고 일부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산유물이라는 타이틀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아직도 클래식과 오페라, 전통음악은 고급문화로, 소위 말하는 대중문화는 깊이가 덜한 문화로 무의식중 인식된다. 친구와 함께 카페에서 칸트의 [순수 이성비판]과 쇼펜하우어, 헤겔을 찾는다면 지적인 대화이고, 어제 저녁에 보았던 드라마를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수준 낮은 대화라고 할 수 있을까? 과연 문화에 A급과 B급으로 나눌만한 척도가 있는 것일까? 레비-스트로스에 따르면 문화는 다름의 차이일 뿐 더 우월하고, 더 낮은 문화는 없다. 오히려 대중문화는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시뮬라시옹’의 프레임으로 우리를 이끌어 다양한 공감과 동질감을 이끌어낸다. 그러나 만화와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같은 대중문화를 문화로 사유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수고가 따른다. 바로 ‘자기화’의 과정이다. 대중문화는 좁게는 자신을 넓게는 대중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 이 거울을 바로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왜?”라는 질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대중문화는 필자의 말처럼 햄버거 포장껍데기처럼 단순 소비될 수밖에 없다.
Twe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