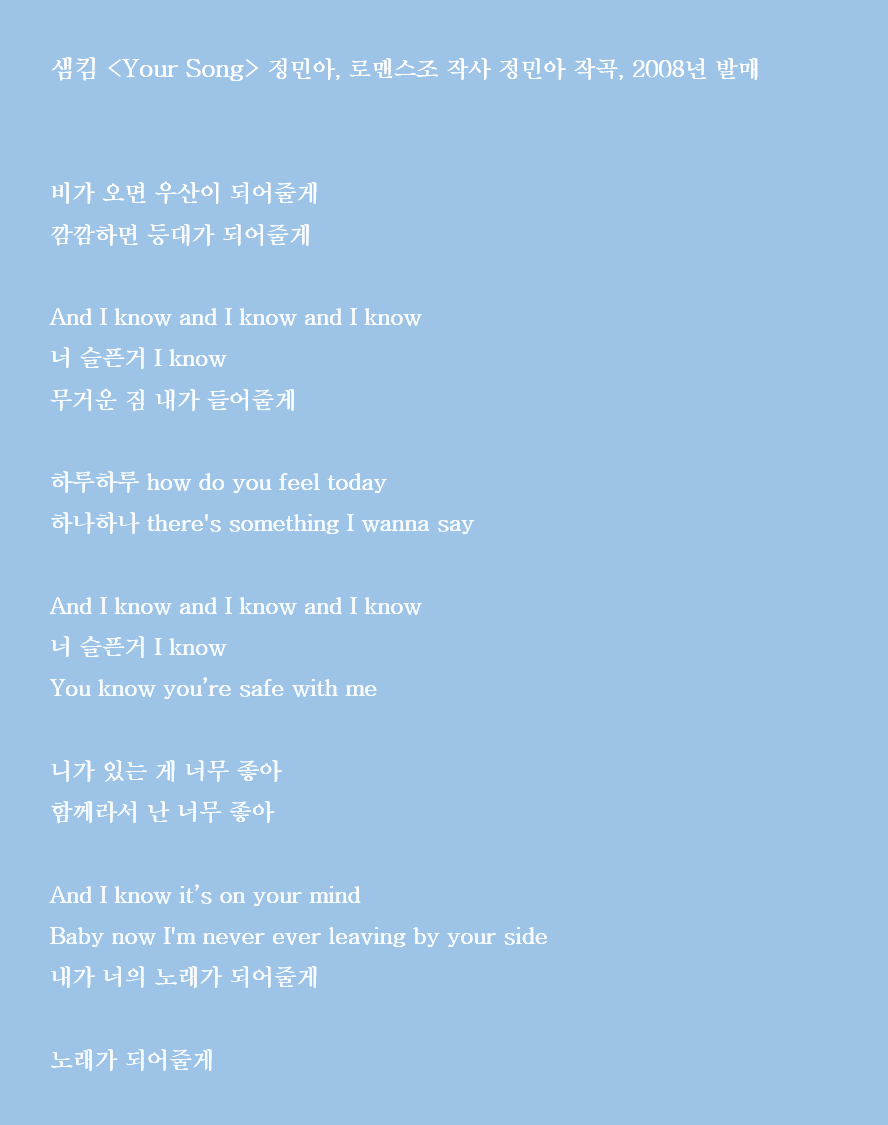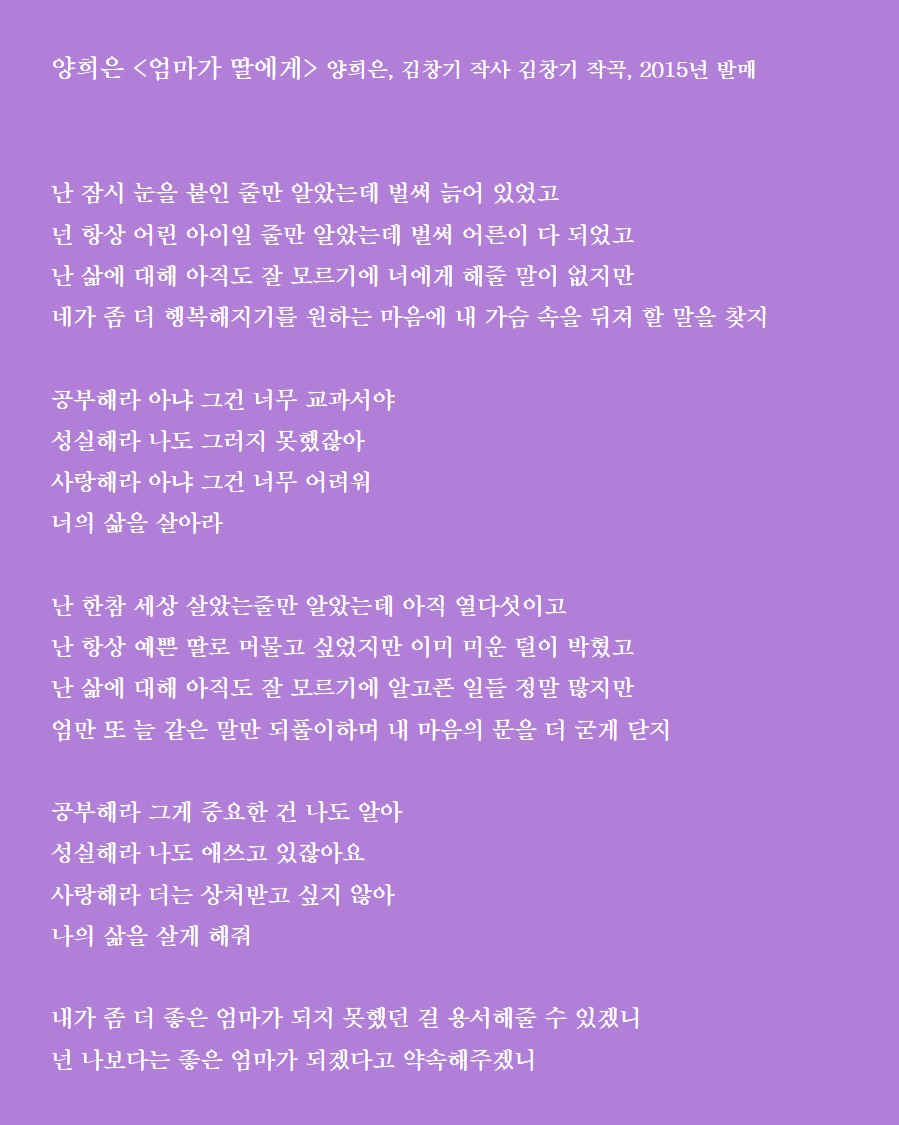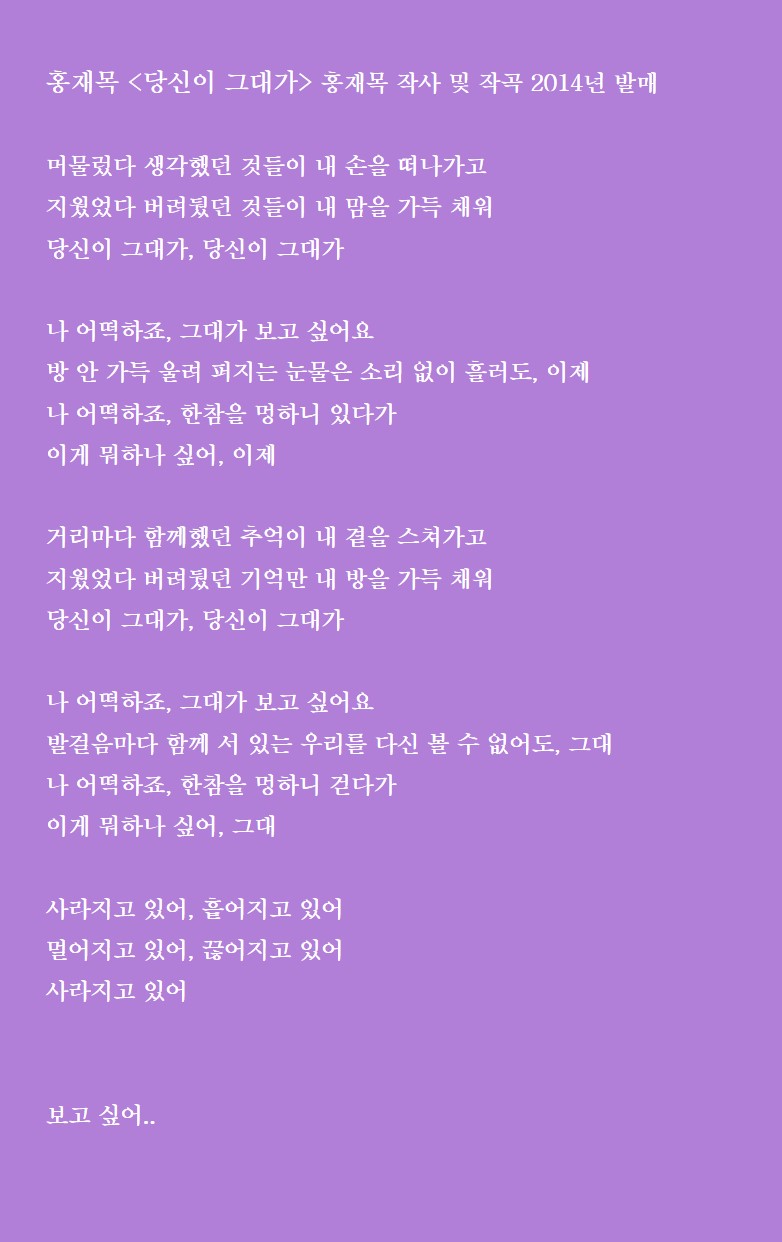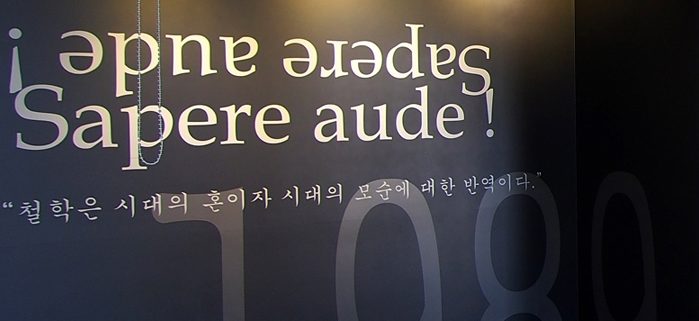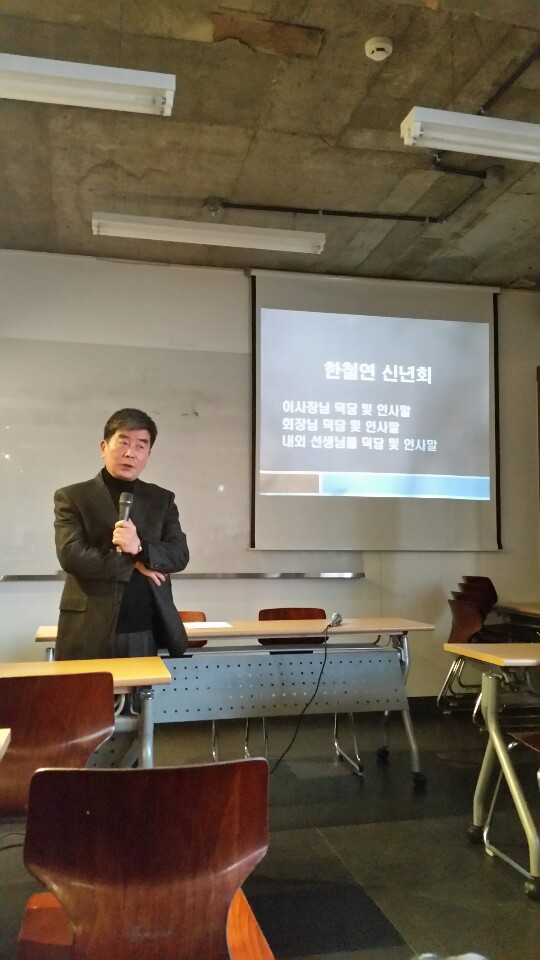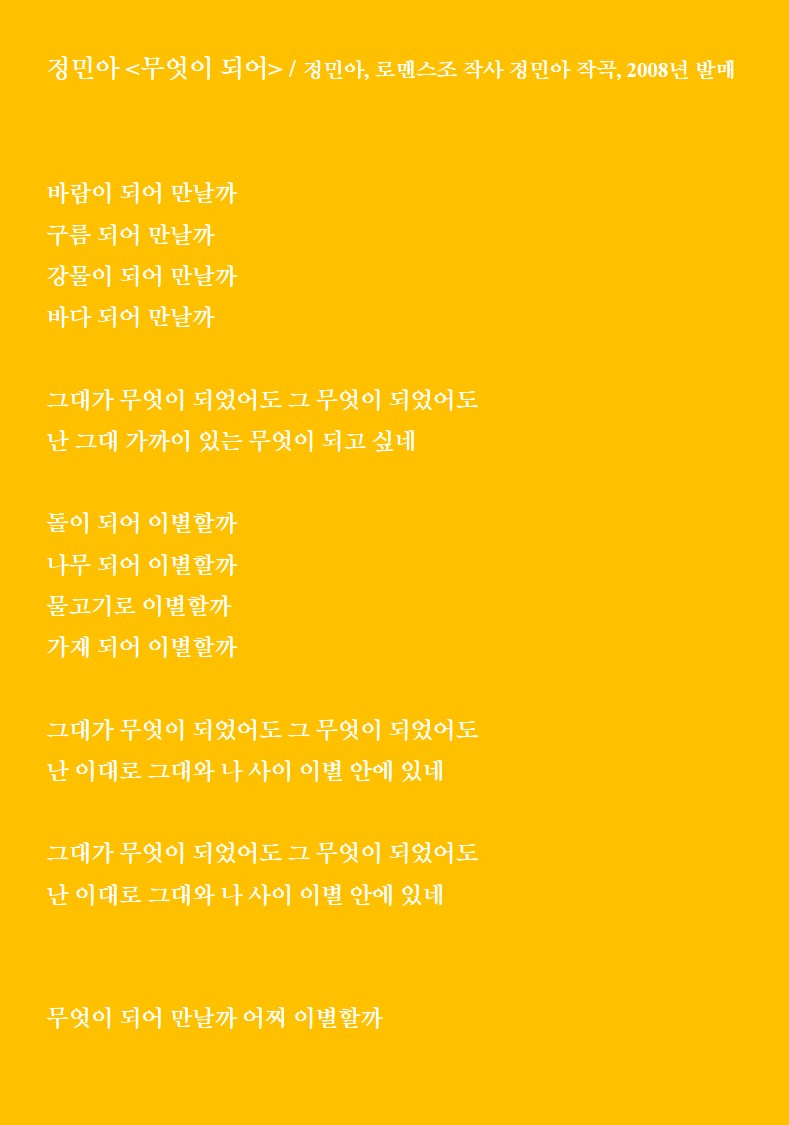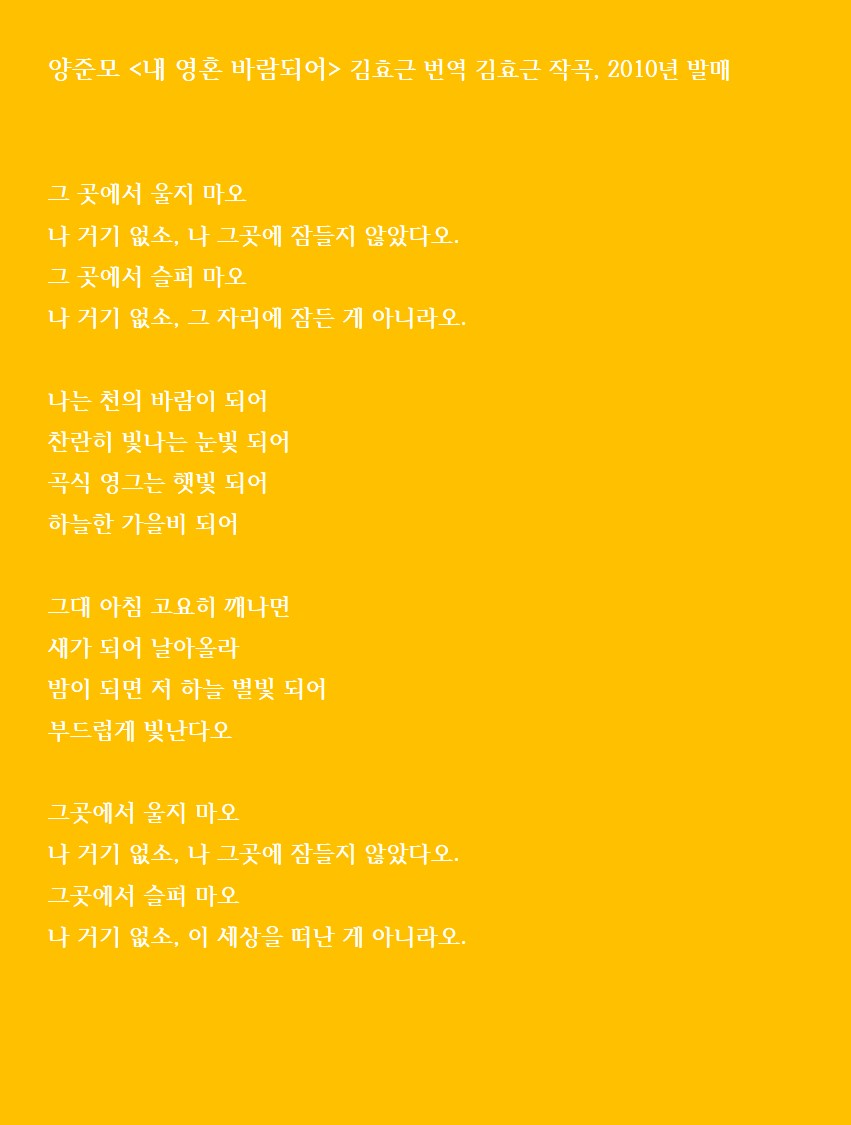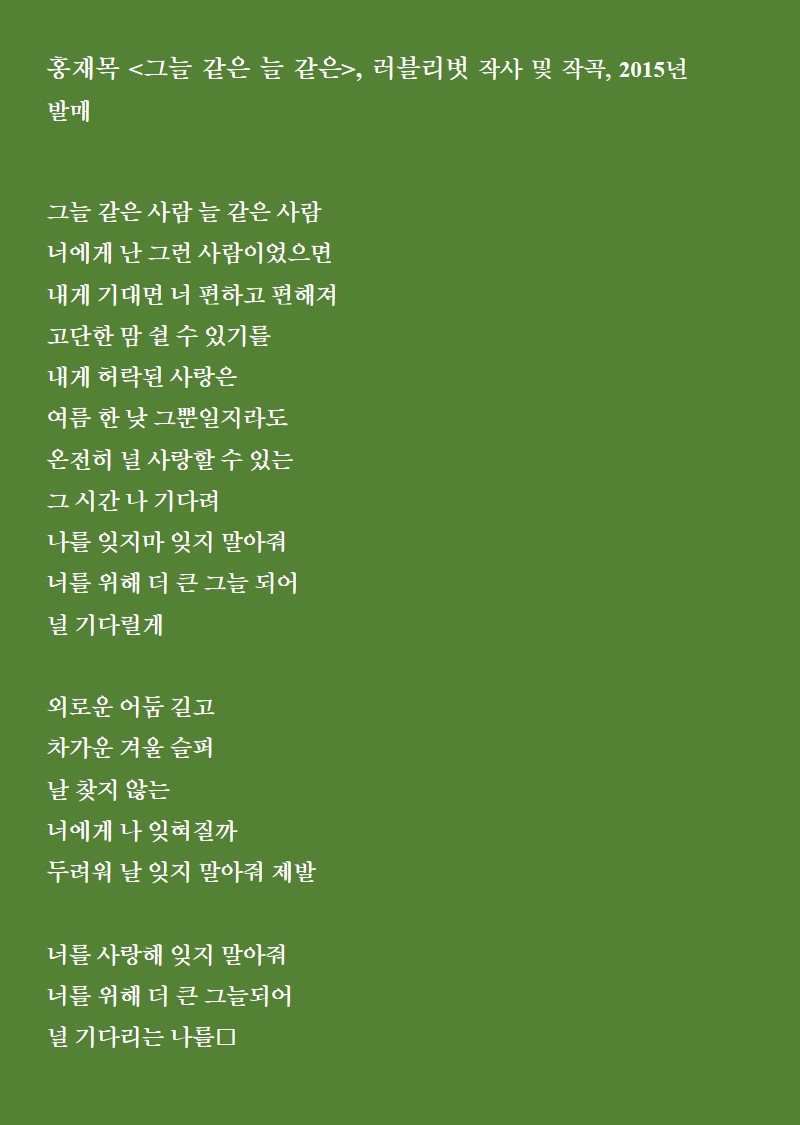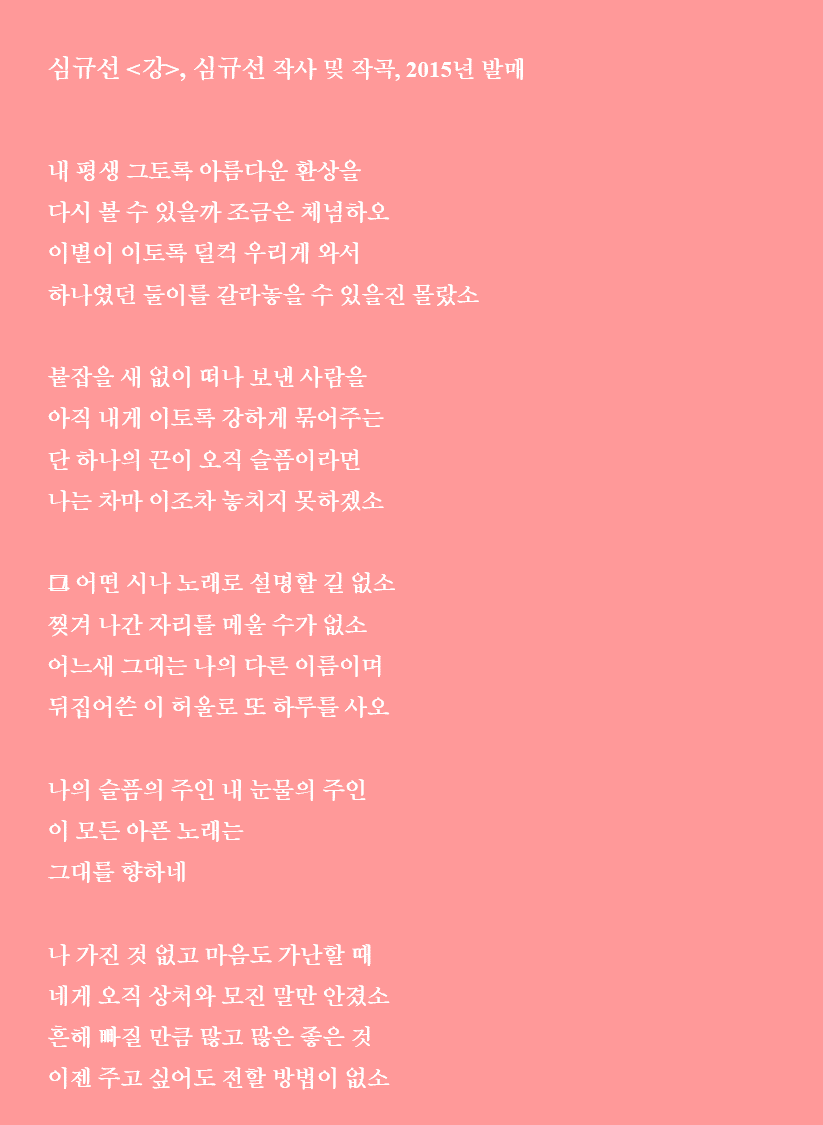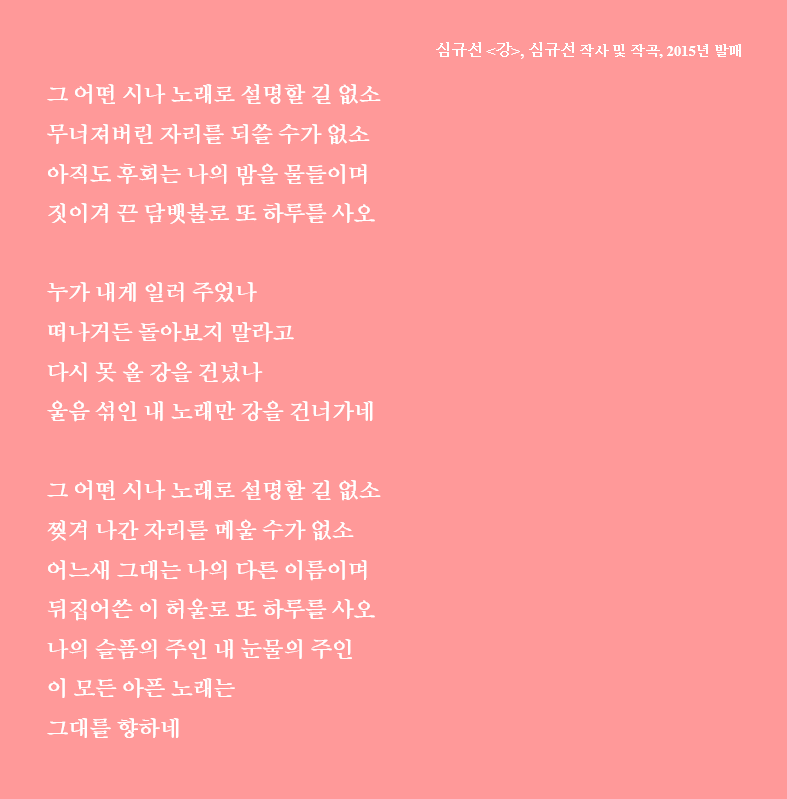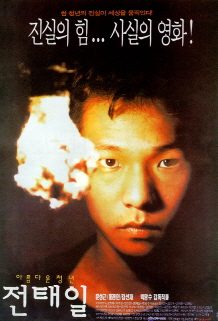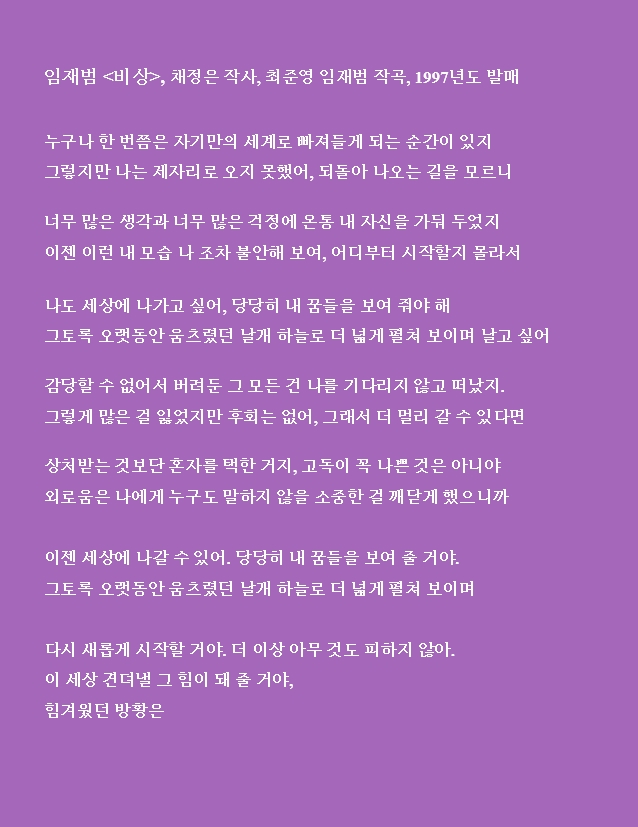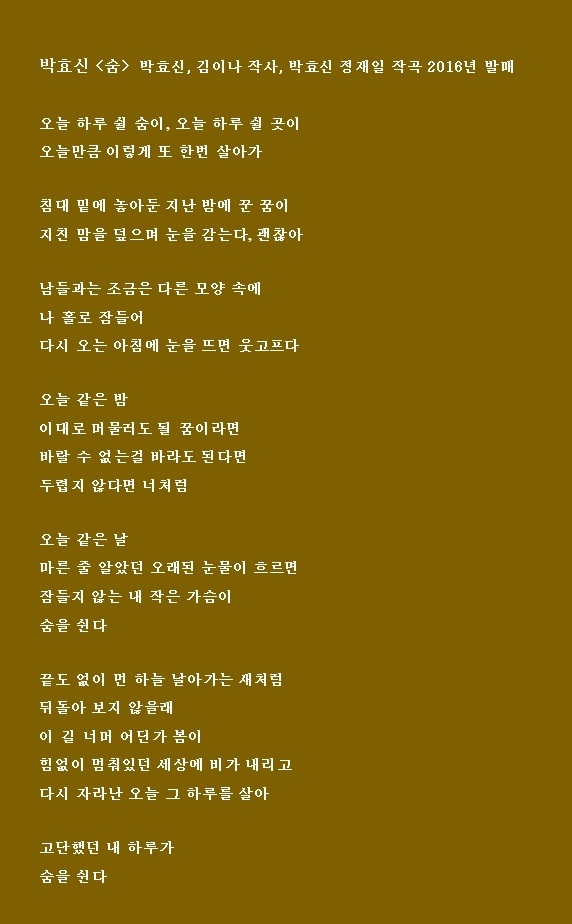플라톤의 『국가』 강해 ㊴ [이정호 교수와 함께하는 플라톤의 『국가』]
플라톤의 <국가> 강해 ㊴
1-2-1-2-1 이야기 방식과 모방(392c-398b) (계속)
[397b-398b]
* 소크라테스는 이야기 방식λέξις과 관련하여 우선 서술 방식διήγησις을 기초로 두 가지 종류의 이야기 방식으로 구분하여 논의한 후, 이제 그에 이어 그 이야기 방식을 화음(선법)ἁρμονία과 장단(리듬)ῥυθμός을 기초로 논하고자 한다. 그런데 서술방식과 마찬가지로 이야기 방식을 구성하는 선법과 리듬 또한 변화들이 작고 한 가지로 이루어지는 경우와(397b) 온갖 형태의 변화를 갖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구분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야기 방식은 서술 방식에 의해서도 두 가지로 구분되었지만 선법과 리듬에 의거해서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그래서 모든 시인은 앞서 말한 두 유형의 이야기 방식λέξις 중 전자나 후자 또는 양쪽을 혼합한συγκεραννύντες 어떤 것을 만나게 될 텐데,(397c) 이 나라에서 순수하게 훌륭한 사람ἐπιεικής ἄκρατος들이 받아들여야 할 것은 전자의 방식이지만 아이들과 이들의 교육을 돌보는 가복들 그리고 대다수 군중ὄχλος들은 반대로 후자나 혼합형이 월등하게 제일 즐거운 것이어서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한다. (397d)그러나 이 나라에는 제화공이든 농부든 전사든 각자가 한 가지 일을 하는ἕκαστος ἓν πράττει 사람들만 있으므로, 다시 말해 양면적인 사람διπλοῦς ἀνὴρ이나 다방면적인 사람πολλαπλοῦς ἀνὴρ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유형은 우리의 정체πολιτείᾳ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소크라테스는 말한다,(397e) 그리고 만일 온갖 것이 다 될 수 있고 또 온갖 것을 다 모방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나라에 없기도 하지만 생기는 것이 합당하지도 않으므로 거룩하고 놀랍고 재미있는 ἱερὸν καὶ θαυμαστὸν καὶ ἡδύν 분이라 추켜세워 준 뒤 다른 나라로 보내야 한다고 말한다. 결국 소크라테스는 이 나라에서는 우리의 이로움을 위해 한결 딱딱하고αὐστηροτέρός 덜 재미있는ἀηδής 시인과 설화 구술가μυθόλογος가 채용될 것이며(398a) 그들은 우리한테 훌륭한 사람의 이야기 방식λέξις을 모방해 보여주고 이야기도 군인 교육에 착수했을 때 법제화했던 규범τύπος에 의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 연후 소크라테스는 이로써 시가에서 이야기λόγος 및 설화μῦθος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완전히 마무리되었다고 말한 후 이제 남은 것은 노래ᾠδή와 선율(서정시가)μέλη의 양식τρόπος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한다.(398b)
—————–
* 이야기 방식(말투)leksis과 서술 방식(이야기의 진행)diēgēsis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논의의 편의상 그 말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야기 방식은 앞서 다루었듯이 어떤 서술방식을 따르는가에 따라 규정되기도 하고 앞으로 다루어지듯이 어떤 선법과 리듬에 따르는지에 따라 규정되기도 한다. 요컨대 이야기 방식은 가사와 노래로 구성된 시가를 전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서술방식은 앞서 말한 대로 이야기 방식과 관련하여 시가를 구성하는 것 가운데 하나인데 노랫말 즉 시가 가사의 표현 방식으로서 ‘단순 서술방식’과 ‘모방을 통한 서술방식’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다시 그 가운데 모방을 통한 서술방식은 ‘한 가지만 모방하는 서술방식’과 ‘온갖 것을 모방하는 서술방식’으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이전 강해에서 살폈듯 이야기 방식이 서술방식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각기 구분되고 있다. 즉 1)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 방식 : 서술방식 중 최대한 모방을 통한 서술방식은 지양하되 모방을 할 경우라도 훌륭한 사람이나 훌륭한 것 한 가지만 모방하는 이야기 방식, 2) 훌륭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 방식 : 단순 서술방식은 지양하고 대부분 모방을 통한 서술방식을 택하되 그것도 온갖 것을 모방하는 이야기 방식.
* 그리고 이제 서술방식에 기초한 앞선 논의에 이어 선법과 리듬에 기초한 이야기 방식이 논의된다. 앞서도 말했듯이 시가는 노래 내지 음송의 형식을 갖고 있으므로 가사와 관련된 서술방식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그것에 붙여지는 선법과 리듬에 대한 논의 또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리듬과 선법에 기초한 이야기 방식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에 앞서 순수하게 훌륭한 사람들을 모방하는 이야기 방식이 견지해야 할 기본 원칙을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있다. 즉 순수하게 훌륭한 사람은 온갖 것을 모방하거나 이것도 저것도 아닌 혼합형의 이야기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politeia에 어울리는 사람은 각자가 한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나라에서는 이러저러한 일을 가리지 않고 모방하는 양면적이거나 다방면적인 사람은 발견되지 않고 제화공은 제화공으로, 농부는 농부로, 전사는 전사로 발견될 뿐이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다른 나라로 추방되어야 한다. 오히려 한결 딱딱하고 덜 재미있는 설화작가가 우리에게 더 이로움을 주므로 처음에 법제화했던 규범에 의거 이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채용해야 한다. 요컨대 소크라테스는 시가 교육과정의 일환으로서 이야기 방식과 관련한 논의를 하면서도 시가 교육을 통해 양성될 수호자가 다스리는 나라 즉 정의로운 나라의 정체가 지향해야 할 기본 원칙의 일단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소질과 적성에 기초한 한 사람 한 가지 일 즉 일인일기의 전문가주의와 그러한 전문가주의에 기초한 분업주의이다. 물론 이러한 기본 원칙은 아직 보다 일반적인 형태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제2권의 서론적 논의(370b-c)에서도 그랬듯이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방식으로 앞으로 다루어질 이상국가의 기본 틀과 문제의식이 무엇인지를 <국가> 내내 간단없이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환기시키고 있다.
* 소크라테스는 이로써 시가에 있어서 이야기 및 설화와 관련된 논의를 완전히 마무리했다고 말하고 바로 이어 노래와 선율의 방식에 대한 논의를 개시한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지금까지의 논의는 이야기 방식에 관한 논의이되, 시가의 노랫말에 관한 논의 즉 이야기 내용과 그것의 서술방식에 기초한 논의이고 지금부터 개시되는 논의는 이야기 방식에 관한 논의이되, 가사에 붙여지는 음악적 요소들과 관련한 논의이다.
1-2-1 시가 교육(376e-403c)
1-2-1-1 무엇을 말해야 할 것인가 – 시인들이 지켜야할 규범(376e-392c)
1-2-1-2 어떻게 말해야할 것인가(392c-398b)
1-2-1-2-1 이야기 방식과 모방(392c-398b)
1-2-1-2-2 가사, 선법, 리듬(398c-401a)
[398c-399e]
* 소크라테스는 노래와 선율의 양식과 관련된 논의를 시작하면서 이에 관한 논의 또한 앞서 말한 것과 일치를 보려고 하는 한, 우리가 해야 할 말들이 무엇인지는 모두가 찾아냈다고 말을 한다. 글라우콘은 그 ‘모두’에서 자신은 제외되는 것 같다고 겸손해하자 소크라테스는 글라우콘도 능히 말할 수 있을 게 분명하다고 말한다.(398c) 실제로 소크라테스는 바로 뒤에서(398e) 글라우콘이 ‘시가에 밝은 사람’μουσικός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 연후 소크라테스는 노래μέλος는 세 가지 즉 노랫말λόγος과 화음(선법)ἁρμονία, 그리고 장단(리듬)ῥυθμός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것들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398d)
* 소크라테스는 우선 노랫말이란 곡이 붙지 않은μὴ ᾀδομένος 말과 다를 것이 없고 화음(선법)과 장단(리듬)은 이 노랫말을 따라야 함을 밝힌 후 바로 글라우콘과 선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398e) 여기서 소개되는 화음의 종류와 특징은 아래와 같다. 1) 혼성 뤼디아 화음μιξολυδιστί ἁρμονία과 고음 뤼디아 화음συντονολυδιστὶ ἁρμονία, 2) 이오니아 화음ἰαστί ἁρμονία과 뤼디아 선법λυδιστὶ ἁρμονία, 3) 도리스 선법δωριστὶ ἁρμονία과 프뤼기아 화음φρυγιστί ἁρμονία. 이 중 1)은 비탄조θρηνώδης의 선법으로서 남자는 물론 훌륭해야만 되는δεῖ ἐπιεικεῖς εἶναι 여인들한테도 무용한 화음이고 2)는 유약하고μαλακός 게으름ἀργία과 주연(酒宴)에 맞는συμποτικός 화음으로서 수호자에게 가장 부적절한ἀπρεπέστατον 화음이다. 다만 나머지 3)의 화음만은 훌륭한 사람들의 어조φθόγγος와 억양προσῳδία을 적절하게 모방하게 될 화음으로서 남겨두어야 할 화음으로 제시된다.(399a) 이 과정에서 소크라테스는 용감하고 훌륭한 사람의 모습을 두 가지 상반되는 상황에서 그들이 대처하는 모습으로 각기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즉 전투 행위나 강제적인 업무βίαιος ἐργασία 등 불가피하게 불운한δυστυχούντων 상황에 처했을 때의 모습과, 그 반대로 운 좋게εὐτυχούντων 평화로운εἰρηνικός 상황에서 자발적인ἑκούσιος 행위를 행할 때의 모습으로 나누어 훌륭한 사람이 갖추어야 할 모습들을 각각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전자의 상황에서 훌륭한 사람이란 부상이나 죽음 등 역경에 처하더라도ἀποτυχόντος 자신의 불운을 꿋꿋하게παρατεταγμένως 참을성 있게καρτερούντως 막아내는 사람이다. 그리고 후자의 상황에서 훌륭한 사람이란 누군가에게 뭔가를 설득하며 요구를 할 때에는 신께는 기도εὐχή로써 하되 사람한테는 가르침διδαχή과 충고νουθέτησις로써 하고 반대로 남이 자신에게 요구를 해오며δεομένον 가르치려거나 변화를 설득하려μεταπείθω 하면 조신하게 귀를 기울이는(자신을 숙이는)ἑαυτὸν ἐπέχοντα 사람, 그래서 지성에 따라 행동하고πράξαντα κατὰ νοῦν 거만하지 않으며μὴ ὑπερήφανος 절제 있고σώφρων 금도 있게μέτριος 행동하며 결과τὰ ἀποβαίνοντα에 만족하는ἀγαπῶντα 사람이다.(399b-c)
*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우리의 노래ᾠδή와 선율μέλος에는 많은 현χορδία을 사용할 필요도 없고 모든 선법을 다 연주할 수 있는 악기ὄργανον도 필요 없고 그에 따라 삼각현τρίγωνος이나 펙티스πηκτίς 등 여러 현과 여러 화음(선법)을 이용하는 모든 악기의 연주자ποιός나 제작자를 양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399d) 특히 현이 가장 많은 아울로스αὐλος가 그렇다. 온갖 화음(선법)παναρμόνια을 연주할 수 있는 악기들 자체가 아울로스의 모방물μίμημα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뤼라λύρα와 키타라κιθάρα 그리고 농촌에서 쓰는 쉬링크스(피리)σῦριγξ 정도만 남을 것이며 그런 까닭에 마르쉬아스Μαρσύας와 그의 악기보다 아폴론과 그의 악기를 선호하는 것이 전혀 새로운καινός 것이 아니라고 소크라테스는 말한다.(399e)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흥미롭게도 앞서 372a에서 호사스럽게τρυφάω 산다고 말했던 나라가 우리도 모르는 새 다시 완전히 정화διακαθαίροντες되었다고 말하고 그 연장선 위에서 나머지 것들인 화음에 이어 장단(리듬)ῥυθμός(rythmos)에 관해 논의하자고 말한다. 장단과 박자βάσις(步格,basis) 역시 선법이 그러했듯이 현란하거나 다양해서는 안 되며(400a) 운율πούς(詩脚,pous)과 선율μέλος(melos) 또한 절도 있고κόσμιος 용감한 사람의 말(노래 말)λόγος을 따라가야 하며 그 반대가 되어선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런 연후 소크라테스는 글라우콘에게 리듬에 관해 묻는데 글라우콘은 음정φθόγγος에 네 가지가 있듯 운율에는 3종류가 있지만 어떤 리듬이 어떤 삶을 모방해내는 것인지는 모른다고 답한다. 이에 소크라테스는 그에 관해 다몬Δάμων에게 상의하겠지만 그에게서 들은 몇 가지 장단 즉 어떤 복합장단σύνθετος(복합적인 시각), 에노플리오스ἐνόπλιος(전쟁조), 닥틸로스δάκτυλος(장단단격), 이암보스ἴαμβος(단장격), 트로카이오스(장단격)τροχαῖος(400c) 등을 소개한 후 남겨야 할 박자(basis)와 장단(rythmos)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우아함εὐσχημοσύνη이 좋은 장단εὔρυθμος을 따르고 또 좋은 장단은 아름다운 이야기 방식καλός λέξις을 닮은 것이고, 꼴사나움ἀσχημοσύνη은 그 반대의 것을 따른다고 말한다. 그리고 장단ῥυθμός과 선법(화음)ἁρμονία이 말(노래 말)λόγος을 따르는 한 좋은 화음εὐάρμοστος 또한 아름다운 이야기 방식을 따르고 나쁜 선법은 그 반대를 따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야기 방식은 영혼의 성품ἦθος을 따르고 나머지 것 즉 장단과 선법은 그 이야기 방식을 따른다고 말한다.(400d) 요컨대 좋은 말εὐλογία과 좋은 화음εὐαρμοστία, 우아함εὐσχημοσύνη, 좋은 장단εὐρυθμία은 단순함(좋은 성품, 순진함)εὐηθείᾳ을 따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단순함이란 어리석음ἄνοια을 좋게 부르느라 우리가 단순함이라고 부르는 그런 단순함이 아니라, 정말로 좋고 아름다운 성품을 갖춘 생각διάνοια을 말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것을 행하게 되려면 어디서나 이것들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한다.(400e) 그리고 장단과 선법 등 음악 관련해서만이 아니라 회화γραφικὴ나 그와 같은 모든 기예δημιουργία 즉 직조ὑφαντική, 자수ποικιλία, 건축οἰκοδομία을 위시하여 다른 살림살이들의 제작은 물론 우리 몸σῶμα의 본성φύσις과 다른 모든 생물φυτόν들의 본성도 이런 것들 즉 우아함, 좋은 성품과 단순함, 그러한 성품을 갖춘 생각들로 가득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에 비해 꼴사나움과 나쁜 장단ἀρρυθμία과 나쁜 화음ἀναρμοστία은 나쁜 말κακολογία과 나쁜 성품κακοηθος의 형제ἀδελφή이고, 그 반대되는 것들은 절제 있고σώφρων 좋은ἀγαθός 성품의 형제이자 모방물μίμημα이라고 말한다.(401a)
——————-
* 선법과 리듬에 기초한 이야기 방식을 논하는 이 부분에는 고대 그리스의 음악 용어가 많이 나온다. 고대 그리스 음악과 근현대 음악이 갖는 차이 때문에 그 용어들을 어떻게 오늘날의 음악 용어로 번역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고 그에 따라 동서양을 막론하고 역어들도 차이가 있다. 우리 말 역본들(박종현 역본, 천병의 역본, 학당 초고본)에서도 차이가 있다. 참고로 우리말 역본에서 차이가 나는 주요 역어들을 그리스어 원어와 병기하면 아래와 같다. 강해에서는 편의상 학당 초고본(아직 최종 역어는 아님)을 기준으로 표기했으나 그 역시 아직 최종 역어는 아니다. 약어 : 학초=학당 초고, 박=박종현 역본, 천=천병희 역본. 쪽수 표시는 최초 표기된 곳.
ἁρμονία(harmonia) 397b- 선법(박, 천), 화음(학초)
– 학당 초고는 일단 ‘화음’으로 옮겼지만 여기서 harmonia는 우리가 흔히 알 듯 고저를 달리하는 둘 이상의 음정들이 동시에 울리는 경우의 화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음계 즉 고저를 달리하는 음정들의 일정한 계열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선법’이라는 역어가 더 적합해 보인다.
ῥυθμός(rythmos) 397b 리듬(박, 천), 장단(학초)
ᾠδή(ōdē) 398c – 노래(박, 천, 학초)
μέλη(melē) 398c – 서정시가(박), 음악(천), 선율(학초),
μέλος(melos) 399e – 노래(박), 멜로디(천), 선율(학초),
βάσις(basis) 399e – 운율(천, 운각(韻脚)400a), 보격(步格)(박, 운율400a), 박자(학초)
πούς(,pous) 400a – 운율(천, basis와 동일하게 번역), 시각(詩脚, 박), 운율(학초),
φθόγγος(phthogos)400a – 소리(학초, 박, 천), 또는 음정(박)
εὔρυθμος(eurythmos) 400d – 좋은 리듬(박, 천), 장단이 맞는 것(학초),
εὐάρμοστος(euharmostos) 400d – 조화로움(박), 좋은 선법(천), 화음이 맞는 것(학초)
* 아래는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정암학당 해당 부분 역자 김주일 박사가 초고에 붙여 놓은 임시 각주들이다.
1) 399e 마르쉬아스 : 마르쉬아스는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염소의 형상을 한 사튀로스들 중 하나로서, 아울로스 연주를 잘해서 뤼라를 즐겨 연주하는 아폴론 신과 대결을 벌였다는 신화적 존재이다.
2) 399d 아울로스 : 아울로스는 피리의 일종으로 관악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현이 없다. ‘현이 가장 많다’는 것은 여기서 다양한 화음을 연주할 수 있다는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아울로스는 다양한 장치를 사용해 다양한 선율을 연주할 수 있었다. 그래서 399c-d에 나오는 ‘현이 많다’란 말도 ‘다양한 화음을 연주할 수 있다’란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399e basis(박자, 운각) : 그리스 리듬에서 강음은 장음에 주어지고, 하박(basis, thesis) 역시 장음에 주어진다. 따라서 장음으로 시작하는 운각에서는 시작부분에 강음(ictus)과 하박이 떨어지고, 단음으로 시작하는 운각에서는 나중에 나오는 장음에 강음과 하박이 떨어진다. 문자에 충실해 보면 basis의 다양함이란 이런 강박의 위치의 다양성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음악기초이론의 이해>를 보면 metre를 박자로 이해한다. 문제는 그리스 시가의 metre가 강약 중심으로 짜인 것이냐의 문제다(역시 같은 책에서 리듬을 장단의 배열로 이해한다). 엮어보면 박자는 기본적으로 첫 박의 장음에 강세가 가는 방식으로 짜인다. 리듬은 장음과 단음의 배열이다. 박자는 배경으로 규칙적으로 깔리고, 그것을 배경으로 리듬은 장단음을 기본 요소로 짜인다. 그런데 그리스 음악은 기본이 시가이기 때문에, 자연적 장단음을 가진 말로 짜인다. 따라서 기본 metre에 따라 박자는 정해져 있고, 리듬도 이것과 기본적으로 겹치는 체제이다. 그런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쪼개거나 늘리는 것을 플라톤이 배제하는 것이 아닐까?
4) 399e-400a 리듬(박자) : 고대 그리스 음악의 리듬(rhythmos)은 시가의 운율에 기초를 두고 있다. 따라서 리듬(rhythmos)은 시가 운율의 장단음 배열을 기본적으로 따른다. 한편 시가 운율의 기본 단위는 장음과 단음의 혼합으로 이루어지는 운각(pous)으로서, 이것들이 모여 운율(metron)이 되며, 시가의 한 행은 한 운율이 된다. 다른 한편 하나의 마디에 들어가는 하나의 운각(운각을 박자와 같은 의미로 볼 때, 서양음악에서는 한 마디에 여러 박자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이지만, 고대그리스 음악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박자를 한 마디로 잡는다)을 상박(upbeat)과 하박(downbeat)로 나누고 상박을 ‘arsis’라 부르고 하박을 ‘basis’ 또는 ‘thesis’로 불렀다. 상박은 단음 또는 단음들이고 하박은 장음이다.(Adam은 Westphal을 따라 두 개의 운각과 하나의 강음-ictus-이 하나의 basis를 이룬다고 보았다.) 따라서 박자(basis)는 원래 하박을 부르는 명칭이고 운각(pous)은 장단음이 결합 된 것으로, 운율의 기본 단위이지만 현재 맥락에서는 리듬과 큰 의미 차이 없이 쓰인 것으로 보인다. Ancient Greek Music(M.L.West, 1992), p.129~137 참고. 이런 취지에서 rhythmos, basis, pous를 뉘앙스는 살리고 정확성은 좀 약화하여 장단, 박자, 운율로 하고자 한다. 뉘앙스를 구별한다면 장단의 기본 단위는 운율(pous)이고, 이 운율은 박자(basis)에 의해 이분 되는데, 특히 basis는 강음을 포함하여 장단에 입체감을 주며, 장단은 운율들이 모여 변형을 이루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5) 400a, 화음(선법)을 구성하는 4가지 : 화음을 구성하는 네 가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으나 기본적인 음정의 비율(2:1, 3:2, 4:3, 9:8)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Adam 주석 참고). 박자를 구성하는 세 가지는 운각(pous)을 이루는 장음과 단음의 비율이 구성되는 방식으로 닥튈로스(장-단-단)나 스폰데이오스(장-장)처럼 장음과 단음의 비율이 2:2가 되는 경우, 이암보스(단-장)나 트로카이오스(장-단)처럼 2:1인 경우, 크레티코스(장-단-장)처럼 3:2인 경우가 있다.
6) ‘그런데 분명하지는 않지만 나는 다몬이 어떤 복합장단을 행진에 맞는(에노폴리온) 장단이며 닥튈로스라고, 심지어는 영웅적 장단이라고까지 부르는 것을 들은 것으로 생각하네’oimai de me akēkoenai ou saphōs enoplion te tina onomazontos autouῦ syntheton kai daktylon kai ērōon ge, .. 400b : 이 부분도 구문에 대한 이해에 따라 번역이 갈린다. 우선 남성 4격의 tina에 생략된 명사가 리듬rhythmos이나 아니면 운각metron이냐의 여부에 따라 syntheton의 번역이 갈린다. 일부(Griffith, Leroux, Shorey)는 생략된 명사를 중성임에도 metron으로 보거나 운율pous로 보고 있다. 아마도 이 맥락을 시가적이라고 본 듯하다. 그런데 리듬의 문제가 시가와 음악을 구분 짓기 애매하게 만들기는 하지만, 음악의 맥락에 더 가깝다는 점을 고려하면 리듬으로 보는 것이 더 나을 듯싶다. 그래서 syntheton을 ‘복합장단’으로 옮겼다. 그리고 이와 연동하여 tina를 syntheton에 거는 쪽(Waterfield)과 enoplion에 거는 쪽(Leroux, Sachs) 그리고 어느 쪽에도 걸지 않고, tina에 대한 이름으로 나머지 네 개를 보는 쪽(Shorey)이 있다. 또한 enoplion과 syntheton을 어떻게든 묶고, 나머지는 뒤의 분사구문의 목적어로 보는 방식(천, 박)도 있고, 이들을 묶고 tina에 대한 세 이름으로 보는 방식(Adam)도 있다. 문법적으로는 te tina에서 te를 enoplion에 붙는 te로 볼지, 그냥 te, ..kai로 볼지 양쪽으로 갈리는 듯하다. 전자는 어순이 자연스럽고 후자는 뜻에 더 맞아 보인다. 행진풍의 리듬을 복합적이라고 하기에는 복합적이라는 말이 더 넓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복합장단은 운율(pous)이 장단음의 혼합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이고 영웅적이고 닥튈로스라고 한 것은 그리스의 영웅 서사시가 닥튈로스 운각의 6각운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닥튈로스나 스폰데이오스가 ‘장-단-단’ 또는 ‘장-장’으로서 두 개의 장음 또는 한 개의 장음과 두 개의 단음으로 구성된다면, 이암보스는 ‘단-장’, 트로카이오스는 ‘장-단’으로 장음 하나와 단음 하나로 구성되며, 앞의 것들이 위아래(arsis-basis)가 균등한데 반해 이것들은 불균등하다.
————————
* 위 같은 내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추가 설명과 철학적으로 음미해볼 사안을 덧붙이면 아래와 같다.
1) 시가에 붙는 화음과 장단(선법과 리듬)에 관한 논의에서 소크라테스가 강조하는 것들은 앞서 시가 가사(말)의 서술방식과 관련한 논의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과 내용에서 크게 차이가 없다. 즉 그것들은 장차 용감하고 훌륭한 수호자가 되어야 할 젊은이들에게 적합해야 한다. 우선 시가에서 신들과 영웅들의 훌륭한 말과 행동을 모방하여 절제 있고 절도 있게 말하고 행동하려면 훌륭한 신들과 영웅들의 이야기에 밝아야 하듯이 시가에 붙는 선법과 리듬은 반드시 그러한 시가의 내용 즉 노랫말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시가를 서술함에 우아한 것이건 추한 것이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온갖 것을 모방하는 방식으로 서술하는 시인들이나 배우들과 달리 화음과 리듬을 구사하는데도 비탄과 한탄, 술취함과 유약함, 게으름 따위를 부추기는, 그래서 군중들이나 좋아하는 이러저러한 화음을 배제하고 절제 있고 절도 있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화음을 선호해야 한다. 이를테면 도리스 화음이나 프뤼기아 화음과 같은 것들이다. 이에 따라 수호자를 위한 음악 교육에서 악기 또한 여러 현과 넓은 음역을 갖는 악기, 이를테면 아울로스 같은 악기는 제외되어야 하고 뤼라와 키타라 같은 악기 정도만 남겨두어야 한다. 장단과 박자, 운율과 선율 또한 마찬가지이다. 복잡 미묘하고 현란한 장단과 박자는 수호자가 지향할 우아함과 거리가 멀다.
2) 다양성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시각에서 보면 이와 같은 음악 교육과 관련한 플라톤의 주장은 그야말로 터무니가 없을 정도로 경직되어 있고 일양적이다. 그러나 어느 시대이든 학교에서건 가정에서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에서는 분야에 상관없이 나름의 일정한 교육 목표와 기준이 요구되어왔고 오늘날 보편화 된 대중문화를 생산 유포하는 방송 및 언론 기관에서조차 일정한 기준 아래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그러한 목표와 기준이 가지는 내용의 적합성과 그것을 결정하는 합리적 정당성이다. 플라톤의 주장은 오늘날 민주사회가 지향하는 합리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적합성과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귀담아서 들어야 할 부분이 있다. 우선 플라톤은 적합성의 기준을 다수의 결정에서 찾지 않고 소질과 적성이 다양한 사회 구성원 각각의 본성에서 찾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본성만큼 적합성의 내용 또한 다양하다. 여기서는 나라의 수호자로서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사람을 대상으로 시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들에게 적합한 절도와 절제가 강조되고 있고 그에 어울리는 음악 교육이 제시되고 있다. 그래서 내용 자체만 들여다보면 누가 보더라도 경직되고 단순하며 일양적이다. 그러나 그것이 나라의 수호자 즉 훌륭한 군인들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과정에서 채택된 것임을 고려하면 나름의 적합성에서 벗어나 있다고 보기 힘들다. 단순하고 일양적이기는 하지만 내용 면에서 교육 대상과 교육 목표에 적합한 것일 수 있다. 오늘날에도 행진곡, 장송곡 등 경우와 상황, 대상에 따라 어울리는 음악이 따로 있다. 여기서도 그 적합성은 모든 경우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플라톤에게 적합성은 수호자에게 어울리는 것으로 수호자에게 요구되는 것이지 결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적합한 것으로 일양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플라톤에게 사회 구성원들은 각자 소질과 적성이 다르고 그에 따른 본성과 욕망 또한 다르고 그에 따른 그들의 일과 직무도 다르기 때문이다. 307d에서 보듯이 대다수 군중은 그와 반대되는 유형에 어울리고 오히려 그러한 유형이 그들을 월등하게 즐겁게 해 준다. 요컨대 플라톤에게 적합성과 관련하여 일관된 원칙이 있다면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 각자의 본성과 욕망에 어울리는 적합성을 찾아 주는 것이다. 그들 각각에 적합한 것이 고유하다면 그들 각각은 일양적이지만 그 각각의 차이만큼 각각에게 어울리는 고유한 적합성의 종류는 다양하다. 이곳에서의 음악적 리듬의 일양성도 다만 늘 냉철함을 잊지 말아야 하는 수호자를 위한 음악 교육과정에서는 그와 같은 특정의 리듬이 가장 어울리고 그들의 수호자다운 성품의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플라톤이 내세우는 특정 성향의 타당성을 일단 논외로 한다면 일반적인 관점에서 플라톤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즉 선법과 리듬 등 제반 음악적 요소들은 매우 다양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의 차이가 다양한 만큼 인간의 인격 내지 성품 형성에 미치는 영향 또한 다양하다. 그리고 그 차이는 리듬과 박자가 그러하듯 일정하고도 객관적인 규칙성과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을 위한 교육과정에서 그러한 음악적 요소들의 내적 연관성은 적합성 차원에서 반드시 분석되고 평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그런데 위와 같은 음악 관련 논의에서 플라톤이 제시한 음악적 일양성과 경직성이 과연 현대사회의 다양성과 얼마나 대치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생각해야 할 점이 있다. 이른바 자유주의 사회로 표징되는 현대사회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다룬 음악 분야는 물론이고 그 밖의 모든 분야에서 과연 인간 욕망의 다양성이 담보되고 있는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현대인들은 그들 각각의 소질과 적성, 성격과 성향에 상관없이 대체로 돈과 재물에 대한 욕망으로 획일화되어 있고 그에 따라 재화 획득 능력이야말로 가장 적합한 생존 능력과 가치로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보면 무한경쟁의 이름으로 그런 능력의 고양을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는 오늘날 신자유주의 사회야말로 오히려 개인들로 하여금 그들 각자에게 부합하는 고유한 적합성과는 무관하게 일양적이고도 획일화된 기준을 구조적으로 강요한다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오늘날 대중들의 음악적 관심사만 보더라도 그것은 하나같이 재물 획득의 효율성을 노리는 자본에 의해 지배되고 있고 그 다양성은 개인들의 주체적 욕망을 반영하기보다는 자본에 의해 기획된 구매 욕구의 반영으로서 상품화된 다양성에 불과하다. 게다가 그것은 자본의 지속적인 확대 재생산을 위한 수단으로서 유행과 개성이라는 미명으로 개인들의 소비 욕망을 부추겨 자연적·사회적 자원을 끊임없이 소모하고 있다. 자본에 의해 수단화되고 상품 가치로 획일화된 이러한 개인의 욕망을 각자의 소질과 적성에 따른 다종다양한 본래의 욕망으로 되돌리는 것이 자본주의 문명에 찌든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중대하고도 심각한 과제의 하나라면, 인간의 다양한 자연적 소질과 적성을 기본 전제로 깔고 그 위에 세워지는 플라톤의 정치철학이야말로 반(反)민주주의적이라는 오늘날의 비판을 넘어서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민주주의의 이념과 본질을 근본적으로 다시 되돌아보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4) 장차 수호자들은 전쟁이라는 불운한 상황에 처하여 불가피하게 강제적인 일도 해야 하고 평화 시에는 지도자다운 품성을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절제 있고 예절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 비록 반대적인 상황과 반대적인 일조차도 나라의 수호를 위해서라면 수호자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 속에서 마치 씨줄과 날줄을 엮어 직물을 지어내듯 바람직한 하나로 조화를 이뤄내야 한다. 이곳에서도 플라톤의 반대적인 것들의τῶν ἐναντίων 조화와 균형의 원리가 하나같이 강조되고 있다. 반대적인 것들이 함께 있는 것이 무규정적 현실과 인간 욕망의 근원적 특성이지만 그것들을 영혼이 가지는 지성의 힘으로 헤아리고 분별하고 규정하여 그것들의 조화와 공존을 이끌어 내는 것이야말로 나라의 수호자이자 철학자들이 할 책무인 것이다.
5) 이에 따라 플라톤은 399b에서 바람직한 어조와 억양, 선법을 모방하여 위와 같은 상반된 상황을 가장 훌륭하게 넘어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제법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서 묘사하는 인간상은 당연히 정의로운 나라를 이끌어 갈 바람직한 수호자 상이기는 하지만 내용 면에서 마치 플라톤 스스로 평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생활 지침을 되새기는 것처럼 비추어지면서 자못 우리에게 감동과 교훈을 안겨준다. 그리고 그것은 흥미롭게도 동양 유가의 군자상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누군가를 설득하며 요구할 때는 신에게는 기도로 하고 사람에게는 가르침과 충고로 하라’는 말은 ‘하늘을 받들고 타인을 사랑하고(敬天愛人) 천명에 따르고(待天命) 남을 자신에 비추어 생각하며(推己及人) 말을 삼가되(愼言) 남을 가르치는 일에 성심을 다하고(誠之) 게을리 하지 않는다.(敎不倦)’는 말과 상통하고 반대로 ‘남이 자신에게 요구를 해오며 가르쳐 주거나 변화하도록 설득을 해오면 귀를 기울이라’는 말 역시 공자의 가르침을 떠오르게 한다. 공자는 논어(論語)에서 ‘올바른 말로 일러 주는 것은 잘 따라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法語之言能無從乎改之爲貴)고 말하면서 ‘남이 은근하게 타이르는 말은 기쁘지 아니한가?(巽與之言能無說乎)’라고 반문하고 있다. 여기서 ‘귀를 기울인다’로 번역된 말의 원어는 ἑαυτὸν ἐπέχοντα(heauton epechonta)인데 사실 그 말을 직역하면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자신을 숙인다’라는 뜻으로 그야말로 공자가 강조하는 겸양(謙讓)의 미덕을 담고 있다. 그리고 ‘지성에 따라 행동하고 거만하지 않으며 절제 있고 금도 있게 행동하고 결과에 만족하는 사람’ 역시 ‘앎과 행동을 같게 하고(知行合一) 겸손(謙遜)하고 온유후덕(溫柔厚德)하며 스스로를 다스려 예(豫)를 세우고(克己復禮)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천명에 따르면서(盡人事待天命) 수분자족(守分自足)하는’ 동양의 군자상과 그대로 일치한다.
6) 결국 시가에서 음악적 요소 또한 시가를 이야기 하는 방식으로서 앞서 서술방식과 관련한 논의에서처럼 그 내용과 방식이 아름다워야 한다. 그러므로 좋은 리듬과 좋은 선법은 반드시 시가의 아름다운 이야기 내용 즉 노랫말(시가 가사)에 어울려야 하고 그것을 따라야 한다. 요즘에는 곡이 작곡된 후 그에 맞추어 가사를 쓰는 일도 있지만 플라톤의 경우에는 작곡은 반드시 노랫말 즉 가사에 맞춰서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그 노랫말은 영혼의 성품을 따라야 한다. 그런데 플라톤은 흥미롭게도 여기서 이러한 좋은 말씨, 좋은 화음(선법), 좋은 리듬(박자), 좋은 모양(우아함)은 모두 단순함(순진함, 좋은 성격 euētheia)을 따르는 것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 단순함이란 우리가 보통 어리석음anoia을 좋게 부를 때 쓰는 그런 단순함이 아니라, 정말로 좋고 아름다운 성품을 갖춘 생각διάνοια을 말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직분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어디서나 이것들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시가와 관련한 이야기 방식에서 따라야 할 우선순위를 요약하면 선법과 리듬 즉 음악적 요소는 시가의 스토리 즉 말(노랫말)을 따라야 하고 그 말은 영혼의 성품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단순함을 따라야 한다. 그런데 그 단순함이란 성품을 잘 훌륭하게 갖추고 있는 생각(사고)dianoia을 말한다. 즉 단순함은 영혼의 성품과 하나를 이루면서 그것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이다. 요컨대 이야기 방식과 관련하여 음악은 감각에 작용하는 감성적 요소로서 말이라는 지적 요소에 의해 지배되어야 하고 그 지적 요소는 다시 영혼의 성품에 의해 지배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배관계의 최상위에 있는 영혼의 성품이란 그 성품을 보존하는 생각으로서 단순함을 그 내적 본질로 가지고 있다.
7) 그런데 여기서 플라톤이 말하고자 하는 근본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말하는 단순함εὐηθείᾳ(euētheia)의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의 원어 euētheia는 일차적으로 ‘좋은 성격’이나 ‘순진함’을 의미하지만 그렇다고 그 순진함은 제1권에서 트라쉬마코스가 빈정거리듯 정의를 ‘고상한 순진성’genaian euētheia으로 부를 때(348d)와 같은 의미에서의 순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아무런 편견이나 선입관 없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어린이의 마음을 일컬을 때의 순진성에 더 가깝다. 소크라테스도 여기서 그 말을 어리석음anoia이 아니라 오히려 지적 사고로서의 dianoia와 연결 짓고 있고, 주석가인 아담(J. Adam) 역시 그 말의 진정한 어원을 hōs alēthōsῶς(truthfully)에서 찾고 있다. 실제로 우리는 생활 속에서 아주 복잡한 것을 아주 단순화하여 한마디로 명쾌하게 꿰뚫어보는 경우도 경험하고 반대로 아주 간단한 것도 선입견이나 편견에 휩쓸려 복잡하게 생각하거나 애매하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종종 경험한다. 여기서 플라톤이 말하는 단순함이란 인식의 측면에서 말하자면 전자의 경우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요컨대 단순함은 사물과 사태의 내적 관계나 실체들을 아무런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분명하고 온전하게 그야말로 명석판명하고 간명하게 드러낼 때의 영혼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처럼 인간은 그러한 진실을 간취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인간 고유의 인격적 요소 즉 영혼의 성품을 구유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맑은 거울과도 같은 이와 같은 순수성이 영혼의 성품이 내적 본질로서 가지고 있는 단순함의 의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이곳에서 ‘젊은이들은 이러한 것들 즉 단순함과 생각을 추구해야 한다’는 소크라테스의 말은 다소 개념적으로 풀이해서 말하면 이런 의미 즉 ‘장차 수호자들이 될 젊은이들은 반드시 순수하고 맑은 영혼의 성품을 보전하여 나라에서 일어나는 온갖 종류의 복잡한 일들을 진실의 관점에서 통일적으로 이해하고 그 문제의 핵심적인 내용과 해결 방안을 가장 명료하게 찾아내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가 이어서 설명하고 있듯이(401e-402a) 이처럼 청소년을 위한 시가 교육의 단계에서 예민하게 진실을 직감하는 젊은이들의 순수성 내지 초보적 단순성은 자라면서 이성적 논거 형성 능력의 민감성으로 발전하고 이후 고도의 철학적 추상 능력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변증법을 통해 진리 자체 즉 이데아에 대한 인식으로 승화되어 나가는 것이다.
8) 그리고 플라톤은 지금까지 이야기 방식과 관련한 논의 즉 말과 그에 수반되는 음악적 요소에 대한 시가 관련 논의 전체를 통해 드러낸 위와 같은 결론적 문제의식을, 단순히 시가 관련 분야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그림 분야를 비롯한 모든 기예들 즉 직조술, 자수, 건축 등의 예술 영역은 물론 인체 및 생물들의 내적 구조와 본성 등 우아함과 관련한 모든 영역으로 확장 시킨다. 이것은 시가 관련한 논의를 수행하면서 논의된 문제의식과 일부 도출된 결론들이 앞으로 다루어질 정의로운 국가의 전반적인 문제 영역에서도 통일적이고도 일관되게 적용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로써 이야기 방식에서 음악적 요소와 관련한 논의가 마무리되고 지금까지 진행된 시가 교육이 왜 중요하고 그것이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끝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