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소설] <그대에게 가는 먼 길> 1부 – 6회|3. 광주항쟁 (3) [이종철의 에세이 철학]
여섯 번째 글
3. 광주항쟁(3)
“그 당시 나는 교회에서 알게 된 미정에 대해 연애 감정을 갖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그녀를 생각하기도 했다. 그녀도 회사에서 틈만 나면 나에게 전화했고, 전화를 시작하면 꽤 오랜 시간 전화기를 붙잡고 있기도 했다. 아주 오랜만에 서로 마음이 통하는 느낌이었다. 그런데 내가 감방에 들어간다면 그녀와의 만남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에 미치면 괴로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 거사를 하기 전날 나는 그녀의 집을 먼저 찾아갔다.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사정 이야기를 그녀에게 해주어야만 했다. 나중에 제3 자를 통해서 나의 거사를 알게 된다면 그녀는 나에 대해 실망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내가 써 왔던 일기장을 그녀에게 준다는 것도 나 자신에게는 각별한 의미가 있었다. 나의 마음을 전달하고, 나의 생각과 행동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되었다. 밤늦게 그녀의 집 앞으로 찾아가서 그녀를 불러냈다. 그런데 기대했던 것과 달리 그녀의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나는 사선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녀는 갑자기 왜 불러냈느냐는 식의 심드렁한 표정만 짓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예요? 이 늦은 시각에.” 아주 뜬금없다는 태도다.
“잠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야.”
“그냥 전화로 하던지, 아니면 밝은 낮에 하면 안 되나요?”
그 말을 듣자 그녀와 나 사이에 넘기 힘든 벽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서로 간에 감정이 완전히 불통이 된 것 같아 가슴이 답답했다. 물론 내 생각이 너무 앞서 간 면이 있었지만 달리 어떻게 할 시간도 없었다.
“알았어. 그런데 이 노트를 잘 좀 보관해줘. 내가 오랫동안 써 왔던 일기야. 그리고 나 내일쯤 당분간 멀리 떠나게 될 거야.”
“아니, 그걸 왜 나한테 줘요. 도대체 어디를 가는데 그래요?”
내가 민망한 마음이 들었다. 나는 일기장을 건네자마자 바로 그녀를 뒤로 하고 떠났다.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서로 공감하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해봤다. 내 마음이 전혀 전달되지 않았고, 나의 절실한 감정에 대해 무신경한 그녀의 태도가 무척이나 실망스러웠다. 차라리 만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그녀와는 비슷한 경험을 나중에 다시 하게 되었다.
다음 날 나는 수걸의 집으로 가기 위해 아침 일찍 나섰다. 이날 벌어질 엄청난 사건으로 인해 1980년 6월 27일은 평생 가도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사는 봉천동에서 금호동 까지는 한참 먼 거리지만 그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었다. 그의 집은 금호동 로타리에서 내려 한참을 걸어 올라간다. 그곳으로 올라가는 나의 걸음 하나하나가 마치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예수 같은 생각마저 들었다. 문을 두드리자 나온 수걸은 나를 보자 다소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웬일이야?” 뻔히 알면서 묻는다.
“너 때문에 내가 골머리를 썩고 있다. 이놈아.”
“왜 네가? 그냥 편하게 받아들이지.”
“너라면 그게 편하게 받아들여지냐?”
“내가 너를 만나러 간 것은 뒤처리 좀 부탁하기 위해서였어. 그런데 이렇게 직접 찾아오니까 할 말이 없다.”
“내가 그냥 뒤처리나 할 사람으로 보였나? 나는 그렇게는 못 하겠다. 내가 너의 마음을 꺾을 수 없다면 너 역시 나의 마음을 꺽을 수는 없을 거다. 내가 며칠 동안 아주 심각하게 고민했다. 결론만 말할게. 네가 하려는 거사에 내가 함께 하겠다.”
“뭐라고? 그건 안돼. 내가 너를 끌어들인 셈이 되잖아.”
“너는 나를 뒤처리용으로 생각한다고 했지만 사실 너도 내가 함께 하기를 바란 것은 아닐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툭 하니 말을 내뱉는다.
“알았다. 그렇게 하자.”
이 말을 시점으로 함께 하기 위한 거사 준비를 일사분란하게 진척시켰다. 이미 거사 일에 현장에서 뿌릴 전단은 수걸이 다 만들어 놓았다. 우리는 각자 주소가 확인되는 친구들 한테 전단지를 우편으로 보내기 위해 주소를 적었다. 나중에 친구들이 놀랠 수도 있어서 미리 알려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우편물을 보내는 과정에서 내가 친구의 이름을 잘못 적어 보낸 것이 있다. 나중에 한 친구가 그런 말을 해줬다. 그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일을 처리하다 보니 나온 실수였다.
다음으로 우리는 몸을 단정히 하기 위해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깍고 대중목욕탕에 가서 목욕도 했다. 이제 마음의 준비도 다 됐다. 우리는 함께 거사 장소인 퇴계로 명동 입구의 지하도로 향했다. 묵직한 전단지를 들고 버스를 탔는데 버스 안 승객들이 다 우리를 주목하는 것만 같았다. 온 시선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특별히 떨리는 감정은 아니었지만, 내가 지금 큰일을 벌이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도로 곳곳에는 무장한 계엄군이 보였다. 잠깐 순간이었지만 나의 미래가 전혀 예측이 되지 않을 정도로 불투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과연 나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종철(철학박사)은 『철학과 비판』(도서출판 수류화개)과 『일상이 철학이다』(모시는 사람들) 그리고 『문명의 위기를 넘어』(공저, 학지원)를 썼다. 그는 『헤겔의 정신현상학』(J. Hyppolite, 1권 공역/2권, 문예출판사), 『사회적 존재론』(G, Lukacs, 2권/4권(공역), 아카넷), 『나의 노년의 기록들』(A, Einstein, 커큐니케이션스북스)등 다수의 번역서들을 냈다. 현재는 연세대 인문학 연구소 전문 연구원이자 인터넷 신문 ‘브레이크뉴스’ 와‘ 내외신문’의 칼럼리스트로 활동하면서 NGO 환경단체인‘푸른 아시아’의 홍보대사를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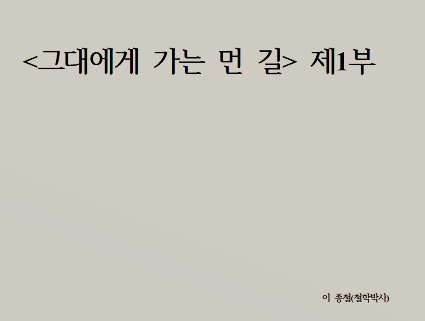


Leave a Reply
Want to join the discussion?Feel free to contrib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