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톤의 <국가> 강해(59) [이정호 교수와 함께하는 플라톤의 『국가』]
플라톤의 <국가> 강해(59)
B. 정의의 실현조건 : 철학과 철학자 왕(474c-502a)
1. 철학자에 대한 정의 : 이데아론에 의거한 규정(474c- 제5권 끝 480a)
(2) 형상적 앎과 믿음
[476e-480a]
* 그저 ‘감각으로 구경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진리 구경하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 소크라테스는 글라우콘에게 전자의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아는 것γιγνώσκειν이 아니고 그저 믿는 것δοξάζειν일 뿐”이라고 우리가 말했을 때 그 사람이 우리의 말이 참τὸ ἀληθές이 아니라고 대드는 경우 어떻게 그 사람을 설득할지를 묻는다. 이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글라우콘으로부터 ‘있지 않은 것’μὴ ὄν은 누구도 알 수는 없으므로 그 사람 역시 ‘무엇인가를 아는γιγνώσκει τὶ 사람’이라는 동의를 받은 다음, 그 사람에게 그가 알고 있는 그 뭔가가 ‘있는 것’ὄν인지 ‘있지 않은 것’μὴ ὄν인지를 묻는 방식으로 ‘그가 아는 그 뭔가’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자 한다.(477a)
* 이에 따라 소크라테스는 아래와 같이 ‘그가 아는 그 뭔가’가 다름 아니라 ‘있는 것’ὄν도 ‘있지 않은 것’μὴ ὄν도 아닌 ‘그 사이에 있는 것’임을 밝힌 후 그 사람의 사고 대상이 그것인 한 그의 사고는 믿음δόξα일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1) ‘완전하게 있는 것’τὸ παντελῶς ὂν은 ‘완전하게 알 수 있지만’παντελῶς γνωστόν ‘어떻게도 있지 않은 것’μὴ ὂν μηδαμῇ 은 ‘어떤 방법으로도 알 수 없다’πάντῃ ἄγνωστον.
2) 그런데 ‘어떤 것이 있기도 하고 있지 않기도 한 상태’τι οὕτως ἔχει ὡς εἶναί τε καὶ μὴ εἶναι라면, 그것은 ‘순수하게 있는 것’εἰλικρινῶς ὄντος과 ‘어떻게도 있지 않은 것’μηδαμῇ ὄντος ‘사이’μεταξὺ에 놓여 있는 것이다.(477a)
3) ‘앎’γνῶσις은 ‘있는 것’을 대상으로ἐπ᾽ 한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무지’ἀγνωσία는 ‘있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다면 이 둘 사이의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앎ἐπιστήμη과 무지ἀγνοία 사이의 것이다. 그것이 곧 ‘믿음’δόξα이며 그것은 앎과 다른 ‘능력’δύναμις이다. 요컨대 믿음δόξα과 앎ἐπιστήμη은 각각 자신의 능력에 따라 서로 다른 것을 대상으로 한다. (477a-b)
* 소크라테스는 위와 같이 앎과 무지와 믿음을 그것들 각각이 갖는 대상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앎과 믿음 모두가 왜 능력이고 그 능력이 어떻게 별개의 대상에 관계하는지를 아래와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능력이란 있는 것들의 한 부류γένος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다른 모든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2) 능력들은 ‘같은 것을 대상으로 같은 일을 해내는 것’을 같은 능력이라고 부르고 다른 것을 대상으로 다른 일을 해내는 것을 다른 능력이라고 부른다. 즉 능력은 대상으로 하는 것과 ‘해내는 일’ὃ ἀπεργάζεται이 능력마다 각기 다르다. 예를 들어 시각ὄψις과 청각ἀκοή은 모두 능력에 속하지만, 시각은 색깔χροάζω이나 모양σχῆμα이나 그 비슷한 것들을 구별하는 능력이고 청각은 그와 달리 들리는 것들을 구별하는 능력이다.(477c)
3) 앎ἐπιστήμη은 일종의 능력으로서 모든 능력 중 가장 강력한ἐρρωμενεστάτην 것이다. 믿음도 능력이다. 그러나 앎은 오류 불가능한 것τό ἀναμάρτητον 이고 믿음은 오류 불가능하지 않은 것τό μὴ ἀναμάρτητον이다. (477d)
4) 앎과 믿음 각각은 본디 서로 다른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서, 서로 다른 것ἕτερον을 대상으로 한다. 앎은 본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아는 일을 할 수 있어서,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믿음은 믿는 일을 할 수 있고 믿음이 믿는 것은 앎이 아는 것과 다른 것이다.(477e-478a) 요컨대 앎과 믿음이 둘 다 능력이되 서로 다른 능력인 한, 앎의 대상과 믿음의 대상이 같은 것일 수 없다.(478b)
* 소크라테스는 위와 같이 앎과 믿음이 별개의 대상에 관계하는 별개의 능력임을 분명히 한 후에 위의 논의들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그 앎의 대상이 ‘있는 것’임에 비교하여 믿음의 대상이 ‘있는 것’과 ‘있지 않은 것’ 사이에 있는 것이며 그에 따라 믿음은 앎도 아니고 무지도 아닌 중간의 것임을 아래와 같이 다시 한번 재확인한다.
1) 앎의 대상γνωστόν은 있는 것τὸ ὂν이고 믿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대상으로 해서 믿음을 가지는 한, 믿음의 대상δοξαστὸν은 ‘어떤 하나의 것ἕν τι’이다. 그런데 ‘어떤 하나의 것’은 ‘어떤 것도 아닌 것’μηδὲν 즉 ‘있지 않은 것’τὸ μὴ ὄν이 아니다.
2) ‘있지 않은 것’에는 믿음이 아니라 ‘무지’ἄγνοια가 할당되고 ‘있는 것’에는 ‘앎’γνῶσις이 할당된다.ἀποδίδωμι(478c) 그런데 믿음은 ‘있는 것’을 믿는 것도 아니고, ‘있지 않은 것’을 믿는 것도 아니므로 믿음은 무지도 앎도 아니다.
3) 그것은 있는 것과 있지 않은 것들 바깥, 즉 명확함σαφήνεια에서 앎을 넘어서거나 불명확함ἀσαφείᾳ에서 무지를 넘어서는ὑπερβαίνουσα 그 양쪽 어느 것도 아니다. 믿음은 앎보다는 더 어둡고σκοτωδέστερον 무지보다는 더 밝은 φανότερον 것 즉 그 둘 사이μεταξὺ에 놓여 있는 것이다.(478c)
4) 믿음이 앎도 무지도 아닌, 그 사이의 것이듯이 믿음의 대상 또한 있는 것이면서 동시에 있지 않은 그런 종류의 것τι οἷον ἅμα ὄν τε καὶ μὴ ὄν으로서 ‘순수하게 있는 것’과 ‘전적으로 있지 않은 것’ 사이의 것이다.(478d) 양 끝에 있는 것들에게는 양 끝에 있는 것들을 할당하고, 사이에 있는 것들에는 사이에 있는 것들을 할당해야 한다.(478e)
* 소크라테스는 위와 같이 언급한 후 처음에 제기되었던 물음으로 돌아가 결론적으로 ‘진리 구경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그저 감각으로 구경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떤 차이를 갖는지 그리고 왜 진리 구경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진정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φιλόσοφος 즉 철학자인지를 아래와 같이 밝힌다.
1) ‘구경하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움 자체, ‘언제나 동일하게 한결같은’ἀεὶ κατὰ ταὐτὰ ὡσαύτω 상태로 있는 아름다움 자체의 형상ἰδέα이란 전혀 없다고 생각하면서 많은 아름다운 것들, 많은 정의로운 것들을 믿는다. 그러나 이들이 믿는 아름다운 것들은 어느 면에서 아름다운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어느 면에서 추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는 것이 필연적이다.(479a) 큰 것들과 작은 것들, 가벼운 것들과 무거운 것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것들은 모두 항상 반대적인 것ἢ τἀναντία으로 불리면서 양쪽 모두에 관계한다.(479b)
2) 이 많은 것들(ta polla) 각각은 잔치 자리ἑστίασις에서 이야기하는 것들과 마찬가지로 애매해서, 이것 중 어느 것도 확실하게 있다거나 있지 않다고, 또 둘 다이거나 둘 다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없다. 이것들을 놓아둘 자리는 있음과 있지 않음의 중간이다. 이것들은 더 있지 않음과 관련해서 있지 않은 것보다 더 어두운 것으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며, 더 있음과 관련해서 있는 것보다 더 밝은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다.(479c) 요컨대 아름다움이나 그 밖의 것들에 대해 많은 사람이 ‘관습적으로 생각하는 많은 것들’πολλὰ νόμιμα은 있지 않은 것과 순수하게 있는 것 사이 어딘가를 맴돌고 있다κυλινδεῖται. 그것은 앎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고 중간에서 떠도는 것으로서 중간의 능력으로 포착되는 것이다.(479d)
3)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구경하면서 아름다움 자체는 보지도 못하고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그런 사람들은, 온갖 것들을 믿으면서δοξάζειν 그들이 믿는 것들 중 어떤 것도 알지는 못한다. 그러나 ‘각각 그 자체의 것들’이며 ‘언제나 동일하게 한결같은 상태로 있는’ἀεὶ κατὰ ταὐτὰ ὡσαύτως ὄντα 것들을 구경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한다.γιγνώσκειν 이들은 앎이 대상으로 하는 것들을 반기고 사랑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대상으로 하는 것을 반기고 사랑하며 아름다운 소리나 색깔이나 그런 것들을 사랑하고 구경하지만 아름다움 자체를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지는 않는다.(479e-480a)
4) 그러므로 각각의 있는 것 자체αὐτὸ ἕκαστον τὸ ὂν를 반기는ἀσπαζομένους 사람들은 믿음을 사랑하는 사람φιλόδοξος이 아니라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즉 철학자φιλόσοφος라고 불러야 한다.(480a)
——————————————
* 위의 논의에 따라 철학자와 감각으로 구셩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차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 앞의 강해에서 살폈듯이 철학자가 사랑하는 진리는 곧 형상(形相)에 대한 앎이다. 요컨대 진정한 앎의 대상은 형상이고 형상은 곧 ‘있는 것’, ‘(완전하게) 순수하게 있는 것’, ‘완전하게 알 수 있는 것’, ‘오류 불가능한 것’, ‘언제나 동일하게 한결같은 상태로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감각으로 구경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사고 상태는 진리로서 앎(epistēmē)이 아니라 ‘믿음’에 불과하다. 사실 믿음의 그리스 원어 doxa는 기본적으로 ‘(옳건 그르건) 일상인들이 수행하는 모든 생각과 의견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런데 플라톤은 텍스트 곳곳에서 doxa를 존재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인식 차원에서 진정한 앎과 철저히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 말은 종종 ‘억견’이나 ‘상상’ 등의 말로 옮겨지기도 한다. 플라톤이 사용하고 있는 앎과 믿음이라는 말의 이러한 용례만 보더라도 철학사에서 왜 그를 두고 이른바 예지계와 현상계를 철저히 구분하는 두 세계 이론 즉 이원론적 세계관의 선구라고 평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선 강해에서 살폈듯이 플라톤이 그와 같은 세계관을 내 세운 근본적인 동기가 현실 세계의 다(多)와 운동을 철학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현실 구제론에 있음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말들의 용례와 세계관에 대한 이해 또한 근본적으로 그에 상응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고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 다시 말해 플라톤의 세계관에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주목해야 할 핵심은 예지계와 현상계, 앎과 믿음을 구분했다는 것 이전에 왜 플라톤은 그 예지계를 구성하는 형상들을 하나가 아닌 여럿으로 상정했을까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다. 그것은 앞서도 누차 언급했듯이 엘레아주의자들에 의해 부정된 다의 세계로서 자연세계와 현실 세계의 존재성을 철학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여러 형상들의 존재는 그것의 모상(模像)으로서 다의 세계의 존재성을 뒷받침 할 수는 있어도 그것으로 변화무쌍한 다의 세계의 운동성까지 해명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플라톤은 현실 세계의 다의 운동성을 해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생성 소멸하는 물질적 운동성도 부동의 형상과 더불어 우주 발생의 시원적 원인들의 하나로 상정하게 된 것이다. 플라톤의 이원론적 세계관의 배경에는 이처럼 다의 세계이자 운동하는 세계로서 자연 및 현실 세계를 철학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동기가 깔려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플라톤의 세계관은 근본적으로 다와 운동을 자연세계의 시원적 토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리스의 전통적 세계관을 일정 부분 계승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해 플라톤의 세계관은 종축에서 보면 위와 아래 예지계와 현상계를 가르는 이원론이지만 횡축에서 보면 마치 그리스의 신화가 그러하듯이 여럿들이 상호 공존하고 있는 다원론적 세계관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플라톤의 세계관을 두고 이원론인가 다원론인가를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플라톤의 가장 최종적이고 원숙한 세계관을 표방하고 있는 <티마이오스>를 보면 우주 생성의 세 가지 근본 원인(aitia)들로서 형상인 원상(paradeigma)과 수용자이자 보조원인(synaitia)인 질료적 공간(chora), 그리고 제작자 데미우르고스(Demiourgos)가 제시되고 있는데 적지 않은 학자들이 이 점에 주목하여 플라톤의 세계관을 3원론으로 규정짓기도 한다. 그리고 종국적으로 플라톤에게서 ‘좋음의 이데아’가 최상이자 유일의 유적 형상으로 제시된다는 점에서 신플라톤주의자나 교부철학자들은 플라톤의 철학을 아예 일원론의 관점에서 해석하기도 한다.
* 그런데 플라톤의 현실구제론이 단순히 자연 세계의 존재성과 운동성만 해명하는 것이라면 원자론이 이룩한 철학적 의의와 크게 다를 게 없다. 원자론은 원자들과 그것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으로서 허공의 존재성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존재성과 운동성을 함께 해명하였지만, 영원히 운동하면서도 조화와 질서라는 합목적적 가치를 함께 보전하고 있는 그리스적 우주, 즉 코스모스를 온전히 뒷받침할 수는 없었다. 이에 따라 플라톤은 형상계와 운동하는 현상계를 따로 구분하되 그 현상계가 형상계와 완전히 분리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이른바 분유(分有, metechein)와 모방의 방식으로 밀접하게 상호 연관된 것으로 파악한다. 즉 물질적 현상계는 형상들의 세계인 예지계의 모상으로서 예지계가 지니는 존재성을 일정 부분 분유함으로써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모방의 방식으로나마 조화와 질서를 갖춘 코스모스의 한 축이 되는 것이다. 요컨대 플라톤의 현상계는 형상계와 비교하여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존재론적으로나 인식론적으로 끊임없이 생성 변화하면서 존재성이나 앎의 근거가 크게 부족한 세계이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형상의 분유치로서 일정한 존재성을 지니는 것으로서, 현상계의 물질적 운동성에 역행하는 영혼의 설득(peithos)(<티마이오스> 48a, c, 51e, 70b)을 받아들여 최대한 형상 세계에 다가갈 수 있는 토대 즉 형상과 닮을 가능성도 함께 갖춘 세계인 것이다.
* 이곳 논의 부분에서 플라톤이 믿음의 대상을 ‘있는 것도 있지 않은 것도 아닌 그 사이에 있는 것’, ‘관습적으로 생각하는 많은 것들’, ‘항상 반대적인 것으로 불리면서 양쪽 모두에 관계하는 것’, ‘있지 않은 것과 순수하게 있는 것 사이 어딘가를 맴돌고 있는 것’ 등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도 위와 같은 근본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이른바 그것은 존재론적으로 ‘존재도 무도 아닌 제3의 것’으로서 물질적 타자성(heteron)에 의해 언제나 생성 변화하는 속성을 가진 ‘무한정자(apeiron)’인 것이다. 그러나 앞서도 여러 번 강조했듯이 플라톤에게 현상계로서 현실은 극단적 일원론자들에 의해 백안시될 수 없는, 그 자체로 수많은 여러 것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서로 관계를 맺으며 공존하고 있는 세계이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러한 현상계의 구제를 위해 바로 그러한 무한정자에 분유의 형식으로 존재성도 함께 부여함으로써 현실세계가 자기동일성의 차원까지 상승할 수 있는 존재론적 근거를 함께 구축하기에 이른 것이다. 요컨대 존재도 아니고 무도 아닌 것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엘레아주의의 극단적 이분법에 의해 촉발된 허무주의가 극복될 수 있는 가능적 토대가 확립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우리나라 서양고대철학의 태두 박홍규(1919-1994)는 위와 같은 믿음의 대상으로서 존재도 아니고 무(無)도 아닌 것 즉 무한정자에 대한 존재론적 이해가 플라톤의 철학을 이해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그의 전집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다. 그 사례들을 꼽자면 수도 없지만 하나의 예로서 그의 논문 <유티데모스편에 대한 분석>은 이러한 지상세계에 대한 소피스트들의 엘레아주의에 기초한 이분법적 독단이 어떻게 현실 허무주의를 조장하는지를 그 자신의 무한정자에 대한 존재론적 이해를 기초로 탁월하게 풀어내고 있다. 소피스트들은 엘레아의 논리를 토대로 모든 현실의 다와 운동을 무로 돌리지만 무한정자의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무조건적인 부정과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가능성의 영역에서 다양한 측면과 정도 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배움을 통해 일정한 변화 즉 교정이 가능한 영역인 것이다. 즉 존재와 무 사이의 것으로서 무한정자는 타자성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플라톤에게 현실 허무주의의 타파를 위한 가능성의 토대이기도 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부분에서 제시된 믿음의 대상이 갖는 내적 무한정성을 단순히 부정적인 관점에서 그저 해체의 원인으로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 부분의 논의는 현실의 삶에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의 보전을 위해 사용하는 사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믿음과 그 대상을 고찰하되, 그것의 한계는 물론 그 반대로 최대한 형상적 앎에 근접할 수 있는 내적 가능성도 함께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플라톤의 말대로 형상에 대한 진정한 앎에 대한 인식이 변증술을 익힌 소수 철학자들의 직관적 통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면, 믿음의 영역은 현실의 삶의 보전을 위해 일상의 장인(demiourgos)들이 수행하는 일반 기술 내지 학술들(technai)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그것이 갖는 실제적 앎으로서 가치는 결코 낮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이곳 논의에서는 인식과 관련하여 앎과 믿음이 아주 배타적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이어지는 선분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면 앎과 믿음 사이에 추론적 사고의 단계(dianoia)가 자리하는데 이 추론적 사고 단계마저 존재론적 측면에서 보면 형상적 앎 보다는 믿음 쪽에 더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수학적 앎은 일단 자체성(kath’ hauto)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천적으로 형상적 앎(epistēmē)이 아니고 이곳 논의에서 보듯이 형상적 앎이 아닌 그 모든 것은 예외없이 모두 믿음(doxa)으로 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선분의 비유에서 그것(dianoia)은 믿음과도 분명 구분되지만 최소한 존재론적 관점에서 보면 구분의 정도에 있어 그것과 형상 사이의 거리는 그것과 개별 학술적 대상 사이의 거리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전자의 거리는 초월적이지만 후자는 최소한 근접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믿음은 지적 훈련을 통해 일반 기술 내지 학술지를 거쳐 점차 경험적 물질적 연장성을 줄여가는 그 만큼 자기동일성(tauton)을 담보하는 추론적 사고 상태(dianoia)에까지 최대한 근접할 수 있지만, 형상적 앎은 고도의 철학적 훈련을 통해 변증술을 갖춘 아주 소수의 철학자들 아닌 한 인식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믿음의 원어인 doxa를 우리말로 단순히 ‘억견’이나 ‘억측’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믿음은 아래로는 환상이나 상상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믿음을 인식 수준에서 점차 상승하는 쪽으로 보면 그것은 이른바 ‘올바른 믿음’(orthē doxa)과 ‘대중적 덕’의 토대가 되기도 하고 또 개별 기술지(technai)를 비롯해 수학적 기하학적 지식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수학이나 기하학은 비감각적 지식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형상적 앎의 측면도 갖고 있다. 그러나 공간적 연장성을 수반하는 도형들의 사용은 물론 별도의 증명 없이 수와 공리의 존재를 전제(hypothesis)하고 들어 간다는 점에서 그것은 어떠한 연장성도 전제도 갖고 있지 않은 무전제의 원리(archē anypothtos)인 순전한 형상지로서 철학과는 원천적으로 구별되는 것이다.(510b) 구상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 수학적 대상은 형상적 앎의 대상에 닿아 있지만 마치 당구공들이 서로 닿아 있어도 서로가 분리되어 있듯이 형상적 앎의 대상에 속한 것은 아니다. 아무려나 이런 의미에서도 현상계의 믿음의 대상들과 믿음이 갖는 가치는 결코 폄하할 수 없다. 그것은 앞서 언급한 일반 기술 내지 학술들이 그렇듯이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그 최상의 수준에까지 고양될 경우 우리 모두가 추론과 정합을 통해 정립하고 있는 실질적인 개별과학의 진리성으로서 자기동일성까지 확립 가능한 일종의 일반 법칙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플라톤이 주장하고 있듯이 자기 동일성은 형상의 자체성까지는 이르지 못한다는 점에서 자기 동일성에 기초한 개별학술들 내지 개별 과학은 본질적으로 개연성 이상을 넘어서지 못한다. 20세기가 낳은 걸출한 이론 물리학자이자 과학철학자 하이젠베르크(W. K. Heigenwerg)가 제기한 불확정성 원리(Uncertainty principle)가 플라톤 철학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무려나 앎과 추론적 사고, 믿음과 관련해서는 학자들 간 해석 상 많은 견해차와 논란을 안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나중 선분의 비유(509c-513e)를 다루면서 보다 자세히 다루게 될 것이다.
* 이렇듯 믿음은 위쪽으로 비록 기초적인 수준이지만 추론과 정합적 사고를 포함하는 일반 기술지에서 시작하여 최상의 수준에서는 수학, 기하학의 추론적 사유에까지 다가갈 수 있지만, 그것을 제외한 상투적 믿음 수준에서는 그야말로 억측이나 환상에 불과한 상상에까지도 추락할 수 있다. 즉 믿음의 대상이 ‘있지 않은 것과 순수하게 있는 것 사이 어딘가를 맴돌고 있는 것’이라는 말은 그 믿음이 본질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양상의 측면을 갖는 가능성의 영역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중 없는 것 쪽으로 해체될 가능성의 경우는 존재 쪽으로의 극복과 상승의 측면에서 보면 내용적으로 우연성이 증대되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러한 물질적 무한정자는 그 자체 맴돌면서 그 우연성을 어떻게든 증대하는 게 필연적 속성이라는 점에서 <티마이오스>에서는 그것을 ‘방황하는 원인(planōmenē aitia)’이라 칭하면서도 동시에 역설적으로 ‘필연(ananchē)’이라고 부르기도 한다.(<티마이오스> 48a) 이런 점에서 형성과 해체 양쪽으로 열려 있는 무한정자의 내적 가능성은 양상론적으로 능력(dynamis)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무한정자의 영역에서는 능력에 따라 이렇게도 저렇게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플라톤이 이곳에서도 앎과 더불어 믿음을 능력으로 언급하고 그 능력이 적용되는 대상을 구분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형상적 앎(epistēmē)은 한결 같이 그 자체적인 것으로 일자적으로 존재하지만, 믿음은 앎과 무지의 중간자로서 앎에는 비록 미치지 못하지만 능력과 양상에 따라 위로는 추론적 사고(dianoia)에 까지 상승할 수도 있고 반대로 억측이나 환상(eikasia)의 수준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짐작하겠지만 이러한 앎과 믿음이라는 능력의 주체는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영혼(psychē)이다. 즉 앎과 믿음은 영혼의 능력이되 그것이 영혼의 능력 안에서 앎과 믿음으로 갈리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각자 갖고 있는 영혼의 능력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영혼은 무한정자의 타자성이 비록 운동과 변화를 담보하지만, 그 힘을 설득하여 다를 해체하는 쪽이 아니라 보전하는 쪽으로 현실화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연히 그 능동적 힘, 즉 포이운(poioūn)으로서 능력의 지향 방향 즉 해체를 거슬러 가장 완전하게 복구해야 할 보존의 근본 지향 내지 목표는 다름 아닌 형상(eidos)이다. 그러나 이것을 플라톤 형상론이 목적론적 성격을 갖는 근거로 이해해서도 안 된다. 플라톤에게 목적은 능력에 따라 다다를 수도 있고 다다르지 못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이 결정론적이라면 플라톤의 목적은 비결정론적인 것으로서 다만 가능적인 것일 뿐이다. 그리고 믿음의 영역에서 확립 가능한 자기동일성 또한 영혼의 힘을 토대로 무한정성의 지배를 거슬러 올라 형상적 앎에 근접했을 경우 획득 가능한 최상 수준의 인식 값이다. 그러나 그곳에는 물질적 타자성(heteron)도 포함되어 있다. 물질적 타자성은 영혼의 힘을 거부하고 무한정성 고유의 성질이 극도로 발현된 상태 즉 언제나 무로 향하는 해체의 원천이다. 그러나 자기동일성의 측면이 강화될수록 앎에로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타자성의 측면이 강화될수록 우연성과 해체성이 증가한다. 이것들을 존재론적 위계로 구분해 본다면 일자적 자체성이 확보된 형상이 가장 우위에 있고 그다음이 능동자 포이운(poioun)으로서 영혼 그리고 가장 아래에 무한정자가 위치하지만, 가능성의 토대가 무한정자인 한, 믿음 영역 또한 상승과 허무주의의 극복을 위한 분투 어린 삶의 영역으로서 결코 방기할 수 없는 철학함의 실질적인 현장이라 아니 할 수 없다.
* 물론 그러한 분투를 통한 영혼의 내적 고양 단계에서 그야말로 철학적 변증술을 통해 형상에 대한 직관적 통찰의 수준까지 고양되지 않을 경우, 사고 상태는 그저 믿음의 영역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형상적 앎과 믿음은 모두 영혼 능력의 연속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그 형상적 앎은 그 영혼 능력의 고양을 통해 믿음의 영역을 초월해야 획득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형상적 앎에 이른 철학자가 믿음의 영역 즉 현실에서 떠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떠날 수도 없다. 다만 철학자는 믿음이 갖는 본질적 성격을 인지한 상태에서 현실을 새롭게 이해하고 그 믿음을 앎으로 여기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진리를 토대로 모두가 정의롭고 행복한 나라를 바라는 자신의 본성적 욕구에 따라 고통스러운 등에의 역할을 자임하게 되는 것이다.
* 변증술을 통해 형상적 앎을 획득한 철학자가 믿음이 지배하는 현실의 삶의 영역에 왜 실천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의 문제는 그것이 과연 철학자의 근본 욕망으로서 관조적 본성과 일치하는가의 문제와 함께 플라톤 연구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있다. 그러나 논의가 전개될수록 플라톤 철학의 실천철학적 성격은 갈수록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곳에서 제시된 진리를 관조하기를 좋아하는 철학자와 보통 사람들의 구별, 형상적 앎과 믿음의 구별 즉 형상이론의 근본 틀은 플라톤 존재론의 기본 원칙과 시작을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 플라톤은 이것을 기점으로 이 이후에 제시되는 태양의 비유와 선분의 비유, 동굴의 비유 등을 통해 이러한 기본적인 존재론적 원칙을 토대로 철학의 기본 구상들을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대해간다. 다소 거칠게 그 내용들의 성격을 미리 요약하자면 태양의 비유는 좋음의 이데아를 통해 철학 통치자가 종국적으로 지향해야할 총체적인 가치와 합목적성을 보여주며, 선분의 비유는 이곳에서 논의한 앎과 믿음의 세분화를 통해 좋음의 이데아에 이르기까지의 인식론적 위계 내지 기본틀을 보여주고, 동굴의 비유는 선분의 비유의 위계에 상응하는 인식과 실천의 단계들을 통해 현실 영역의 실상은 물론 철학자가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분투의 여정을 보여줌과 동시에 왜 형상적 앎을 이룩한 철학자가 왜 종국적으로 동굴 속 현실의 세계로 다시 내려가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비유들은 모두 플라톤 철학의 종착점이 왜 현실의 구제를 위한 실천의 철학인지를 하나같이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각각의 있는 것 자체를 반기는 사람들은 믿음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즉 철학자(philosophos)라고 불러야 한다’는 이곳 논의의 결론(480a)이자 제5권의 마지막 문구는 차후에 펼쳐질 논의를 통해 여전히 철학자들이 통치하는 이상국가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 자들을 향한 선전포고이자 차후의 구상을 예고하는 선제적 선언인 셈이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어질 제6권에서 위와 같은 철학자들의 기본 성향과 자질들을 다시 한번 정리 제시한 다음, 승리의 요건으로서 지피지기가 중요하듯 그러한 철학자들을 혐오하고 비난하는 현실의 실태들과 그 이유들을 분석적으로 비판한다.
* 끝으로 이곳 논의에서 언급된 무지agnōsis에 상응하는 대상은 ‘있지 않은 것to mē on’이지만 실제 사람의 경우 전적으로 모든 면에서 무지한 사람은 없다는 점에서, 설사 억측을 밥 먹듯 일삼고 있는 자일지라도 믿음의 영역에 있는 한, 무지한 사람은 아니다. 요컨대 현실에서 일정 부분 무지한 사람은 있어도 전 영역에서 전적으로 무지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철학적 앎을 획득한 사람이라면 몰라도 모두가 서로 일정 부분 옳고 그른 생각을 지니고 있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모든 사람의 생각에는 다양한 측면들이 포함된 한에서 일방적으로 매도되어선 안 된다. 소피스트들은 엘레아주의의 이분법을 토대로 그 다양한 측면들을 어느 한쪽으로 매도하는 방식으로 모든 현실 판단에 대한 회의를 부추겼다. 그러나 현실 판단 모두가 상대적이고 회의적인 것은 아니다. 믿음의 영역은 수많은 대립적인 것들과 측면들이 혼재하는 영역으로 영혼의 능력과 수준에 따라 보다 ‘앎’에 가까운 믿음도 있고 ‘무지’에 가까운 믿음도 있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는 일이야말로 삶의 보전을 위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철학함의 중대하고도 실질적인 관건이 아닐 수 없다. 플라톤에 따르면 그것을 분별하는 능력은 영혼을 고양하는 철학적 훈련을 통해 길러진다. 그러므로 철학 공부는 개인으로서건 시민으로서건 좋은 삶의 필수 조건이다. 그럼에도 플라톤의 관점에서 굳이 현실에서 가장 많은 측면에서 가장 무지한 자를 꼽으라면 인간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통치 영역에서 자신의 무지조차 모른 채 자신의 이기적 욕망에 따라 반지성적 전횡을 일삼는 자라 할 것이다. 그러한 무지한 통치자야말로 인간 삶에 가장 위해를 가하는 자로서 철학자가 가장 비판하고 지탄해야 할 대상이다. 그러므로 직업으로서 철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아니라 최소한 철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러한 통치의 종식을 위해 힘을 기울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책무가 아닐 수 없다. 2024년 2월 한국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경우 가히 그 책무는 너무나 절실하고도 시급하게 요구된다. “윤석렬은 탄핵되어야 한다.”는 우리들의 외침과 저항 또한 그 당연한 책무의 하나이다.
* 이곳 논의는 형상론에 대한 원칙적인 논의로서 <국가>에서 처음 제시된 곳이기는 하지만 앞서도 언급했듯이 이곳 논의 말고 형상론과 관련한 논의는 플라톤 대화편 전체에 두루 걸쳐 있다. 그러므로 일단 이곳에서는 형상론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보다는 그것에 접근하면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소개하고 앞으로 형상론 관련 논의가 나올 때마다 다른 대화편의 내용도 함께 연관해 가면서 추가로 논의 사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로 플라톤 대화편 전체에서 형상론과 관련한 논의가 제시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플라톤의 대화편 형상(이데아)론 관련 전거들
<라케스> 191e, 192a
<에우튀프론> 54d
<고르기아스> 467e, 506d
<대히피아스> 289d, 292a, 293e, 294a, 298b, 300a, 303a
<뤼시스> 217b, d
<에우튀데모스> 280b, 301a
<메논> 72c, 72d. 72e
<크라튈로스> 389b, 390a
<향연> 204c, 211b
<파이돈> 74d, 75b, 78d, 100b, 103e, 104b, d, e, 105a
<국가> 402c, 434d, e, 435a, b, c, 476a, d, 500e, 510b, d, e, 511a
<파이드로스> 237d, 250a, b, 265e
<파르메니데스> 149e, 150a, 159e, 158b, c, 160a
<테아이테토스> 203e
<소피스테스> 228c, 247a, 252b, 260e
<티마이오스> 28a, 29b, c, 29b, 39e, 48e, 49a, 50c, d, 51a, c, 52c,
<필레보스> 16d, 25b
* W. D. Ross, Plato’s theory of Ideas, Chp. 17th, Oxford 1951
(W. D. 로스, 김진성 역, 『플라톤의 이데아론』, 누멘 2011, 259쪽)
이상으로 제5권 끝
다음 주제: 2. 철학자의 자질(제6권 484a-487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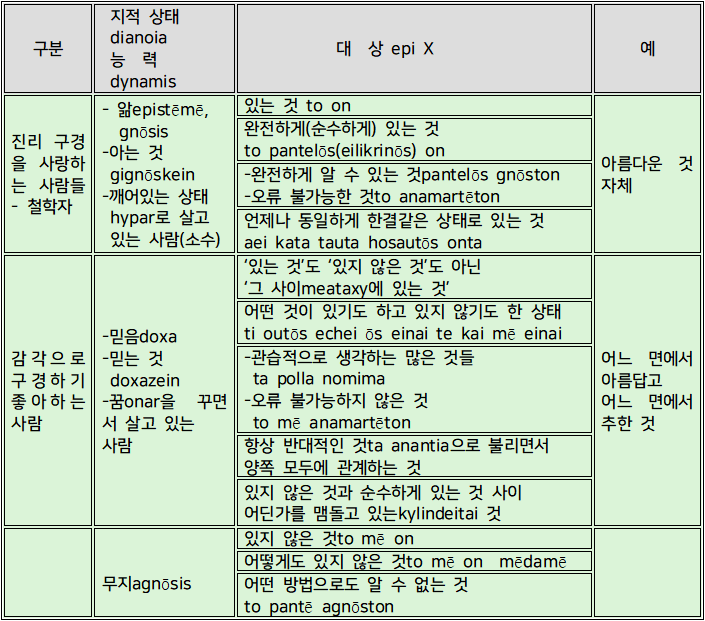


Leave a Reply
Want to join the discussion?Feel free to contrib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