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고상한 ‘존재’와 ‘무’가 아니고 흔해빠진 ‘있다’, ‘없다’인가?[철학을다시 쓴다]-28-5
왜 고상한?‘존재’와?‘무’가 아니고 흔해빠진?‘있다’, ‘없다’인가?[철학을다시 쓴다]-28-5
윤구병(도서출판 보리 대표)
*이 글은 보리출판사의 허락을 받아 게재한 것임을 알립니다.
여기에서 이야기가 더 얽히기 전에 저는 파르메니데스가 한 유명한 말로 되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없는 것은 아예 없으므로 없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도 없고 따라서 말도 할 수 없다.’는 말 말입니다. 파르메니데스는 분명히 ‘없는 것은 없다.’고 말했는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없는 것이 있다.’는 말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의 뜻이 ‘빠진 것이 있다.’임을 확인했습니다. 일이 이쯤 되면 파르메니데스의 말이 틀렸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쓰는 말이 틀렸거나, 그도 저도 아니면 파르메니데스가 쓴 ‘없는 것’이라는 말과 우리가 쓰는 ‘없는 것’이라는 말이 다르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 세 경우 가운데 어느 것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문제를 따지는 데는 앞에서 우리가 한 말도 염두에 두어야 하겠지요. 없는 것이나 없다는 말이 없으면 우리는 이것과 저것이 다르다거나 이것은 저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쓸 수 없고, 따라서 이것과 저것을 갈라 보는 분석뿐만 아니라, 거기에 바탕을 두고 있는 사고와 그 사고의 표현인 언어생활조차 불가능해진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르메니데스가 없는 것은 없다고 했을 때 쓴 ‘없는 것’이라는 말은 말하자면 ‘허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없음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우리는 없음 바로 그것을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파르메니데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없는 것이라고 할 때 우리는 없음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빠진 것을 가리킵니다. 그림 7을 다시 보아 주십시오. 여기에 최초의 무규정적인 것 ㄱ의 왼쪽과 오른쪽으로 한없이 많은 무규정적인 것들이 줄을 서 있지 않습니까? 당분간 있음 바로 그것인 맨 왼쪽의 있는 것과 없음 바로 그것인 맨 오른쪽의 없는 것을 보지 말고 그 사이에 있는 것들에만 주의를 기울이기로 합시다. 그리고 ㄱ의 왼쪽으로 줄지어 있는 것들을 있음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아 있는 것들이라고 하고 ㄱ의 오른쪽으로 줄지어 있는 것들을 없음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아 없는 것으로 봅시다. 여기에서 우리는 있는 것 쪽으로 향하는 무규정적인 것들의 움직임이 충만(있는 것은 하나로 있고 없는 것이 그 안에 하나도 없다는 점에서 가득 찬 것이기 때문에)을 지향하고 있고, 없는 것 쪽으로 향하는 무규정적인 것들의 움직임이 결핍(아예 하나도 있는 것이 없고 비어 있는 허무로 향하기 때문에)을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 안에 들어 있는 더 깊은 뜻은 나중에 파헤쳐 보기로 하고 우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예 없는 없음 바로 그것이 아니라 무규정적인 것 ㄱ에서 없는 것에 이르는 사이에 들어 있는 무한히 많은 저마다 다른 정도의 빠짐을 지닌 빠진 것들이라고 합시다. 왜 이런 제안을 하느냐 하면 철학의 역사에서 ‘없는 것’을 ‘없음 바로 그것’으로 놓고 벌여 왔던 많은 논쟁이 소모적일 뿐 아무런 생산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서 성급하게 한 마디 끼워 넣자면, 없음 바로 그것이나 있음 바로 그것은 학문의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논쟁거리가 못 됩니다. 학문의 대상은 있는 것과 맞닿아 있어서 있는 것과 같은 것에서 없는 것과 맞닿아 있어서 없는 것과 같은 것 사이의 무한히 많은 무규정적인 것들입니다. 말하자면 학문은 규정하는 것[definition : 이것을 정의(定義)라고 합니다. 끝, 한계(peras)를 드러내는 작업이라는 뜻이지요.]인데,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나 이성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 이미 다 규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따로 머리를 싸매고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과 저것은 어떻게 다르냐? 따위의 질문을 할 필요도 없고, 따라서 학문의 탐구는 부질없는 노릇이 되고 맙니다.”
여기까지 말하다 보니, 이야기가 너무 거창해져서 잘못하면 학생들이 허공에 한눈을 팔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지도 모르겠다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그 기타 줄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로 이어져서 50센티미터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강철선 말입니다. 저는 그 기타 줄을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차례로 짚어 튀겨 가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 기타 줄에는 무한히 많은 소리들이 숨어 있습니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소리들은 규정되지 않았고, 따라서 겉으로 보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기타 줄 안에 소리가 아예 하나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타 줄을 차례로 짚어서 튀기면 숨어 있던 소리가 밖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없던 소리가 생겨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없던 소리가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줄을 짚어서 튀겼기 때문이 아니냐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줄을 짚어서 튀긴다는 행위는 무엇을 뜻할까요?”
“그만큼 줄을 끊어 냈다는 것 아닙니까? 잘라 버렸다는 뜻은 아니고요.”
한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저는 얼른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렇죠! 이어진 줄을 어느 부분에서 잘라 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진 것을 잘라 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어진 것, 연속된 것은 한계가 없다는 점에서 무규정적인 것 아니에요? 그것을 끊어 냈으니 그만큼 한정시켰다는 뜻이겠지요.”
다른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학생이 몹시 귀여운 나머지 입이라도 맞추어 주고 싶었습니다. 예쁜 여학생이어서 더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지요.
“한정시켰다? 좋은 말입니다. 그 결과 무엇이 드러났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제까지 들을 수 없었던 새로운 소리요.”
어느 학생이 곧 대답했지만 그 대답은 제가 바란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기타 줄이라는 것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이어져 있는 모든 것, 다시 말해서 길이까지 포함해서 크기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그것들을 끊어 내면 무엇이 나타나지요?”
그제야 학생들은 내가 듣기를 바라는 대답이 무엇인지를 알아챈 듯했습니다.
“아아, 알았습니다. 새로운 끝, 한계, 페라스(peras)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기타 줄을 끊어 내는 순간 이어져 있던 것이 끊어져 숨어 있던 끝이, 한계가 밖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일정한 진폭과 진동수와 음색을 지닌 소리와 함께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것의 끝이, 한계가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지 알면 소리가 되었든 모습이 되었든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를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일차원의 세계에 있는 줄〔line〕을 머릿속에 그려 봅시다. 이 줄을 끊어 내면 거기에서 새로운 끝이 나타나는데, 일차원의 줄이므로 이렇게 해서 얻어 낸 끝〔peras〕은 하나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양쪽에 하나씩 새로운 끝이 생겨났다고 해야 하겠지요. 여기에서 중요한 낱말은 하나라는 낱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있는 것은 하나로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있는 것이 왜 하나로 있는지 증명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의 끝이 나타나자마자 이것은 규정된 것(끝, 한계가 보인 것)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 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자 학생들은,
“어려운데요.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요.”
하고 요구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학생들의 감각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 있는 교탁을 번쩍 들었다가 제자리에 놓으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들어 보인 이 교탁은 한 개지요?”
학생들은 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너무나 뻔한 질문을 너무나 진지하게 하는 제 모습이 그렇게 우스웠나 봅니다.
“당연히 하나지요.”
학생들이 대답했습니다.
“정말 하나인 것이 그렇게 당연한가요? 왜 그렇게 당연하지요?”
제가 물었습니다. 학생들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감각적으로 너무나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되물으니 할 말이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아까 들어 보였던 것처럼 이 교탁은 삼차원 공간에서 다른 어떤 것과도 이어져 있지 않지요? 이 교탁이 놓여 있는 교실 바닥과도 떨어져 있고, 이 교탁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와도 떨어져 있지요? 다시 말해서 이 교탁은 이 교탁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과 끊어져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앞 뒤, 아래 위에서 이 교탁의 끝을, 한계를 눈으로 볼 수 있지요? 이렇게 삼차원에서 다른 어떤 것과도 끊어져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탁을 하나의 교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탁은 하나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이것은 교탁이다.’ ‘저것은 책이다.’ ‘그것은 연필이다.’와 같이 어떤 것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것의 끝을 보고, 그 끝에서 다른 모든 것과 떨어져 있어서 하나로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하나가 서로 떨어져 있지 않으면 여럿이라는 말은 쓸 수 없습니다. 하나가 없으면 여럿도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초의 하나는 있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어떤 것을 하나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있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알다시피 하나는 단위입니다. 단위(單位)라는 한자말은 영어로는 유니트(unit)인데, 이 유니트라는 말은 라틴어의 ‘우누스(unus)’, 곧 하나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물질의 단위, 생명의 단위, 공간의 단위, 시간의 단위, 운동의 단위, 입자의 단위…… 이렇게 모든 것의 최소 단위를 찾아 헤매는 것은 모든 복합체들이 이 단위, 곧 하나로 되어 있어서, 하나만 찾으면 그 하나로부터 전체를 알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곁다리 이야기는 애초에 플라톤이 데미우르고스를 시켜서 만든, 우주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늘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플라톤의 우주로 돌아가기로 하지요. 제가 학생들에게 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앞에서 플라톤의 데미우르고스가 ‘되는 것’[gignomenon, genesis : 이 말을 흔히 생성(生成)이라고 번역하는데, 독일 말로는 베르덴(werden), 영어로는 비커밍(becoming)으로 흔히 번역하는 것으로 보아 되는 것 또는 됨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을 이리저리 버무려 ‘같은 것[tauton〕’과 ‘다른 것[heteron〕’의 띠를 만들고 같은 것의 띠는 밖에 두르고 다른 것의 띠는 같은 것의 띠와 엇갈리게 해서 안쪽으로 둘러 이 우주를 질서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려다가 같은 것과 다른 것이라는 말에 걸려 곁길로 새고 말았는데요,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하기로 하지요. 플라톤의 우주론에 관해서는 저보다 훨씬 더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 많은 학자들, 특히 그 가운데서도 영국의 콘포드나 테일러, 또 프랑스의 브리송 같은 사람이 미주알고주알 자세히 해설해 놓은 터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중언부언한다면, 그것은 마치 잘 그려 놓은 뱀의 몸뚱이에다가 다리를 그려 넣겠다고 부산을 떠는 꼴이 되기 십상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하려는 것은 플라톤의 우주론이 지닌 존재론적인 의미(이렇게 쓰다 보니 정말 뭐 같아 보이는데, 겁먹지 않아도 됩니다.)에 연관된 토막 이야기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려 둡니다. 플라톤의 데미우르고스가 같은 것(또는 같음)의 띠로 둘러싼 이 우주의 밖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따라서 운동(또는 변화)도 여럿〔多〕도 없는 초월적인 이데아(idea)의 세계입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라는 이 괴물은 천의 얼굴을 지닌 데다가 종잡을 수 없는 구석이 하도 많아서 플라톤 자신도 제대로 그 모습을 그려 내지 못하고, 이 괴물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오십 보 백 보인지라, 이제까지 이 괴물을 둘러싸고 수십 권(어쩌면 수백 권이 될지도 모릅니다.)의 책, 수천 편의 논문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이 괴물의 정체를 제대로 알았다거나 이 괴물을 사로잡았다는 말은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떠도는 풍문에 따르면 이 이데아라는 괴물들의 왕은 ‘좋음’의 이데아라는데, 그 밑에 무수한 괴물들이 이 왕을 떠받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놈들은 ‘사람’, ‘개’, ‘소’, ‘말’, ‘지렁이’, ‘바퀴벌레’, ‘쇠똥구리’…… 같이 천하기 짝이 없는 이름을 지니고 있고, 또 어떤 놈들은 ‘아름다움’, ‘참됨’, ‘용기’, ‘중용’, ‘거룩함’…… 따위의 제법 그럴싸한 이름을 지니고 있고, 또 다른 놈들은 ‘큼’, ‘작음’, ‘많음’, ‘적음’, ‘삼각형’, ‘동그라미’…… 같은 시답잖은 이름을 지니고 있다는데, 그 수가 이 우주의 삼라만상에 붙인 이름보다 더 많아서 이 괴물들을 제대로 먹여 살리자면 ‘좋음’이라는 이데아계의 임금이 아무리 마음씨가 곱다 한들 어디쯤까지 좋은 임금님으로 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와글거리는 이데아라는 괴물들을 하나하나 붙들고 씨름하려 드는 건 마치 산더미처럼 쌓아 놓은 콩더미에서 콩알을 하나하나 골라 내 도끼로 뽀개는 짓과 진배없는지라 그런 일은 다른 할 일이 없는 한가한 분들께 맡겨 두기로 하고, 얼렁뚱땅 ‘이데아라는 놈들은 있는 것(또는 있음)이라는 하나의 괴물 몸에 생긴 두드러기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기로 합시다. 아무튼 데미우르고스가 이 우주를 만들 때 이 괴물들을 보고, 그놈들을 본떠서 만들었다는데, 이 엉터리없는 이야기 속에 담긴 숨은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제 관심을 끄는 문제라는 것만 알고 넘어갑시다.”
세상에! 철학 선생이라는 자가, 그것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신줏단지처럼 모시고 다니면서 그것으로 밥을 벌어먹는 서양 고대 철학 선생이라는 자가 이렇게 제 쪽박 깨는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으니, 앞으로 하는 이야기가 씨알이 안 먹히면 그야말로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어 마땅한 노릇이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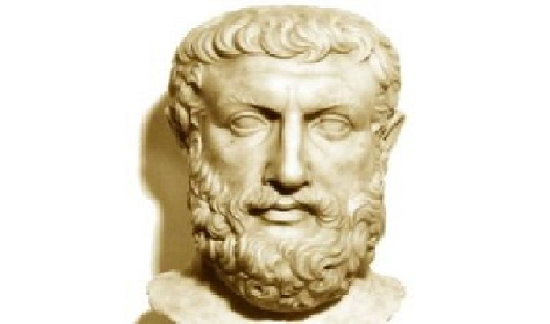


Leave a Reply
Want to join the discussion?Feel free to contrib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