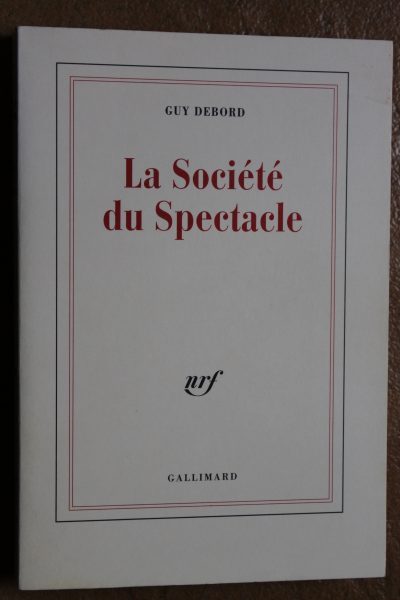시위, 짧은 수기 [피켓2030]
정승우 작가
–
종로3가역에서 내려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며 나는 동대문운동장에서 5시반쯤 5호선으로 갈아탔다.
5호선은 시위에 참여하려는 사람으로 가득 찼다. 가족 단위도 많았다. 젊은 부부와 그들의 손을 잡고 있는 아이의 모습들이 여럿 보였다. 종로 3가역에 가까워질 쯤, 광화문역은 많은 인파로 복잡하니 종로3가역에서 미리 하차하라는 방송이 나왔다. 곧, 종로3가역에 도착하여 문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렸다. 많은 사람들 때문에 종로3가역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했다. 사람들은 암묵적 줄을 지어 차례차례 계단을 밟고 올라갔다. 내 바로 앞에는 한 젊은 가족이 있었다. 여자는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고, 남자는 큰 배낭용 가방에서 생수를 꺼내고 있었다. 역 밖으로 나왔을 때도, 그들은 내 앞에서 계속 걸어갔다. 남자의 걸음은 꽤나 빨랐고, 그의 아내와 아들은 뒤쳐졌다. 그러면 여자는 자신의 남편에게 같이 가자고 소리를 쳤고, 남자는 그제야 걸음을 늦췄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남자는 또 다시 홀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앞만 보고 계속 걸었다.
광화문 사거리로 가는 대로에 나왔을 때, 이는 꽤나 진풍경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넓은 공간을 사람이 걸어가는 것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차들이 다니는 도로를 걷는다는 건 꽤나 짜릿했는데, 불현 듯 예전에 했던 생각이 났다. 대학 입학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매일 집 근처 공원에 산책을 갔었다. 공원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2차선이었고, 나는 겁도 없이 중앙선 위를 걸었다. 물론, 다니는 차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행동이었다. 나는 그 2차선 위를 걷는 동안, 왜 차들한테 이 넓은 공간을 빼앗겨야 하는 건가 불만을 가지며, 언젠간 차가 하나도 없는 아주 넓은 도로 위를 걷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다. 그리고 나는 넓은 도로를 걸었다.
차도를 걷는다는 건 생각해보면 일종의 싸움이다. 차도라는 말은 그 자체로 사회를 드러낸다. 규칙과 질서와 복종. 차도라는 것은 차들만이 다닐 수 있는 도로이고 그 위를 사람이 다녀서는 안 된다. 물론, 아무 이유 없이 그것을 막는 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규칙이다. 어쨌든, 사회에서 만들어진 규칙과 질서는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 우리는 혼이 난다. 다시 말해, 벌이 뒤따른다. 규칙과 벌이 합쳐지며 복종이 있게 되고, 재미있게도 그 뒤에 탈주에 대한 갈망이 들어선다. 그 탈주는 마땅한 탈주일 수도 있고, 탈주 그 자체를 위한 탈주일 수도 있다. 그 어떤 것이든, 탈주는 짜릿하다. 고등학교 시절 수능을 준비하며 수많은 문제지를 풀었다. 어느 날은 그 문제지들을 앞에 두고 있는 내 모습이 문득 슬펐다. 나는 검정색 볼펜을 가지고 펼쳐져 있는 문제지의 한 쪽 페이지를 마구 그어댔다. 그 페이지는 마구잡이로 그어진 선들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게 됐다. 그리고 나는 강렬한 쾌감을 느꼈다. 나는 탈주를 했던 것이다.
그 만큼의 기분은 느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시위로 가는 그 차도 위의 나의 걸음은 은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많은 이들이 그 길 위를 걷고 있었고, 수많은 이들이 탈주하고 있었다. 그렇게 모여진 탈주는 이제 더 이상 탈주가 아니다. 그것은 다시 하나의 새로운 길이 됐다.
–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대개 삼삼오오였다. 큰 깃발을 들고 무리를 지어온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 모두가 소란스러움을 만들어냈고, 활기들이 컴컴한 도로 위에 가득했다. 혼자인 몇몇도 있었다. 그들은 조용했다.
사진을 찍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다. 한 손에는 촛불을 들고 한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자신의 모습을 찍었다. 아주 웅장한 파티가 있고, 그 파티는 초대 받은 이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 사람들은 그 파티에 초대 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 초대권은 귀족들에게만 보내지고, 평민들은 그런 귀족들을 부러워한다. 아주 큰 파티가 있다. 그곳은 입장권을 필요로 하지 않고 모두에게 열려 있다. 하지만, 그 파티는 인간만이 참여할 수 있다. 그 파티에 참여한 이들은 스스로의 인간성에 자부심이 있다. 그리고 때론 그 자부심을 드러내 보이고 싶은 법이다. 이 파티에는 초대권이나 입장권 같은 것이 없으니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 찰칵. 사람들은 그 모습을 서로 칭찬해준다. 그 옆을 조용히 지나가는 뫼르소.
4.19혁명, 5.18민주화 운동, 6월 항쟁 등. 역사가 된 이 날들은 교과서에 남았다. 그리고 나는 3인칭의 시점으로 그것을 들여다본다. 피가 그려져 있고, 정의가 적혀 있다. 그 위에 내려앉은 숭고함을 본다. 그리고 역사로 불릴지 모르는 한 시위. 나는 그 시위의 현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종로3가역에서 나왔을 때는 이미 날은 져있었다. 컴컴했고 그래서 촛불들은 더 빛나보였다. 많은 사람들의 손에 촛불이 들려있었다. 정의의 여신의 손에는 저울이 들려있고, 저항하는 이들의 손에는 촛불이 들려있다. 옳고 그름의 측량을 위해 저울이 필요하듯, 저항을 위해 촛불이 필요하다. 나는 지하철을 타기 전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광화문에 갈 때 촛불을 사서 가야하느냐고 물어봤다. 친구는 광화문에 가면 다 있다고만 말을 하고 끊었다. 촛불을 사가야 하는 거 아닌가했던 내 생각을 무색케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팔고 있었다. 문득, 성경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그들을 쫓아선 안 된다. 사람들은 촛불을 필요로 하고, 때문에 촛불을 파는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배고픈 누군가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 먹을 것을 팔아야 한다. 그 날 광화문 광장은 시위를 하는 곳이었다. 시위를 하는 데에는 필요로 하는 것이 많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그것들을 팔아야 한다. 그래서 누군가는 촛불을 팔고, 사람들은 촛불을 산다. 그 촛불이 사람의 손에 들리면 어느 순간 그것은 저항이 된다. 그렇다고 장사꾼들이 저항을 판 것은 아니다. 촛불이 한 사람에게 들리는 순간 바로 저항이 되는 것은 또 아니다. 저항이 되려면 어떤 순간을 기다려야 한다. 아무튼, 장사꾼들은 촛불을 팔기 위해 그곳에 온다. 그리고 그곳은 예수의 말대로 한편의 강도의 굴혈이 된다. 강도의 굴혈이 단 한 명의 장사꾼의 등장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무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즉, 광경이 되어야 한다. 장사의 광경이 만들어질 때, 그 순간 강도의 굴혈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광경의 힘은 대단한 것인데, 촛불을 저항으로 만드는 것도 사실 이 광경이다.
–
광화문 사거리에 도착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사거리 가운데에 무대가 설치돼 있고, 그곳을 기점으로 사람들이 거리에 그대로 앉아있었다. 나는 틈을 비집고, 앉은 사람들의 무리로 들어갔다. 뒤에서는 서있는 사람들에 가려져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니, 앉아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눈앞에서 보였다. 광화문 사거리를 사람들이 가득 메우고 앉아있었다. 그것은 하나의 광경이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이 하나의 광경을 만든 것이다. 한 명 한 명의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촛불도 보이지 않았다. 그냥 빛이 있었다. 한 곳에 모여진 수많은 빛은 하나의 빛으로만 보였다. 그리고 그 때, 저항이 드러났다.
광경이 된다는 것은 아주 신비로운 것이다. 부분들이 사라지고 전체만이 남는다. 마치 나무들이 모여 숲이 되듯이. 숲은 나무로 이루어져있지만, 숲이 보이면 나무는 보이지 않는다. 한 명 한 명이 모이고 한 개 한 개의 촛불들이 모여 그 광경을 만들었지만, 광경이 되는 순간 그 한 명과 그 한 개의 촛불은 사라진다. 언제, 무엇이 작은 것들을 하나로 묶어 광경으로 만드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광경에 대한 인식은 존재하고 인식된 광경은 독특하고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
광경은 물리적 거대함과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 단 한 명에 의해 광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대우주만큼이나 소우주도 존재한다. 다만, 한 명에 의해 광경이 만들어지는 것은 꽤나 힘들다. 그것은 낯설음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무수히 많은 ‘한 명’들을 만나고 그들을 ‘인간’이라는 하나의 시각으로만 바라본다. 그 시각의 변화가 그 한 명을 광경으로 인식하게 하거나 혹은 그 시각의 변화 자체가 광경이다. 나는 이 조그마한 광경을 찬양한다. 그것은 일상 그리고 매일의 변화이다. 큰 광경은 사람들이 그 광경이 벌어지는 장소를 벗어나버리는 순간 잊히기 십상이다. 아무튼 광경은 대단하고, 그 날의 광화문 사거리는 대단한 광경이었다.
–
나는 틈을 비집고 들어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거리에 앉았다. 자리에 앉으니 보이는 것은 다시 나무였다. 삼삼오오 모인 나무다. 삼삼오오라는 것은 굉장히 애매하다. 이것은 통합도 아니고 개인도 아니다. 개인은 차라리 어딘가로 새로이 들어가기 쉽지만, 일부의 무리가 어딘가로 새로이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다. 나는 이 집회가 통합이라기보다는 응집으로 보였다. 파편화들의 응집이다. 기 드보르는 스펙타클이 파편화된 개인을 그대로 뭉쳐버린다고 하지만, 스펙타클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집합이라는 것 자체가 본래적으로 통합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 아닐까? 본래, 마구잡이의 모습으로 뭉쳐지는 것이 아닌가? 하나로 보였던 그 빛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삼삼오오의 빛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다른 삼삼오오의 빛이 있고, 서로서로는 너무나 남이다.
6시가 조금 지나고 광화문 사거리 가운데에 설치된 무대 위에서 누군가 사회를 봤고,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자유발언들의 내용은 대부분 비슷했다. 집회의 뚜렷한 목적이 있으니 그것은 어쩌면 당연했다. 나는 금방 따분해졌고, 들고 온 파이 한 조각을 입에 물었다.
조금 있으니 다시 사회자가 올라와 여러 설명을 했고 모금 활동이 벌어졌다. 앉은 무리들 사이사이로 모금함을 들고 여러 사람이 움직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지폐를 내밀었다. 내 옆에는 한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그 아주머니도 팔을 뻗어 그 사람들에게 돈을 건네려고 했다. 그런데 아주머니의 손모양이 이상했다. 가만 보니 그 손은 돈을 가리고 있었다. 천 원짜리 한 장이었다. 나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 아주머니는 아마 부끄러웠던 것 같다. 쓰레기를 주우시는 분도 사람들 틈 사이로 지나다니셨다. 큰 쓰레기봉투를 들고 사람들 사이사이를 걸어 다니며 사람들이 건네는 쓰레기를 그 안에다 담았다. 사람들은 그 분이 걸어 다닐 길을 알아서 만들어주었다. 이렇게 모두가 선량했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심지어는, 그 분이 지나가시다 실수로 잡고 있던 쓰레기봉투를 놓쳐 쓰레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사람들은 아주 솔선수범하며 그 쓰레기들을 주어 다시 그 봉투에다 담았다. 나는 박수를 쳤다.
사람들은 왁자지껄 떠들었다. 많은 농담들이 오갔고, 자유발언은 계속해서 진행됐다. 그곳에 피는 없었다. 그런데 나는 대체 여기에 교과서에서 본 숭고함이 어디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스피커에서는 자유발언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내 주위에는 단지 삼삼오오의 사람들이 있었다. 생각해보니, 삶을 아름답게 봐야할 필요가 없듯이 정의 또한 숭고하게 바라볼 필요가 없는 것 같다. 교과서도 거짓말을 하기 마련이다. 나는 더 가운데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순간, ‘숭고함이 여기에 쭉 있었네.’하는 어처구니없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나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길가로 자리를 옮겼다. 사람들을 비집고 앞으로 나아가려는데, 건물이 하나 보였다. 광화문 사거리에 붙어있는 그 건물은 우습게도 면세점이었다. 아니, 평소라면 우습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때만큼은 그 건물이 너무 우스웠다. 아니, 사람들이 우스운 건가? 집회가 우스운 건가? 사회가 우스운 건가? 소란스러운 그 광화문 사거리의 우리들과 그 옆에 우뚝 솟은 면세점이라니. 나는 그 건물이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놓아두며 여기 있는 우리도 어느 정도는 뻔뻔하다. 자유발언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그 면세점을 얘기하지는 않았다.
내 바로 앞에는 우연히도, 지하철역을 나올 때 내 앞에 있었던 바로 그 가족이 있었다. 아니, 남편은 없고 여자와 아이 그 둘이 있었다. 그는 어디로 간 것인가. 아마 정의를 외치기 위해 사거리 중심으로 뛰어 들어가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여자와 아이는 그를 놓쳤으리라. 나는 갑자기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다. 탈주를 위해 온 그 곳을, 나는 다시 탈주하고 싶었다. 삼삼오오와 면세점 그리고 덩그러니 놓인 여자와 아이, 이 잡다(雜多)에 의해 나는 탈주하고 싶었다. 나는 뫼르소를 찾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찾을 수 없다. 뫼르소는 찾아내고, 기댈 인물이 아니다. 그는 오로지 내가 되어야 할 인물이다.
시간은 대략 8시정도였고, 사람들은 여전히 광화문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과 반대로 걸었다. 우리는 더 나아질 것이다. 여러 번의 집회와 그 집회에 참여한 이들 그리고 그들을 지지해주는 참여하지 못했던 이들, 이 모든 것들이 변화가 이미 일어났음을 보였다. 나는 집으로 돌아간다. 집에서 나는 나의 집회를 열고 싶다.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나는 혹시 나의 집회에 참여할 동료들을 찾을 수 없을까 생각을 해보지만, 이것은 소설이 아니고 수기이기 때문에, 나는 어느 누구도 찾을 수 없었다.
Twe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