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시간 속에는[치유시학]
김성리 (인제대 인문의학연구소 연구교수)
설렘과 기쁨의 기억이
?
할머니의 기억은 하얀 눈이 소복이 내린 그 날로 돌아갔다. 할머니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눈은 고통의 기억이었다. 떠돌이 약장수에게 속아 한센인 집단촌으로 갈 때 눈길을 걸어갔던 기억을 고통스럽게 떠 올렸었다. 하지만 꽃이 가득했던 교정과 고향마을은 이제 하얀 눈이 마을을 뒤덮은 설날 아침이 되어 있었다.
할머니에게 어린 시절의 기억은 설렘과 기쁨 그 자체였다. 대문을 나서면 계절마다 다른 꽃들이 길가 곳곳에 피어 있었고, 학교 교문을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던 것이 꽃과 나무였다. 산속에 버려져 살아남기 위해 하루하루 사투를 벌일 때의 나무들은 할머니가 넘어야 했던 장애물이었지만, 어린 시절의 나무는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꽃을 피우던 휴식처였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물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기억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오래된 시간 속의 사물에 대한 기억은 이미지로 남는다. 그 이미지는 시간의 흐름과 관계없이 정신 속에 살아남아 기억의 주인과 함께 태어나고 늙어가며 사라져간다. 즉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그 이미지는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사물이 반복하여 만나고 그 만남이 생의 전환점과 연관되어 있다면 기억은 이중의 잠금장치를 한다. 가장 오래된 기억이 뒤에 만난 기억에 의해 묻혀 잊히게 되는 것이다. 꽃과 나무 그리고 눈은 할머니의 유년기를 아름답게 만들었던 것들이지만, 그 이후 할머니가 경험한 고통들에 의해 원초적인 기억은 사라졌던 것이다.
어린 시절의 할머니를 들뜨고 행복하게 했던 기억들이 발병 후 이어지는 고난 속에서 기억 저 너머로 아득히 사라지고, 행복했던 기억의 자리에는 고통스럽고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는 이별과 회한의 기억들이 자리 잡았다. 그 기억들은 너무나 단단하고 야멸치게 할머니의 삶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고통의 기억들을 걷어내고 행복하고 설레던 그 시절로 할머니는 돌아가고 있었다. 60여 년 동안 열리지 않는 문 안에 유폐되어 있던 그 기억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유년기의 기억을 하나하나씩 읊조리는 할머니의 모습은 아름다웠다. 할머니의 작은 심장박동이 나에게로 옮겨와 나는 온 몸이 떨리는 긴장 속에서 할머니가 읊조리는 시를 받아 적었다.
?
눈 내리는 날 아침에
정월 초하룻날 설날이 되었다
잠에서 눈을 떠
창문을 열고 보니 폭설이 내려서
온 바다를 흰눈이 덮었고
은빛 찬란함이
눈부시도록 아름다웠더라.
눈 내리는 날에 가장 좋아하던
우리 집 바둑이는 천지를 돌아다니며
뒹구르며 좋아하며 짖는 그 소리가
노래같이 들리더라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랍더라.
장독 위에는 소복소복 쌓인 눈이
연꽃같이 희고 아름다웠더라
대밭의 댓잎에서는 흰눈이
소복소복 쌓여서 칼끝과 같이
쪼삑쪼삑 하였더라.
소나무에도 많은 눈이 쌓여서
목화같이 보이기도 하고
눈꽃같이도 아름다웠고
좋게 보이더라.
우리 집 지붕 끝에는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려서
보기에 경치가 좋았더라.
나는 설날의 음식과 떡국으로 차려서
아랫마을의 할머니 집으로
세배를 나섰더니 눈 속에서
길을 몰라 헤맬 때
바둑이가 내 앞에 뛰어와서
길을 인도하였더라.
그 후에 사랑하는 임과 함께
큰 눈덩이를 만들어 굴리고
눈사람을 만들어
머리에는 고깔을 씌우고
임과 둘이서 어깨 손을 얹어
사진을 찍으며 기뻐하였더라.
그리고 눈덩이를 만들어
서로 던지며 때리며 싸움이 벌어져
어린아이 같은 동심으로
돌아갔더라.
넘어지며 엎어지며 미끄러질 때마다
사랑하는 그대의 두 팔로
안아 일으켜 줄 때마다
눈 속에서도 그 따뜻한 사랑이
우리의 정으로 더 깊이 들더라.
팔십 평생을 살아도
눈 나리는 이 날이
잊혀 지지 않고
옛 추억이 그립더라.
눈 나리는 어느 날.
-<눈 내리는 날> 전문-
시 <눈 내리는 날>은 할머니의 10번째 시이다. 이 시 속의 바다는 아이를 남겨두고 돌아오면서 자살을 기도하던 예전의 바다 대신 흰 눈이 뒤덮어 은빛으로 빛나는 눈부신 바다이다. “그거는 바다가 아인기라. 얼매나 눈이 왔는지 바다가 안 보이더라” 어린 시절 보았던 눈 온 날 아침의 바다는 할머니에게 은빛으로 빛나는 기억이었다.
오래 전에 마주쳤던 사물은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거나 희미해진 채로 기억된다. 이때의 사물은 구체적인 형상이 아니라 이미지로 남게 되는데, 은빛의 바다 이미지는 살아야 할 의미를 상실하고 죽음을 시도했던 바다의 기억을 뭉개고 있었다. 그리고 어린 시절 꿈을 키우며 뛰어 놀았던 울산 앞바다로 되살아나고 있었다.
실제로 아무리 많은 눈이 내려도 바다를 뒤덮지는 못한다. 바다의 색깔조차 바꾸지 못한다. 어쩌면 할머니가 은빛 바다로 기억하고 있는 것은 백사장일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나는 할머니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할머니의 얼굴에 피어나는 행복감을 논리적이며 건조한 이성의 언어로 파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또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지만 진실이라고 굳게 믿는 기억이 있다. 몇 살쯤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 그날은 눈이 많이 왔었다. 눈길을 걸어 학교 운동장에 갔을 때, 그 곳에는 하얀 눈으로 뒤덮인 바다가 있었다. 나는 그 바다 위를 발자국을 찍으며 걸었고, 강아지도 나를 따라 폴짝폴짝 뛰어 다녔다.
아무도 없는 그 곳을 뛰어다니며 강아지와 놀던 어린 나는 마치 그림 속의 풍경처럼 내 기억 속에 살아 있다. 어른이 되고 세상사에 지칠 때면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나는 기억 속의 나를 멀리서 바라보며 위안을 받곤 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나의 기억을 사실로 받아주지 않았다. 그렇게 많은 눈이 내린 적이 없고, 우리 집에는 강아지가 없었으며 가족 중 그 누구도 어린 나를 아침 일찍 학교에 가게 내버려둔 적이 없었다는 게 그 이유였다.
하지만, 그들이 조목조목 아무리 많은 증거를 들이대며 나의 기억이 거짓이라고 논리적으로 말해도 따뜻하고 포근한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억은 숨어 있는 진실처럼 나에게는 비밀스러운 기쁨이 되었다. 할머니의 시를 들으며 한동안 잊고 있었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연꽃같이 희고 아름답게
할머니는 오래 전의 눈 내린 날 정경을 정확하게 묘사했다. 눈이 내려앉은 대나무 잎, 마치 목화처럼 보이는 눈 쌓인 소나무,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다 얼어붙은 처마 끝 고드름까지 그 모든 정경을 마치 오늘 아침에 본 것처럼 이야기했다. “눈이 그렇게 많이 왔는데 설날 세배를 혼자 가셨어요?” “흠흠흠” 할머니는 나의 질문에 어깨를 웅크리며 낮은 소리를 내며 웃었다.
“쪼끔만 기다리면 같이 갈긴데 내가 그냥 나섰제.” “그래서 길을 잃으셨어요?” “뭐 길을 잃었겠노. 눈이 하도 마니 와 놔서 좀 낯설기도 하고 강아지가 하도 날뛰니까 쫓아가다 딴 길로 가기도 하고 그랬제” 말하는 내내 할머니의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지지 않았다.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할머니의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시 <눈 내리는 날>에서 눈에 띠는 것은 마쓰시타와의 추억이었다. 할머니가 시에 묘사하는 눈 오는 날의 정경이나 있었던 일은 분명 마쓰시타를 만나기 이전의 시간이었다. 그런데 시의 후반부에 가서는 마치 눈이 많이 온 그날 마쓰시타를 만나 눈싸움을 하고 눈사람을 함께 만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할머니의 기억 속에서 마쓰시타는 허무와 고통의 얼굴로 표현되었다. 뿐만 아니라 마쓰시타와의 기억은 언제나 분명했다. 그런데 어린 시절 눈 내리는 날의 빛나는 정경과 함께 마쓰시타와 함께 했던 기억이 포개어지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나는 잠시 망설이다 질문했다. “마쓰시타와 눈사람도 만들었어요?” “응, 참 많이 엎어졌다. 그때마다 일으켜 주는 게 좋아서 또 엎어지고 했제”
눈 오는 날 마쓰시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진 것은 분명해 보였다. 어린 시절의 행복했던 기억과 마쓰시타와의 기억이 하나로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마쓰시타와의 사이에 있었던 아픈 기억이 행복하고 즐거웠던 기억에 의해 조금씩 덮여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랑받으며 보냈던 유년의 기억들이 발병 후의 고통스러운 기억에 의해 시간 저 너머에 은폐되어 있다가 조금씩 모습을 내미는 것처럼 고통의 기억들이 조금씩 사라져가는 게 아닐까?
마쓰시타와 함께 했던 눈 오는 날의 기억은 ‘사랑하는 두 팔로 안아 일으켜 줄 때마다 눈 속에서도 그 따뜻한 사랑이 정으로 더 깊이 들’던 행복의 시간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팔십 평생을 살아도 잊히지 않는 그리운 시간으로 할머니의 사랑은 돌아오고 있었다. 이전에 구술했던 시에서 보였던 고통과 회한의 기억 대신 연꽃같이 희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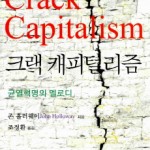
Leave a Reply
Want to join the discussion?Feel free to contribute!